등록 : 2011.01.13 20:08
수정 : 2011.01.13 20:08
 |
|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
집 근처의 기름진 논을 일컫는 ‘문전옥답’(門前沃畓)은 생태학적 의미를 지닌 말이다. 전통마을은 산을 등지고 완만한 비탈이 평야와 만나는 지점에 자리잡았다. 지형적으로 산에서 씻겨온 유기물질이 머무는 곳이다. 이도원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마을이 들어서기 전에 이미 옥토인 곳”이라고 설명한다. 사람이 살고부터는 초가지붕과 두엄더미의 영양분이 흘러들어 논은 더욱 비옥해지고 손길이 쉬 닿으니 좋은 논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석유문명 이전의 전통사회는 어쩔 수 없이 생태적 순환사회였다. 자연이 공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최대한 이용하는 체계였다. 석유고갈 시대를 앞두고 전통사회가 어떻게 화석에너지 없이 지탱할 수 있었는지 알아보는 것은 결코 한가한 일이 아니다. 게다가 4대강 사업으로 홍역을 겪고 있는 하천정비의 교훈을 얻을 수도 있다.
실학자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강변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고 했다. 홍수의 위력에 맞설 기술도 없었거니와 인구밀도가 높지 않아 굳이 그럴 필요도 없었기 때문이다. 조선 최대의 도시 한양만 해도 17세기 중반부터 200여년 동안 인구는 약 20만명을 유지했다. 요즘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등 이름난 생태도시의 인구는 대개 이 정도이다.
그러나 마을이 있는 곳에선 홍수를 막아야 했다. 그 수단은 숲이었다. 문전옥답을 감싸고 흐르는 하천변을 기다란 숲으로 둘러쌌다. 하천을 통해 땅의 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다는 풍수사상이 근거였지만 여기에도 생태적 지혜가 담겨 있다. 하천변 숲은 강으로 들어가는 오염물질을 흡수하고 홍수를 방비해 준다. 나아가 하천변에 녹지를 만들면 물고기와 야생동물이 늘어나고 지하수가 풍부해진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았을 것이다.
전국 곳곳에 이런 수구막이 숲이 있었다. 숲으로 물을 막는 오랜 전통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다. 1938년 조선총독부가 현장답사를 통해 확인한 그때까지 남아있던 강변과 해안의 수변보안림은 200개가 넘었다.
청계천 하류 동대문 일대에도 그런 버드나무숲이 있었다. 통일신라 때 최치원이 경남 함양에 만든 상림이나, 조선 인조 26년(1638년) 전남 담양읍을 가로지르는 담양천에 조성한 관방제림은 천연기념물로 보존되고 있는 대표적인 강변 식생대이다.
이런 전통적인 강의 모습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의 물결은 강을 수로로 바꾸어놓았다. 홍수를 막고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하천을 직강화하고 둑을 쌓아 강의 품을 좁히는 하천정비가 이뤄졌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하천의 생태적 기능에 눈떠 하천변 개발을 억제하고 수변 생태벨트를 조성하려는 계획이 세워지기도 했다. 안타깝게도 세계적 흐름과 함께하던 새로운 하천정비의 패러다임은 4대강 사업과 함께 한순간에 1980년대로 복귀하고 말았다.
“강을 이렇게 버려둔 나라는 세계에 없다”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강변의 금모래밭을 ‘누런 지방층’으로 보는 국토해양부에게 국유지인 하천변은 원가가 싼 새로운 개발 대상일 뿐이다.
무소불위의 친수구역특별법으로 하천변 개발을 강행한 뒤 4대강은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 몬순 기후인 한반도에 연중 비가 오는 해양기후에 적합한 유럽식 강을 만들어 놓는다고 관광·레저산업이 발달하고 고급주택가가 들어설까. 또 지금까지 정부가 악착같이 강변 개발을 억제한 이유인 상수원 확보는 어떻게 될까. 주로 지하수를 마시는 선진국과 달리 대수층이 빈약한 우리는 식수의 90% 이상을 하천수에 의존한다.
무엇보다 이 모든 개발 청사진이 4대강 사업 뒤 수질이 좋아진다는 전제 위에 서 있는 게 문제다. 개발도 하고 수질도 개선한 전례는 없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새만금에서 정부의 장담과 달리 수질이 나빠져 해수 유통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상류의 맑은 물 대책은 소홀한데 덜컥 하류에 둑부터 막은 탓이다. 4대강과 다를 게 없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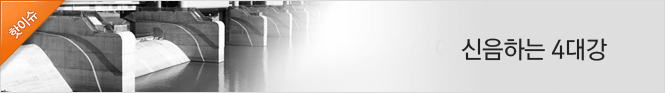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