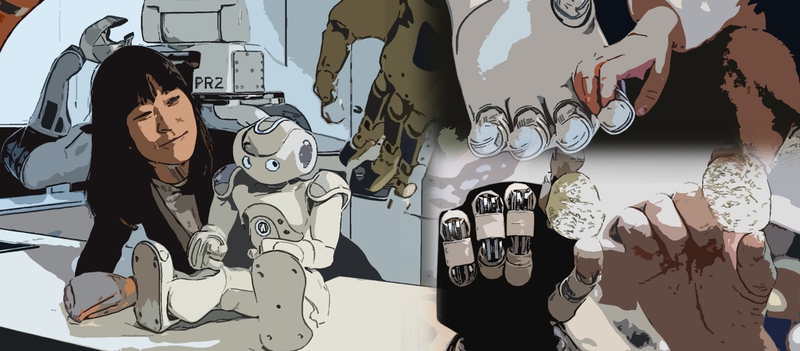 |
|
그래픽_장은영
|
Weconomy | 손창완의 진보회사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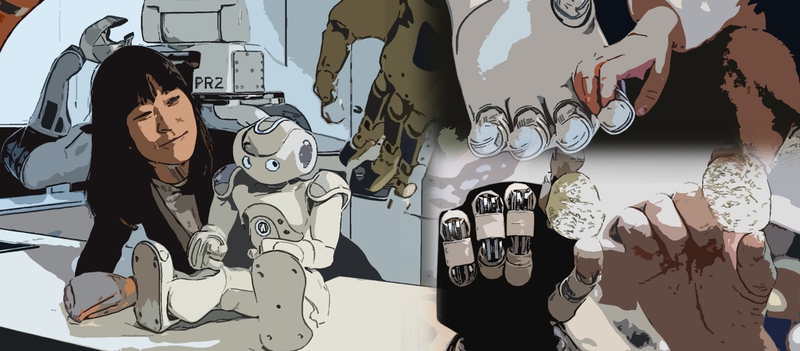 |
|
그래픽_장은영
|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클라우스 슈밥 WEF 회장이 ‘4차 산업혁명’을 주창한 이래 대한민국에서 4차 산업혁명은 가히 모든 분야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전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시켰다. 4차 산업혁명은 철도와 증기기관을 기반으로 한 1차 산업혁명, 전기와 생산조립라인을 기반으로 한 2차 산업혁명,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3차 산업혁명에 이은 산업혁명을 말한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혁명이라는 점에서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과 그 구분이 모호하다. 슈밥 회장은 앞으로 있을 과학기술의 발전과 디지털화가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점에서 4차 산업혁명을 3차 산업혁명과 구분한다.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hyperconnectivity)과 초지능(superintelligence)을 특징으로 한다. 인공지능, 로봇공학 등이 초지능 기반기술이라면, 웨어러블 디바이스,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이 초연결 기반기술이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기존 산업혁명에 비해 더 넓은 범위에서 더 빠른 속도로 산업구조를 바꾸고 이는 일자리, 삶의 모습 등 사회에 파급되어 삶 전반에 총체적인 변화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현재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논의는 예컨대 “4차 산업혁명이 금융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와 같이 각 산업분야의 미래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고, 그 혁명을 이끄는 주체에 관한 논의는 빠져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주체는 정부보다 회사다. 전통적으로 거대 금융회사나 자동차·에너지회사가 차지하던 미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상위회사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등 ICT 기업으로 바뀌었다. 이들 회사들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 갈 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슈밥 회장이 자신의 책 <4차 산업혁명>의 서문에서 자인하듯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사법을 공부하는 필자는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산업구조 변화는 그 주체인 회사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회사제도에 관한 변화의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은 “왜 회사가 조직되는 것인가?”이고, 경제학에서는 이를 ‘회사의 본질’에 관한 논의라고 한다.
회사의 본질에 관한 논의는 199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널드 코즈가 발표한 논문 “회사의 본질(The Nature of the Firm)”에서 시작됐다.(▶
관련 논문) 코즈는 기업이 거래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조직된다고 본다. 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이 기업 내부비용보다 큰 경우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이 기업 내부로 편입된다는 것이다. 코즈는 시장에서의 비용은 거래 조건에 대해 이해하고 흥정하는 비용이고, 이러한 비용은 특히 장기 거래인 경우에 더 커진다고 보았다. 코즈의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배분이 언제 기업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언제 시장에서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문제이고, 코즈는 기업 내 거래를 통한 한계비용 절감분이 회사 내부 거래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과 같아지는 상태까지 기업에 의한 생산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회사의 본질을 거래비용의 측면에서 본다면 회사조직은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해체되고 분해될 가능성이 있다. 초연결ㆍ초지능사회를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은 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을 기업 내부비용보다 낮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민화 창조경제 연구원 이사장은 누구나 돈으로 할 수 있는 주변 역량은 협력하고 나만의 창조성에 기반을 둔 핵심역량으로 경쟁하는 구도가 4차 산업혁명의 산업 생태계임을 지적한다. 간단히 예를 들면 총무, 회계·재무, 개발, 생산, 마켓팅, 감사 부서로 조직된 회사가 있다고 하자. 인공지능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회계·재무 및 감사 부서는 인공지능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고, 3D 프린팅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회사는 자기 공장없이도 생산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네트워크의 발전은 오프라인 영업망을 필요없게 할 것이므로 마켓팅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거대 플랫폼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회사는 상품의 개발이라는 핵심조직만을 남긴 형태로 변화해 갈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생산요소에도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말하는 생산의 3요소는 토지(자원), 자본, 노동이고, 이것이 부(富)의 원천이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부의 원천은 전통적인 경제학이 간과한 기술(technology)이 될 것이다. 회사는 본래 서로 다른 생산요소를 가진 자들이 팀생산(team production)의 효율성을 위해 조직되고, 전통적으로 회사 내부의 효율성을 담보하는 규율원리는 ‘권위’ 또는 ‘감시’이다. 지금의 회사 제도는 19세기 2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탄생한 거대 제조회사를 기반으로 발전한 것이고, 이들 회사의 효율성은 경영자의 권위에 의한 일사불란한 업무처리와 경영자에 의한 노동자 감시를 통해 담보된다. 그러나 새로운 부의 원천인 기술의 발전은 ‘창조성’을 핵심으로 하고, 이처럼 기술 발전의 전제가 되는 ‘창조성’은 경영자가 아무리 지시를 하고 감시를 해보아도 증대되지 않는다. ‘창조성’은 노동자의 자발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위’와 ‘감시’를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회사지배구조는 ‘독립성’과 ‘자발성’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회사지배구조로 대체되어야 한다. 회사의 핵심역량이 ‘자본’이 아닌 ‘기술’로 변화되어 가므로 회사지배구조는 자본을 가진 자보다 기술을 가진 자를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경영학의 구루인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는 1990년대에 이미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에서 지식산업시대에는 지식을 보유한 직원이 생산성 향상의 핵심이 됨을 지적하고, 이들을 소외시킨 주주만을 위한 회사는 성장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이 <3차산업혁명>에서 미래회사의 모델로 제시한 ‘분산적 협업 비즈니스모델’도 드러커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창업자는 기술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본과 기술을 효율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자본과 기술의 관계는 협력적이어야 하고, 자본이 기술을 억압하게 되면 그 회사의 핵심역량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0세기가 자본의 시대라면 21세기는 기술의 시대다. 자본의 시대에 자본을 가진 사람이 회사를 지배하였다면, 기술의 시대에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회사를 지배하는 것이 맞다. 21세기 대한민국은 아직 창업자의 가족경영으로 특징지워지는 재벌자본주의에 머물러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한 대한민국의 생존은 이러한 회사지배구조의 전근대성과 비민주성을 극복하는 것에 있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home01.html/◎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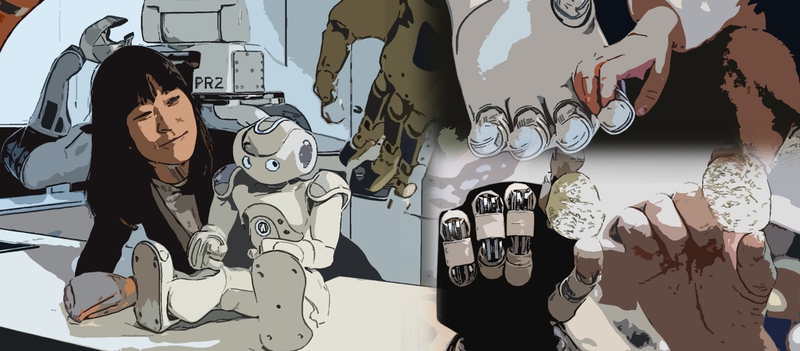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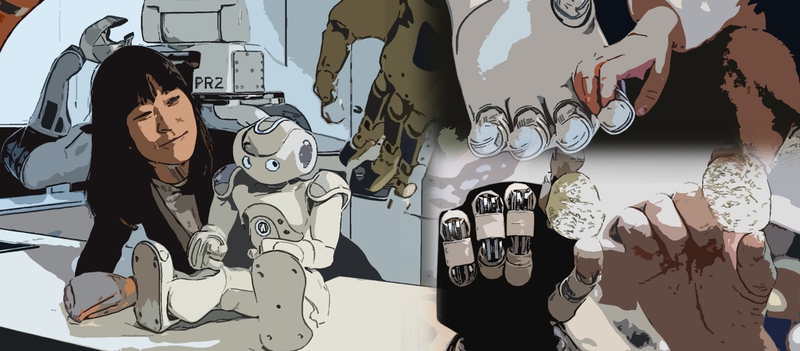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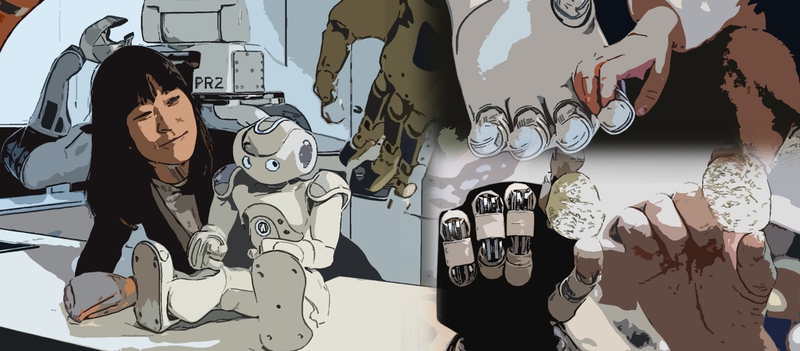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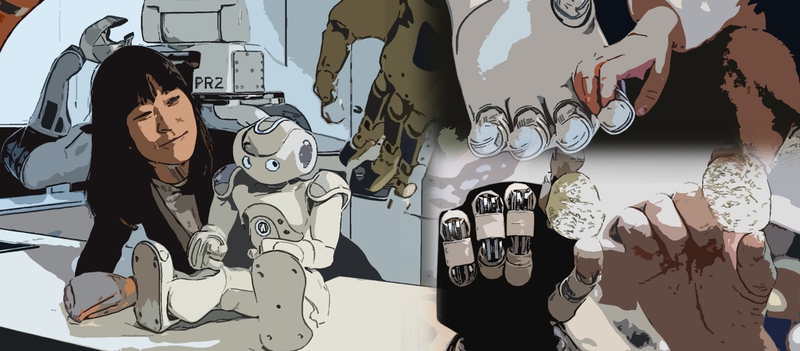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