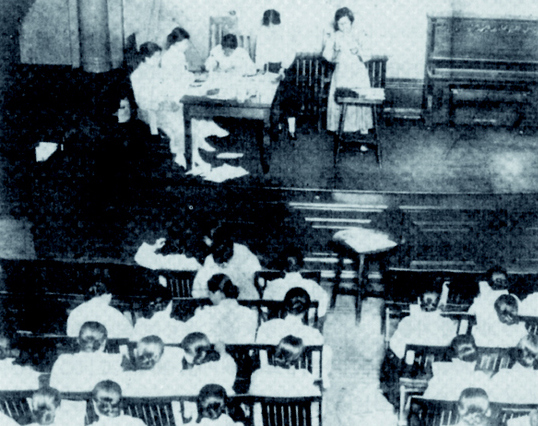 |
|
우리나라 첫 여성 항일구국운동단체인 근우회의 1927년 창립 총회 장면. 필자의 어머니는 이 단체에서 잡지를 편집한 ‘신여성’이었다. <우리 여성의 역사> 중에서
|
세상을 바꾼 사람들 10-4
1983년 하버드대학의 국제문제연구센터(CFIA) 연구원으로 1년간 미국에 갔던 때의 이야기를 쓰려 하니 돌아가신 어머니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린다. 해방 뒤에 일반화된 진보 혹은 좌파 이미지의 하나는 육친의 정을 외면하는 비인간적 냉혹함이다. ‘일반화’란 어디까지나 중성적인 표현이고, ‘냉혹함’은 보수 우파가 의도적으로 부각시킨 결과라 해야 진실에 가깝다. 박정희와 전두환 군사독재에 대항하여 싸우다 여러 차례 옥고를 치른 ‘진보파’ 성직자의 대표적 두 인물, 박형규 목사와 함세웅 신부를 저널리스트로서 관찰하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보통 가족들보다 지극했다. 어머니의 속을 썩이며 사지(死地)에 뛰어들었던 그들의 행동이 유교가 지배하던 시대의 사대부 계층에서 말하는 불효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두 분의 어머니는 아들의 행동이 옳다는 확신을 갖고 자식을 위해 기도했다. 우리 모자의 관계는 조금 유별나다. 어머니(1908~94, 장규선)는 미션계 초등학교(평북 영변의 숭덕학교)를 거쳐 서울에 와 중학교를 마치고 일본에 유학을 가 전문학교 물을 먹은 이른바 ‘신여성’. 하지만 그 시대의 보통 신여성과 다른 점은 어머니가 일제하의 중도좌파 독립운동 조직인 ‘신간회’의 자매 여성단체 ‘근우회’(槿友會)의 열성 회원이었던 것이다. “근우회에서 어머니가 한 일은 어떤 건데요?” 하자 “근우회 평양지부에서 발행하는 <새동무>라는 잡지의 편집 일을 했디. 그때 고무신 공장 여공들이 <새동무>를 많이 읽드구나. 소설가 리기영(월북 작가, 대표작 <고향>, 작고)의 글을 받아 오곤 해서”라는 거였다. 십대 초반 나는 책이나 신문이 아니라 어머니한테서 ‘카를 마르크스’란 이름을 처음 들었다. 그러나 사상적으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다고 믿지는 않는다. 왜냐고? 어머니는 나의 대학 문과 진학을 극구 반대했으며 법과대학을 가서 판검사나 관리가 되는 것을 바랐으니까. 해방 이듬해 강원도 김화에서 월남한 우리집 형편이 한동안 어려웠던 것과 좌절한 진보파 신여성의 ‘현실 선회’가 복합된 결과라 보면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어찌되었거나 1980년 여름 나의 실업과 감옥행을 걱정한 정도가 ‘열성 근우회 멤버’였다 하여 초등학교 졸업의 어머니들보다 더했다고 절대 말해서는 아니된다. 차이가 있다면 고등교육을 받은 어머니가 그러지 못한 이들보다 세상 돌아가는 통빡을 잘 짚어 꾀를 내는 데 능할 뿐이다. 그해 봄 서울에 잠시 돌아와 있던 어머니가 내 친구 ‘파격’ 채현국을 찾아가 정세 탐색을 했던 모양. 그때 채현국 집에 피신해 있던 민주운동가 장기표를 만나 자식 걱정을 하던 내 어머니의 인상을 전하면서 그는 “대단한 분”이더라고 했다. 당신이 내린 정세 판단으로는 미국에 가서 아들을 빼내는 구출운동을 벌이는 게 더 효과적이라 생각했던 것 같다. 미국 정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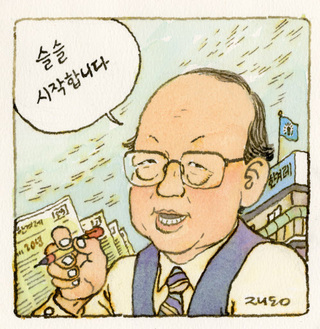 |
|
임재경/언론인
|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