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974년 4월 박정희 정권이 ‘긴급조치 4호’ 발동과 함께 터뜨린 민청학련 사건과 인혁당 사건은 한국 민주화운동의 조직적 연대를 촉발한 역설적 전환점이 됐다. 사진은 1974년 9월26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결성 미사를 한 뒤 사제들과 신도 등 2000여명이 십자가를 앞세워 첫 촛불시위에 나선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
이룰태림-멈출 수 없는 언론자유의 꿈 (46)
‘민청학련 사건’이 일어난 지 40년이 지난 요즈음 되돌아보면, 1974년은 한국 민주화운동사에서 분수령이 되는 해였다. 기독교계에서는 인권위원회가 구성되고 목요기도회가 정례화되었으며, 가톨릭계에서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정의구현사제단)이 결성되었다. 동아일보사에서는 젊은 기자·프로듀서·아나운서들의 ‘자유언론운동’이 일어나 온 국민의 열렬한 지지와 지원을 받았으며, 문인들이 ‘자유실천문인협의회’를 만들어 민주화운동에 행동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연말에는 재야 민주화운동 세력이 ‘민주회복국민회의’를 결성해 시도군 지부를 거느리는 상설조직을 구축하고 있었다. 이들 종교계·언론계·문학계·재야인사들의 움직임은 모두 ‘민청학련 사건’이 준 충격과 무관하지 않았다. 먼저 정의구현사제단의 결성과 활동을 보자. 74년 7월6일 민청학련 학생들에게 활동자금을 대주었다는 혐의로, 로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던 지학순 주교가 김포공항에서 바로 연행되었다. 천주교계에서는 7월10일 명동성당에서 1500여명이 모여 지 주교를 위한 밤샘기도회를 열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김수환 추기경이 박정희 대통령을 면담했으나, 지 주교는 성모병원에 연금되었다. 7월15일 지 주교는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박정희 정권에 끝까지 반대할 것이다”라는 성명을 외신기자들에게 배포하고 다시 구속되었다. 7월25일 김수환 추기경과 주교회의는 명동성당에서 ‘국가와 교회와 목자를 위한 기도회’를 열고 주교회의 2차 선언문을 발표했다. 전국의 사제들은 7월30일부터 원주 원동성당, 대전 대흥동성당, 명동성당, 왕십리성당, 인천 답동성당 등에서 ‘지 주교 석방 기도회’를 잇따라 열었다. 9월11일 명동성당 기도회부터는 주제가 ‘지 주교 석방’에서 ‘부당하게 구속된 모든 사람들의 인권과 민주회복을 위한 기도’로 확대됐다. 9월22일에는 신·구교 12개 단체가 명동 가톨릭문화관에서 ‘신·구교 연합기도회’를 열었다. 9월23일 원주교구에서 열린 성직자 세미나에 모인 300여명의 신부들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 ‘사목헌장’의 가르침에 따라 현실 세계와 민중의 삶 속으로 나가 실천하기로 결의하면서 모임 이름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으로 정했다. ‘정의’는 하느님의 대표적 속성으로 구원과 해방의 핵심이다. 그날 저녁 사제단 신부들은 원주 원동성당에서 1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사를 봉헌하고 ‘유신 규탄’ 시위를 했다. 역사적인 정의구현사제단의 출범일은 한국 순교자 축일인 9월26일이었다. 이날 명동성당에서 “조국을 위하여, 정의와 민주회복을 위하여, 옥중에 계신 지 주교님과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한 뒤 성모상 앞에서 기도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제1시국선언문’을 발표했고 사제·수도자·신자 등 2000여명이 십자가를 앞세워 평화 시위에 나섰다. 제1시국선언문은 “유신헌법 철폐와 민주헌정 회복”, “긴급조치 해제와 구속인사 즉각 석방”, “국민 생존권 보장과 언론·보도·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서민 대중 생활을 보장하는 복지정책 확립”을 요구했다. 이날 제주도 중앙성당에서도 5명의 사제가 수백명의 신도들과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다. 정의구현사제단에는 문서화된 규약이 없었다. 사제들은 “하느님과 정의를 위해 투신한다”는 서약서에 서명하는 것만으로 사제단에 참여할 수 있는데, 당시 전체 신부 800여명 중 500여명이 서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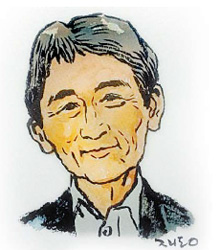 |
|
성유보(필명 이룰태림·71) 희망래일 이사장
|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