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필자(성유보)는 1975년과 79년 두 차례 옥살이를 했던 서대문 서울구치소 시절 좋은 인연을 맺은 민주교도관들과 지금도 교유하고 있다. 특히 민주교도관의 좌장 격이었던 전병용 교도관이 76년 5월 우연히 넣어준 <창작과 비평>(통권 40호)은 ‘청우회 사건’ 2심 공판 때 최후진술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한겨레> 자료사진
|
이룰태림-멈출 수 없는 언론자유의 꿈 (62)
1975년 6월 ‘청우회 사건’으로 내가 수감됐던 서울구치소는 그 시절 양심수들 사이에서 ‘서대문 국립대학’으로 불렸다. 나는 79년에도 1년쯤 신세를 졌는데, 그때 만난 ‘민주교도관’은 지금도 잊지 못한다. 요즈음도 1년에 한두 번씩은 만나서 서로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처음 내가 ‘서대문 9사 하’에 들어갔을 때 담당은 전병용 교도관이었다. 67년 처음 배속된 서대문구치소에서 양심수 김정남을 만난 영향으로 ‘민주교도관’이 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였다. 내가 갇히게 되자, 서울대 문리대 동창인 김정남이 “어벙한 내 친구 성유보를 잘 돌봐주라”고 부탁한 모양이었다. 그만이 아니라 동료 민주교도관들도 틈나는 대로 나를 찾아와 얘기를 나누곤 했다. 특히 야간 근무 때는 시국 토론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 당시 전국 곳곳의 교도소마다 민주교도관이 있어서 음으로 양으로 그 신세를 지지 않은 이들이 없었다. 나와 인연을 맺은 서울구치소의 민주교도관은 전병용을 비롯해 최양호·김성열·한재동·김재술·김형옥·나종남·김영배·최형옥A·최형옥B·이유성·임귀영(79년 구속 때 담당) 등의 그룹이 있고, 김시우(천안 독립기념관장 지냄)도 개인적으로 알게 되었다. 나장균·김동운·김창욱 등 이미 고인이 된 분들도 있다. 감옥이란 사회 모순의 축소판이고, 인권의 사각지대다. 요즈음이야 감옥에서 신문·잡지도 마음대로 볼 수 있고 내키면 집필까지 할 수도 있지만, 70년대만 해도 책조차 ‘반입 불허’가 다반사였고 바깥세상 소식은 풍문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교도관들이 전해주는 시국 소식은 특히 나처럼 독방에 갇힌 정치범들에게 ‘복음’과 다름없었다. 서울대 문리대 1년 선배 최동전(철학과·최동정으로 개명) 역시 민주교도관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기억한다. 그는 68년 서울대 독서회 사건으로 서울상대 이종태, 서울사대 김각·김기수와, 73년에는 ‘삐라’를 뿌린 혐의로 이재오·정수일과, 78년에는 ‘긴조 9호’로 모두 3차례나 옥살이를 했다. “78년 고문으로 고막이 터지고 중이염이 생겼을 때 전병용·한재동 교도관이 아니었으면 귀머거리가 되었을 것이다. 꽃보다 더 아름다운 우정으로 간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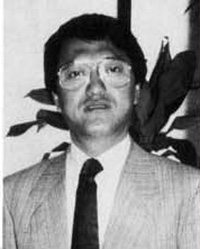 |
|
전병용 교도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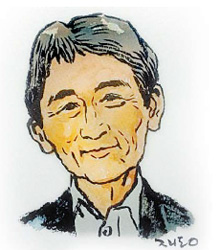 |
|
성유보(필명 이룰태림·71) 희망래일 이사장
|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