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7.28 15:42
수정 : 2019.07.28 15:48
 |
|
그래픽_고윤결
|
Weconomy | 백승진의 지속가능 한국사회
 |
|
그래픽_고윤결
|
오늘날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필자의 생각은 이렇다. 먼저 외적으로는, 초강대국들 사이에서 신냉전을 재촉하는 요인을 억제함으로써 평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통일 한국을 이룩하는 것이다. 물론 북한과의 정치통합까지는 무리일지라도 일정 수준의 경제통합을 갈망하는 우리의 요구는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 특히 불평등 해소가 절실하다는 것 역시 필자가 바라보는 내적으로의 시대정신이다. 이는 비단 소득불평등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불평등, 남녀불평등, 환경불평등 등 다변적 관점의 불평등을 말한다. 그리고 다변적 관점의 접근이 가능해지려면 제도 개혁은 불가피하다.
예컨대 지방분권 개헌을 통한 접근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청년이나 노년층을 대상으로 이른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본소득 도입 역시 면밀한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특히 앞서 말한 접근 방식과 같은 실질적인 정책 대안은 무수히 많은 것도 사실이다.
위 두 가지(내·외) 시대정신을 보다 거시적이고 통합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담론이 바로 ‘지속가능발전’이다. 동북아평화 비전을 추구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에 내재한 다변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른바 혁신적 경제성장과 사회적 공정분배를 동시에 이끌어낼 수 있는 ‘한국형 지속가능발전’이 바로 우리 사회가 갈망해야 하는 새로운 시대정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본다.
하지만 이를 정책으로 승화시키려면 현 정책프레임워크(policy framework)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효과적인 제도적 배열(institutional arrangement)이라 하겠다. 예컨대 환경부나 고용노동부의 정책 예산이 기획재정부 자체의 정책 우선순위에 밀려선 안 된다. 기획재정부의 정책집행이 청와대의 정책 기조에 좌지우지되어서는 더더욱 안된다. 이는 우리 사회에 오랜 기간 쌓여온 정책 신드롬이라 볼 수 있고, 정책 불협화음이 종종 중앙부처 간 ‘힘겨루기의 재물’로 비쳤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중앙기획기관(central planning agency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이 필요하다. 이 기관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일자리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등 기존의 ‘대통령 직속 그 무엇’과는 차별화되어야 할 것이다. 52개(18부 5처 17청 / 2원 4실 6위원회)의 중앙부처에 추가로 설립하더라도 기관장은 적어도 부총리급 이상으로 임명되어만 한다.
왜냐하면 이 기관은 통일 한국을 향한 비전과 관련된 통일부나 외교부 등 간의 정책 조율을 추진함과 동시에 이의 경제·사회적 여파를 기획재정부나 고용노동부 등과의 협의를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다변적 관점의 불평등 문제 해결과 관련 있는 주무부처의 정책과 예산을 심사할 수 있는 전권이 부여되어야만 한다. 이를 통해 혁신적 경제성장과 사회적 공정분배라는 두 가지 시대적 사명하에 국가 지속가능발전의 우선순위에 근거해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이 중앙기획기관의 설립근거 및 역할이 청와대의 일부로 편입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 그 이유는 정무적 역량은 이 기관이 갖추어야 할 여러 역량 중 하나일 뿐, 오히려 기술적(technical) 전문성이 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책업무의 범위가 넓을 터이니 몇십명 가지고는 될 일도 아니다. 더욱이 국내 유수 대학의 교수들이 한두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정책협의체 정도에 머문다면, 인력 낭비, 시간 낭비, 자원낭비가 될 것임에는 불 보듯 뻔하다.
예컨대 이 기관의 소속 직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기술혁신 정책으로 인해 혹시나 초래될 소득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타 부처와의 정책 조율을 주선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 간 존재할 법한 수많은 정책 간 트레이드오프(trade-offs)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정책 간 시너지(synergies)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평등 해소 정책프레임워크’를 설계·집행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정책 간 트레이드오프와 시너지효과 분석을 주도할 수 있는 범정책분야(cross-cutting policy issue)의 전문가, 그것도 ‘수백명’이 소속된 하나의 기획기관 설립을 제언하고자 한다.
케인스도 이야기했듯이 전혀 새로운 정책이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정책은 타이밍의 문제이고, 국가는 광범위하게 다변화되어 있는 이해관계를 관리하며 효과적인 정책을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집행하기만 하면 된다. 예컨대 물(水)과 같은 수자원은 단순 수자원공사만의 일이 아니다. 물은 환경적 문제에서 더 나아가 국가에너지정책, 심지어 상당수의 일자리와도 긴밀히 관계되어 있다. 그렇기에 정책은 조율되어야만 하고 각 부처 마다의 수많은 정책 간의 최고의 조합(best combination)을 찾아내어 집행되어야만 한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정책 시도에 익숙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는 정책적 비용이 불가피하게 수반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비용보다 앞으로 우리가 얻게 될 효용이 더 클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유엔 경제사회위원회 정치경제학자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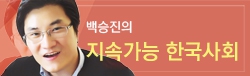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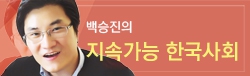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