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가시철조망의 세계수도’로 자처하는 캔자스 주 라크로스(La Crosse)에서 가시철조망이 평원을 갈가리 찢어놓고 있다.
|
홍은택의 아메리카 자전거여행 (28)
버지니아의 돌담이나 캔터키의 목책은 오래 묵으면 자연의 일부가 된다. 캔자스 대평원의 가시 철조망은, 반면에 아무리 오래돼도 눈에 거슬린다. 같은 울타리인데 왜 그럴까. 출입을 막는 목적 외에 출입하려는 사람이나 동물을 해하려는 의도가 가시로 드러나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처음 철조망이 발명됐을 때 ‘악마의 줄(devil's rope)’이라고 불렀다. 대평원은 하늘과 잇닿은 무한한 대지가 아니라 철조망으로 갈갈이 찢겨진 나대지의 집합이다. 길은 평행을 이루며 끝없이 달리는 두 줄기 가시 철조망 사이에 낀 좁고 긴 띠일 뿐이다. ‘Private, No Trespassing’이라는 표지판들이 철조망에 덕지덕지 붙어 있다. ‘사적인 지역임. 무단침입금지’ 또는 ‘민간인 지역임. 무단침입금지’라고 번역해야 할까. 까다롭다. 한국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붙어 있는 ‘민간인출입금지’라는 표지판과 정반대의, 하지만 같은 강도의 메시지다. 미국에서는 사(private)가 신성불가침이다. 공(public)은 때로는 공산주의와 동의어로 치부된다. 여기서 사유재산권은 아름답다. 사유재산의 추구와 천문학적인 확보는 영웅적이고 후에 전설로 승화된다. 주체하지 못할 만큼 쓸어 담은 부를 지키는 방법도 여기서 발달했다. 나무와 쇠가 귀한 대평원에서는 처음엔 석회석 바위말뚝으로 소유의 경계를 표시했는데 침입을 막을 정도로 촘촘히 박지는 못했다. 한 두 평도 아니고 수백 만평인데 그 둘레에 바위말뚝을 일일이 박다 보면 비용 면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 땅부자들의 고민을 일소해준 ‘위대한 발명품’이 탄생했으니 바로 가시철조망이었다. 저렴하고 효과적으로 넓은 땅에 살벌한 테두리를 칠 수 있게 됐다. 대평원에서 생긴 가시철조망은 점점 더 뻗어나가 미국을 넘어서 나라와 나라를 가르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진영을 가로질러 여전히 한국의 남북을 분단하고 있다. ‘프라이빗’은 신성불가침 트랜스 아메리카 트레일에서 6.5㎞ 떨어진 캔자스 라크로스(La Crosse)는 ‘가시철조망의 세계 수도’라고 자처하는 곳이다. 인구 1376명의 작은 마을이 당당히 세계수도를 자처할 정도라면 허풍이라고 쳐도 뭔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런 호기심 때문에 돌아가는 것을 무릅쓰고 라크로스로 향했다. 가는 길에는 강력한 바람폭탄이 터진 듯 맞바람이 불어서 “재미만 없어 봐라” 하는 심사로 페달을 밟았다. 대지를 갈가리 찢은 철조망마다‘프라이빗’ 표지판 덕지덕지
땅부자 사유재산 지켜주는 ‘위대한 발명품’
라크로스 박물관 들렀다
철조망 조각 모은 액자 불티
참으로 괴상망측한 미학이로다 그곳에는 박물관이 있었다. 미국에는 감옥박물관이나 꼰 실 박물관과 같은 이색적이지만 싱거운 박물관들이 많이 있지만 이 박물관은 희안한 쪽에서 또 다른 일가를 이루고 있었다. 시립 공원 안의 허름한 단층 건물인 이 박물관은 입구부터 심상치 않았다. 그림 두 점이 전시돼 있는데 하나는 ‘미국을 가로지른 쇠줄(Steel Strings Across America)’이라는 제목이고 다른 그림의 제목은 ‘악마의 줄 Ⅱ’. 나는 가시 철조망 박물관 안에 들어온 것이다. 분명 아름다운 뭔가가 있어서 전시해 놓은 그림일 텐데 분단국가에서 온 나로서는 가시철조망의 미학이 괴상망측하다는 느낌밖에 들지 않는다. 사유재산권은 아름답기 때문에 그 재산권을 지켜주는 철조망도 아름다운가. 그런데 박물관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이 좁은 박물관에 2천 가지의 철조망들이 연대표와 함께 정렬돼 있다. 베를린 장벽에서 가져온 철조망도 있다. 철조망을 만드는 도구들은 원과 삼각형, 사각형, 좌우대칭, 전후대칭 등의 기하학적 도형들을 이루며 전시돼 있다. 전문 큐레이터가 아니라 동네 애호가들의 솜씨라고 하는데 의도하지 않은 전위예술의 진수를 보는 것 같다. 형광등 조명으로 빛이 반사되는 점만 빼놓으면 환상적인 전시였다. 박물관을 돌아보면서 ‘가시철조망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조셉 글리든(Joseph Glidden). 1874년 그가 특허를 낸 ‘더 위너(The Winner)’라는 철조망은 현재 쓰이고 있는 가시철조망의 원조이며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철조망으로 꼽힌다고 한다. 그는 커피원두를 가는데 쓰이는 날카로운 금속 조각들을 다른 철사를 이용해 매달아 가시철조망을 발명했다. 이렇게 단순한 디자인도 발명이 될까 싶은데 그의 발명은 저렴하게 날카로운 울타리를 만들려는 숱한 시도들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1859년 존 크렌니거(John Crenniger)라는 사람은 나무 울타리 위에 날카로운 금속조각을 박아 넣었다. 1867년에 루시언 스미스(Lucien B. Smith)는 쇠기둥 사이에 줄을 잇고 돌이나 날카로운 금속조각의 실패를 걸어놓았다. 글리든의 디자인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개념이었다. 1873년 헨리 로즈(Henry Rose)는 나무 난간에 날카로운 금속 조각들을 박은 울타리를 선보였고 글리든은 이 울타리를 응용해 잽싸게 특허를 출원했다. 글리든의 발명 이후에도 무려 570 가지의 철조망 특허가 출원됐다고 하니 기술개발에 대한, 또는 철조망에 대한 미국 사회의 편집증에 가까운 집착을 알 수 있다.
 |
|
철조망 컬렉션. 박물관에서는 21가지 철조망 수집품을 31달러95센트에 판다.
|
울타리를 친다고 대평원을 가둘 순 없다
온몸 가득 바람을 맞았다
소유하지 않아도 세상을 누리리 철조망을 보면 반대로 환장할 사람들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이다. 그들에게 땅은 그들의 것도, 누구의 것도 아니었다. “나는 대초원에서 태어났다. 그곳에서 바람은 자유롭게 불고 태양의 빛을 부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나는 울타리가 없는, 모든 게 자유롭게 숨 쉬는 그곳에서 태어났다. 나는 벽으로 둘러싸이지 않은, 바로 그곳에서 인생을 마치고 싶다.” 코만치 부족의 텐 베어스(Ten bears) 추장이 남긴 말이다. 그의 소망과는 달리 대평원에는 철조망이 쳐졌고 철조망으로 분할된 땅은 상품으로 거래됐고 코만치 부족은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쫓겨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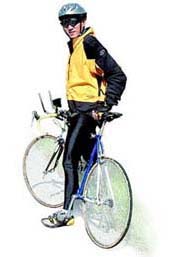 |
|
홍은택/〈블루 아메리카를 찾아서〉의 저자 hongdongzi@naver.com
|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