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1.06.22 19:45
수정 : 2011.06.22 19: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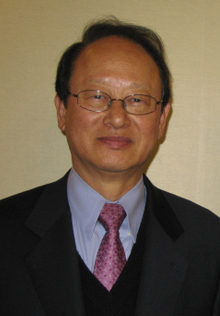 |
|
이부영 전 국회의원
|
6월22일은 1965년 한-일 협정이 조인된 날이다. 이날을 맞아 조인 46년째 되는 한-일 협정을 깊이 생각해보게 된다. 한·일 두 나라는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경제협력도 긴밀해지고 문화교류도 사람교류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툭하면 과거의 으르렁대던 시점으로 두 나라의 감정이 돌아가는 듯한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뭐가 잘못되어서 그런가, 이제 되짚어보는 일을 더 늦춰서는 안 될 것 같다.
올해는 일본인들에게는 끔찍한 해로 기억될 만하다. 지난 3월 동북지방에 대규모 지진과 해일이 덮쳐 엄청난 피해를 일으켰고 그 여파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여 지금까지도 방사능 유출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자연재해와 인재로 인한 참화에 일본열도와 전세계가 숨죽이면서 슬픔을 나눴고 도움의 손길을 즉시 내밀었다.
그런 와중에 나온 것이 일본 정부가 한반도 식민지배를 정당화·미화하는 왜곡 역사교과서의 채택을 확대하겠다는 조처였으며,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었다. 극한의 참화 속에 발표된 그런 입장은 1923년 간토대지진 당시 의도적인 유언비어·선동으로 무고한 조선인 수천명을 집단학살했던 그 사고방식과 너무나 닮았다.
우리 한국인과 아시아인들에게 일본인들의 그런 사고방식은 이해되지 않는다. 지난날 자신들이 피해를 준 이웃나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새로운 선린관계를 맺는 것이 정상일 텐데, 태평양전쟁 종전 70년이 가깝도록 정신연령 성장이 정지된 듯한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다. 일본의 그런 행태는 같은 경우의 독일과 자주 비교된다. 과거 서독은 나치독일의 침략과 박해를 당한 나라와 민족에게 사죄하고 가능한 한 배상도 했고 보상도 했다. 빌리 브란트 총리는 폴란드의 희생자 추모비 앞에 무릎 꿇고 사죄했다. 나치 전범들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도 추적하고 처벌했다. 독일의 이런 자세는 유럽공동체 그리고 유럽연합으로 발전했고 독일 통일의 바탕이 되었다.
1965년 한-일 협정 체결 당시 60년 4월혁명의 분위기가 지속되었다면 우리 쪽의 민간인 보상, 문화재 반환, 평화선 등의 포기, 일본 쪽의 정신대 사과 및 미귀환 해외동포 귀환의무 거부에 더해서 왜곡 역사교과서 책정이나 독도 영유권 주장 같은 것이 용납될 수 있었을까. 군사반란으로 독재정권이 들어서지 않고 민주정부가 한-일 협정 협상을 했다면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굴욕적인 협상 결과를 내놓을 수 없었을 것이다. 미국은 태평양전쟁의 종전 처리를 위해 일본과 연합국 사이에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체결하면서 대공방어망의 일환으로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한-일 수교를 상정하고 있었다. 한국은 연합국의 일원으로 대접받지 못했다. 정통성이 부족하여 미국의 인정을 받기에 급급했던 군사반란세력이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협상자세를 보이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렇게 식민지배의 피해 당사자인 우리 국민의 이익은 그 국민의 대표로 협상에 나선 정권으로부터 탄압당했고 무시되었다. 그 정권은 국민의 이익을 양보하고 포기하는 대가로 정권의 새로운 정당인 공화당의 사전조직 비자금을 일본으로부터 수수했다.
이제 미-소 냉전 시대도 군사독재의 시대도 지났다. 동아시아 평화공존 시대, 민주화 시대에 들어섰다고 한다. 그런데 식민지배 시대에나 통할 일본의 시대착오적인 조처와 주장이 반복되면서 동아시아의 평화공존과 새로운 한-일 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국민과 아시아인들을 몹시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빌미를 제공한 것이 식민 지배-피지배 의식을 반영해놓은 1965년의 한-일 협정이다. 이 협정은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 이 협정은 한국의 군사반란으로 등장한 독재정권이 국민의 의사와 이익을 억압하고 굴욕적으로 맺은 조약이므로 이 시대 한국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과거의 유물이다. 재협상을 통해 바뀌지 않을 경우 앞으로도 계속 한-일 선린관계에 애물단지 노릇을 할 것이다.
한-일 협정의 재협상은 동아시아 평화공존 시대를, 한반도의 평화 시대를 여는 열쇳말이며 한국 민주화의 시금석이기도 할 것이다.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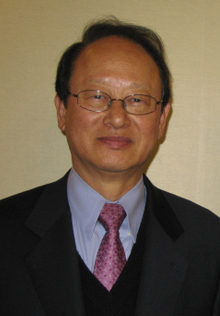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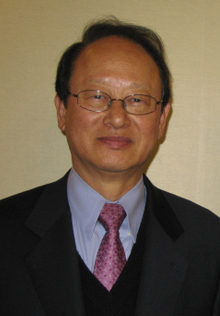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