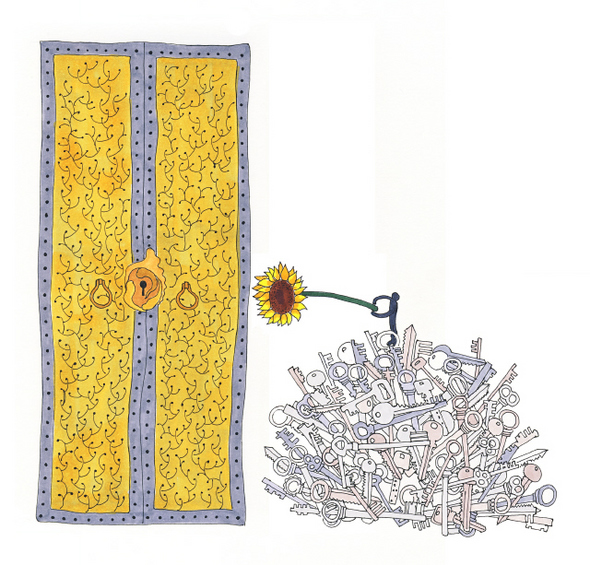 |
|
시는 몰입 끝에 찾아오는 ‘운명의 조타수’
|
짧은 글 한편도 단편소설만큼 공력 집중해야
못쓴다고 한탄하는 것은 게으름 인정하는 것
노력하지 않으면 눈부신 천성도 망각 속으로
안도현의 시와 연애하는 법 /
2. 재능 믿지 말고 열정을 믿어라
1970년대만 해도 아이들이 읽을 만한 잡지가 흔하지 않았다. 시골 초등학교 도서실로 다달이 오던 <어깨동무>는 몇 해 동안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나는 도서실에서 책을 정리하는 일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어깨동무>가 든 봉투를 처음 개봉하는 일은 내 몫이었다. 정말 한 줄도 빼지 않고 읽었다. 집으로 잡지를 가져가서 읽는 날도 있었다. 물론 도서실의 ‘권력’을 이용한 불법대출이었다. 우리 집 건너편 방앗간 할머니는 혼자 살았는데, 내가 슬픈 이야기를 읽어주는 걸 좋아하셨다. 물레를 돌리며 명주실을 뽑는 할머니 옆에서 글을 읽어주면 할머니는 자주 슬피 우셨다. 그 덕분에 나는 누에고치 속의 번데기를 얻어먹거나 가끔 십원짜리 동전을 두어 개 얻을 수 있었다.
책 읽는 것은 좋아했지만 내가 가장 하기 싫은 공부는 글쓰기였다. 독후감을 쓰기 싫어 책을 읽다가 덮어버린 적도 많았다. 매일 일기장 검사를 하는 담임선생님을 만나면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다. 4학년 여름방학 때 숙제로 쓴 일기를 5학년 여름에는 날짜만 바꿔 제출하기도 했다. 해마다 학교에서 백일장이 열리면 나는 시(운문)를 썼다. 시가 좋아서가 아니라 길이가 짧기 때문에 빨리 쓰고 뛰어놀기 위한 속셈이었다.
중학교 3학년 때 교지에 처음으로 투고한 시는 심혈을 기울여 썼음에도 어찌된 일인지 실리지 않았다. 나는 뭔가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혼자 함부로 단정 짓고 말았다. 좋은 시를 고르는 선생님의 안목에 문제가 있다고! 그리하여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문예반에 들어가 시를 써 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장래에 이름을 날리는 시인이 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교지에 적어도 시 한 편만은 꼭 실리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내 삶의 미래에 대한 설계도를 다시 그리면서 한 사람의 시인으로 살아가는 꿈을 꾸게 된 것은 30여 년 전, 거기서, 그렇게 비롯되었다.
천재 시인이 과연 있을까? 내가 보기에 천부적으로 문학적 재능을 타고난 시인이란 애초부터 없다. 어떤 시인의 재능에 대한 찬사는 작품의 예술성에 대한 찬사이지 인간으로서의 천재성을 인정한다는 말이 아니다. 천재 시인이라는 말이 랭보의 이름 앞에 붙는 것은 십대 후반의 어린 나이에 경악할 만한 상상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이고, 이상의 앞에 이 말이 붙는 것은 그의 파격적인 실험정신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다. 천상병 시인을 가리켜 ‘천상 시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생전에 보인 낭만적이고도 기구한 행적에다 그의 이름에서 연상된 말놀이를 결합한 결과이다.
시를 쓰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의 문학적 재능에 대해 회의하거나 한탄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것은 자신의 게으름을 인정한다는 것과 같다. 데이비드 베일스와 테드 올랜드는 <예술가여, 무엇이 두려운가!>라는 책에서 예술가가 “자신이 가진 재능이 얼마나 되는지 걱정하는 것보다 더 쓸모없고 흔한 에너지 소모는 없다”고 잘라 말한다. 즉 스스로 창조하고,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가지 않으면 눈부신 천성은 망각 속으로 사라져버린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주의 깊게 볼 것은 “자신의 작품으로부터 배워 나가며 발전한다”는 대목이다. 시인은 ‘시를 쓰는 사람’ 혹은 ‘시를 창작하는 사람’을 뜻하지만, 그 창작물을 통해 변화·발전하는 존재라는 말이다. 한 편의 시는 독자들을 감응시킬 뿐만 아니라 창작자 자신에게도 틀림없이 좋은 공부거리가 된다. 좋은 시든 나쁜 시든 ‘이미’ 창작한 한 편의 시에는 ‘앞으로’ 창작할 시의 방향과 원리가 다 들어 있다. 또한 어렴풋하게나마 시인이 살아가면서 지향해야 할 삶의 지침까지 들어 있기 마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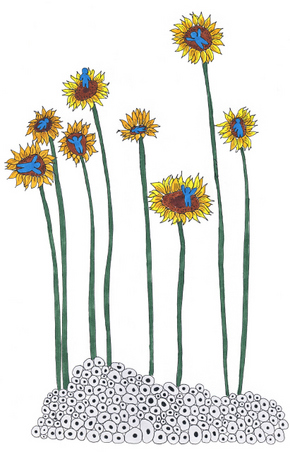 |
|
시는 몰입 끝에 찾아오는 ‘운명의 조타수’
|
 |
|
안도현 시인
|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