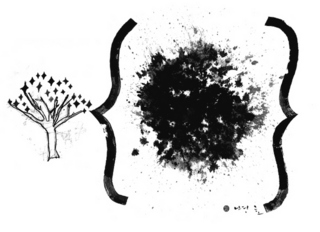 |
김용택의 강가에서
(17) 진메 마을의 가을
곡식 거두랴, 말린 고추 다듬으랴,참깨 세우랴, 토란대 껍질 벗기랴 농부의 손끝에서 생명이 영그는데
한수형님이 사고를 당하셨다니… 문득 살에 닿는 바람결이 달라졌을 때 우린 놀라지요. 나도 몰래 얇은 이불을 끌어다가 덮고 자고 있는 나를 봅니다. 더위에 헉헉거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가을이 와버리다니요. 해마다 겪는 일이지만 우리들은 이런 계절의 어김없음을 잊고 삽니다. 더우면 그냥 더위하고만 싸우느라 다른 정신 없고 추우면 추워죽겠다며 봄을 캄캄하게 잊고 살지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도 바쁜 우리들의 나날이 때로 남루해 보이기도 합니다. 파란 하늘은 끝까지 높아 눈 시립니다. 고개를 들면 쓸쓸해진 먼 산 빛이 이마에 와 닿습니다. 흐르는 세월을 느낍니다. 사는 일이 덧없음에 일손이 멈칫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금방 잊고 다시 일손을 놀립니다. 머릿결을 쓸어 올리던 손이 들여다봐지는, 그 손에 내린 햇볕이 낯선 그런 날입니다. 그 세월에도 햇살은 지상에 가감이 없습니다. ‘알맹이들의 과잉에 못 이겨/ 방긋 벌어진 단단한 석류들아/ 숱한 발견으로 파열한/ 지상의 이마를 보는 듯하다// 너희들이 감내해온 나날의 태양이,/ 오 반쯤 입 벌린 석류들아,/ 오만으로 시달리는 너희들로 하여금/ 홍옥의 칸막이를 찢게 했을지라도,// 비록 말라빠진 황금의 껍질이/ 어떤 힘의 요구에 따라/ 즙 든 보석들이 터진다 해도,// 이 빛나는 파열은/ 내 옛날의 영혼으로 하여금/ 자신의 비밀스런 구조를 꿈에 보게 한다.’(폴 발레리 <석류> 김현 옮김) 산과 강과 바다와 숲과 곡식들 위에 쏟아지는 저 눈부신 가을 햇살이 우리들의 칸막이를 찢고 있습니다. 한수 형님이 손수레에다가 붉은 고추를 가득 담아 끌고 집으로 갑니다. 돌주먹 같은 손을 가진 한수 형님도 더위는 어떻게 물리치지 못하시는지 여름 내내 강가 정자나무 아래 놓인 바위 위에 큰대자로 누워 매미 우는 소리를 향해 욕을 하며 지내는 동안 형님네 고추는 익어가고 정자나무 옆 밭에 심어 놓은 산두(밭에 심은 벼)와 참깨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지금은 참깨를 베어 세 발로 세워두고 산두 벼는 모가지가 하루가 다르게 고개를 숙입니다. 붉어지는 감, 벌어지는 밤송이들, 억새의 이삭들이 몸을 뚫고 쑥쑥 올라와 흰 손이 됩니다. 이른 봄부터 벼이삭이 익어가는 가을까지 해를 따라, 마치 해같이 한시도 쉬지 않고 일을 하는 뒷집 종길이 아제의 팔다리를 보면 마치 무쇠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는지 하루종일 아제를 따라다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회관 마당 정자 아래서는 할머니들이 앉아 일을 합니다. 당숙모가 토란 대를 가지고 오면 어느새 그 토란 대로 달려들어 토란 잎을 따고 토란 대 껍질을 벗겨 냅니다. 종만이 아저씨가 마른 고추를 가지고 와 회관 마당에 부어 놓으면 또 그곳으로 달려들어 고추를 다듬습니다. 또 누가 마른 옥수수를 가지고 오면 모두 그쪽으로 가서 옥수수를 깝니다. 바쁩니다. 요즘은 꿀을 따느라 바쁩니다. 농부들의 몸은 하루종일 열심이지요. 곡식을 다듬는 일이 금방 끝나면 할머니들은 또 정자에 앉아 가만히 산과 물을 심심하게 바라봅니다.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할머니들의 심심한 손을 나는 바라봅니다. 평생 땅을 파 온 성한 곳 없는 저 험한 손. 낫에 베이고, 호미에 찍히고, 불에 데이고, 가시에 찔리고, 돌멩이에 찧이고, 벌레에 물리고, 이렇게 아리고 저렇게 곯아 터져 손톱이 빠지기를 몇번이었던가. 우리 동네에서는 한수 형님의 손이 가장 험합니다. 나는 어떤 사진작가에게 며칠 동안 형님의 일 하는 손, 쉬는 손, 밥 먹는 손을 사진 찍어두게 했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그 상처가 아문 흉터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화산돌 같은 형님의 손은 성자의 손입니다. 회관 바로 앞집에 종만이 어른이 삽니다.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이 마른 몸이지만 못자리를 시작하는 이른 봄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논과 밭을 돌보지요. 안개 핀 이른 아침 논으로 가는 그이의 모습은 그림 속의 신선 모습 다름 아닙니다. 우리 동네 모두 15가구, 35명 정도가 사는데 논농사를 짓는 집은 한수 형님, 종길이 아제, 만조 형님, 동환이 아저씨, 재호네, 그리고 이장네 이렇게 여섯 집뿐입니다. 나는 할 일이 없습니다. 슬리퍼를 질질 끌고 집을 나와서 회관으로 갑니다. 회관 마당에는 참깨, 토란 대와 토란 잎, 강냉이, 고추가 붉게 널려 있습니다. 종길이 아제가 맑고 따가운 햇살 속에 널려 있는 고추를 뒤적이는 모습이 마치 이글거리는 숯불을 뒤적이는 것 같습니다. 한수 형님이 참깨를 베어낸 밭에다 무와 배추를 심어놓았습니다. 나는 한수 형님이 일하는 밭가에 서서 올해는 무지 더웠다는 둥, 벼농사는 잘되었다는 둥, 우리가 농사지은 것들은 날이 갈수록 똥금 되어가고 비료값 농약값 기름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는다며 “니미럴, 어디 농사짓고 살겄어, 이거. 평생 이러고 살았당게” 욕을 하기도 하고, 이러고도 나라가 성한 것이 이상하다는 둥, 금방 날씨가 시원해져서 이제 살겠다는 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말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강가 정자나무 밑에도 가보고, 한결 맑아진 가을 강물을 멀거니 바라보기도 하고, 산과 마을과 논과 밭과 하늘과 나무와 풀과 동네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여름 막바지에 비가 조금 와서 강물의 수량이 많고 조금 맑은 편입니다.
산들바람 속에 많은 풀꽃들이 피어납니다. 파란 하늘 아래서, 시를 쓰고 싶습니다. 가을이 왔다고, 가을에도 꽃들이 핀다고, 해 저문 가을 들녘에 농부들이 곡식을 거두어 이고 지고 지금 집으로 오고 있다고, 지금도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달이 떠서 세상을 비춘다고, 밤이면 홀로 잠든 어머니 집 섬돌에서 귀뚜라미가 울고 있다고 나는 시를 쓰고 싶네요.
 |
|
김용택 시인
|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