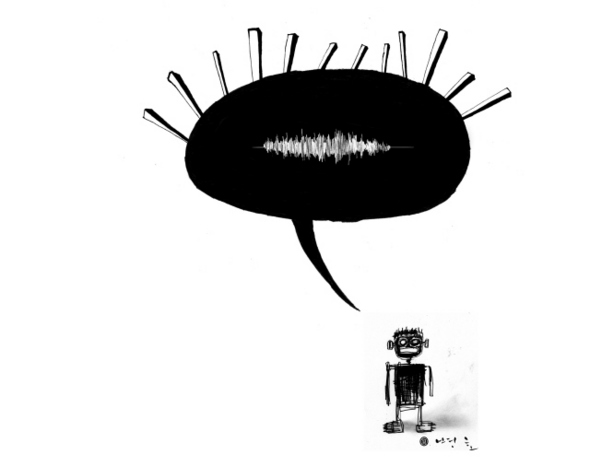 |
김용택의 강가에서
(19) 산행 뒷담화
가재한테 떼인 눈 못받아땅을 파며 애두루루 울고
물소리는 같이 가자 속삭
소쩍새는 너 잘사냐 묻네 주말이면 산행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높고 큰 산을 가는 게 아니라 전주에서 가까운 작은 산을 오르기도 하고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섬진강 운암 호수 언저리 비포장길이나 강천사 길을 서너 시간씩 걷기도 합니다. 동양 철학을 하시는 선생님이 한 분 늘 같이 가는데 산 정상이나 호숫가에 앉아 우리나라 아름다운 가을 들판이나 산자락에 싸인 봄 마을들을 보며 퇴계나 고봉에 대해, <시경>이나 <논어>의 글 구절 하나를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신선놀음이 따로 없지, 싶어요. 옛 어른들이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고요한 산중에 앉아 세월아 네월아, 이 세월 저 세월 뒤적이며 지금 우리들처럼 이러했을 것이란 생각을 하기도 해서 나 같은 날라리 얼치기 시인도 정신이 턱없이 고양되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세상에 부러울 것도, 겁나는 것도, 근심 걱정도 없어져서 세상을 향한 마음이 한없이 너그러워지기도 하지요. 나는 촌에 살았기 때문에 나무나 풀의 이름이나 생태를 조금 알고 있어서 때로 아는 척을 합니다. 산을 오르내리며 진달래와 산철쭉과 산동백과 산수유를 가르쳐주면 몇 주 후엔 또 까맣게 까먹어버려 사람들이 나를 애먹이기도 하지요. 풀을 꺾어 뽀얀 뜸 물이 나오면 먹어도 되는 풀이고, 노란색이나 다른 색의 뜸 물이 나오면 독초여서 먹으면 큰일난다고 어머니에게서 배웠고, 어떤 풀은 소나 돼지가 잘 먹는 풀이고, 또 어떤 풀은 거름으로 좋다는 것을 배웠지요. 어렸을 때 일입니다. 어머니와 밭에 가고 있었지요. 길가에 며느리밥풀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옛날에 시집온 며느리가 있었단다. 며느리는 저녁밥을 하고 있었지. 밥을 다 하고 나서 밥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아보려고 솥뚜껑을 열고는 밥솥에서 밥티 두어 개를 얼른 집어 입에 넣는 순간, 그때 하필이면 들에서 돌아온 시어머니가 부엌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그 광경을 봤단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자기들 몰래 밥을 먼저 먹으려고 한다고 화를 내며 며느리를 그 자리에서 내쫓고 말았대. 집에서 쫓겨난 며느리가 죽었는데, 그 며느리 무덤 위에 밥알을 입에 문 것 같은 꽃이 피었단다. 그게 저 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시고 가시가 정말 억센 넝쿨풀이 있는데 그 풀을 며느리밑씻개 풀이라고 일러주기도 했지요. 그 외에도 동네에 있는 많은 풀과 꽃에 얽힌 이야기들을 해주곤 했습니다. 처음 본 나무나 풀들의 이름이나 생태를 알고 기억한다는 것은 여간 힘드는 일이 아니지요. 우리나라 산이나 들을 돌아다니며 산야에 있는 나무나 풀이나 곡식들의 이름을 모르면 미안하지요. 요즘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나무나 풀이나 꽃을 공부하고 있어서 다행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괜히 어설픈 ‘생태적 애국주의’에 젖어 으스대기도 하는 꼴을 보면 그것도 자연스러워 보이지는 않지요. 알면 좋지만 모르면 또 어떻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저렇게 산과 산길과 작은 계곡들을 찾아다니며, 그야말로 유유자적 놀던 어느 날은 그 팀이 우리 시골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촉촉하게 젖은 달빛이 산과 강과 들과 마을 위에 떨어지는 어스름 저녁이었지요. 우리들은 마당 잔디 위에 비닐 멍석을 깔고 둘러앉아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지요. 산은 검지요. 먼 산에서 소쩍새는 간간이 너 잘살고 있냐고 물으며 울지요. 물소리는 어느 세상으로 흘러가며 같이 가자 속삭이지요. 풀벌레들은 우리들을 꼼짝 못 하게 에워싸고 울어댔습니다. 사람들이 정신없이 라면을 퍼서 자기 그릇에 담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던 나는 수많은 풀벌레 울음소리 속에서 문득 지렁이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라면을 입으로 가져가며 “야, 지렁이가 운다”고 했지요. 친구들이 라면을 상대로 재빨리 움직이던 손길을 뚝 멈추더니 입을 모아 “뭐! 지렁이가 울어” 하며 뜨악한 표정들을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그래, 가만히 있어봐. 저기 먼 곳에서 낭랑하고 아주 구슬프게 우는 소리 있지. 저 소리가 지렁이 울음소리여.” 친구들은 하나같이 “에이, 뻥치지 마. 지렁이가 운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 보네. 어떻게 지렁이가 울어” 하며 모두 나를 성토했습니다. 나야말로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지요. 왜냐하면 이날 이때까지 나는 지렁이 울음소리를 듣고 살았으니까요. 아니, 여태 지렁이 울음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거야? 나야말로 너무나 의아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저 수많은 풀벌레 울음소리 속에서 지렁이의 울음소리를 찾아 그들의 귀에 넣어 줄 수도 손바닥 위에 올려놓아 줄 수도 없다는 현실이었습니다. 갑갑하고 난감하기 이를 데가 없었지요. 그때 어머님이 ‘뚤방’(마당과 마루 또는 방 사이의 경계를 일컫는 전라도 사투리)을 지나고 계셨습니다. 나는 구세주나 만난 듯이 “어매 지렁이가 울지요 인-” 그랬더니 어머님은 돌아보지도 않고 “하먼” 하며 지나가셨습니다. 어머님도 평생을 지렁이가 운다고 믿고 살았지요. 나도 어머니에게서 지렁이가 운다는 것을 배웠거든요.
그때였지요. 친구 중에 하나가 부스럭부스럭 휴대전화를 꺼내더니 “야, 누구야, 너 네이버에 들어가 지렁이가 운가 안 운가 알아서 전화혀” 하며 자기 아들에게 전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난감하고도 난감했지요. 친구들은 이때다 싶었는지 나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산과 들을 다니며 내가 가르쳐주었던 나무 이름과 풀 이름과 그것들의 생태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뻥’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모른다 싶으니까 ‘되나케나’(아무렇게나의 전라도 사투리) 내 맘대로 이름을 말해주었다는 것이지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럴 때도 더러 있었습니다. 사면초가가 따로 없었습니다. 미치고 폴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나는 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기가 죽자 아내와 친구 부인들이 더 좋아했습니다. 김용택이 기가 죽을 때도 있다는 것이지요. 조금 있으니 친구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모두들 숨을 죽이고 기다렸지요. 친구가 전화를 끊으며 지렁이가 운다는 확실한 답은 없고 박완서 선생님의 어떤 소설 속에 ‘지렁이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단 한 문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은 그 단 하나의 문장을 가지고 지렁이가 운다는 것을 절대 믿을 수 없노라고 펄펄 뛰었습니다. 나도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고 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요.
 |
|
김용택 시인
|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