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일러스트레이션 이민혜
|
[매거진 esc] 공지영의 아주 가벼운 깃털 하나
온갖 핑계로 나이를 속이던 남자친구들의 정체가 우습게 탄로나던 순간들 “올해 몇이시죠?” 늘 당하는 일이지만 나이를 묻는 질문에 언제나 약간의 혼란이 따른다. 신문에서는 보통 현재의 년도에 내 출생년도를 뺀 것으로 된 만 나이를 쓴다. 그것이 숫자가 가장 적다. 한국나이로는 내가 63년생인 것을 감안하면 그냥 세는 나이를 말하면 된다. 그런데 소위 이른 63이라서 학교를 같이 다닌 62년생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는 정서적인 나이도 무시하지 못하긴 하다. “얘들아 우리 벌써 47, 낼 모레 오십이야” 뭐 이런 말을 하는 정서 말이다. 게다가 공교롭게도 내 주변의 친구들은 대학입시에서 재수를 한 사람이 많아 한 살이 더 많은 61년생 소띠의 수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되면 신문에서 표기되는 내 나이와 오래도록 친구로 지내는 동년배의 나이 사이에 무려 네 개의 나이가 나타난다. 세는 나이, 정서적 나이, 신문 나이 나이에 대해 생각할 때면 이상하게도 아주 오래 전의 어떤 밤이 생각난다. 80년대 초반이었던가 친구들과 신촌에서 술을 마시다가 나는 뛰어나와 먼저 택시를 탔다. 9시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집안의 규율 때문이었다. 몸과 마음이 몹시 피곤했고 일찍 들어오지 않으면 혼을 냈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있어서 속이 한참 상해 있는데 택시 운전사가 문득 “학생 몇 살이에요?” 하고 물었다. 순간 내 나이를 떠올리자 스물 둘이었다. (이건 그러니까 내 동년배들의, 그러니까 실제 내 나이보다 한 살 더 많은 정서적 나이였다)스물 둘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그 순간 내가 한 이백년쯤 산 것처럼 피로가 몰려와서 내 나이가 스물 셋만 되어도 그걸 거꾸로 해서 서른 둘이요 하고 대답하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스물 둘인 바람에 그냥 스물 둘이요, 대답해놓고는, 이렇게 늙었는데 나는 왜 아직도 스물 두 살 밖에 되지 않았을까 울컥 눈물이 나올 거 같았던 기억이 선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아아, 나는 22년을 살고도 이렇게 피곤한데 앞으로 6,70년을 어떻게 살까 갑자기 앞이 캄캄했던 것이다. 그러고 보면 확실히 아아, 나는 늙었는데 내 나이는 왜 이렇게 적을까 생각하는 바로 그게 젊다는 나날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한다. 요즘 같으면 “올해 몇이세요?” 하는 질문을 받으면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대로 만 나이부터 재수를 하는 바람에 나이가 많은 내 동년배 친구들까지의 네 종류의 나이 중에서 그때그때 편한 것을 댄다. 젊어 보이고 싶을 때는 맨 앞의 것을, 좀 무게를 잡고 싶을 때는 맨 뒤의 것을 말이다. 그런데 나이를 생각할 때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왜 사람들은 어떻게든 -특히나 남자들의 경우에 말이다. - 한 살이라도 나이를 더 먹을 수 있도록 가지가지 핑계와 구실을 대냐는 것이다. 이건 아무래도 나이를 계급으로 보고 사회를 군대로 보는 현상이 아닐까 싶다. 높을수록 먼저 편입될수록 권력을 가지게 되고 또 유리하다는 면에서 그런 것 같다. 이때 제일 많은 희생을 치르는 것이 아마도 50년대와 60년대 초반 남자들의 고향에 있는 행정계와 의료계가 아닐까 싶다. 행정계가 수난을 겪는 이유는 호적이 잘못 되어서, 라는 핑계가 그 으뜸이고 행정계의 무능을 뒷받침해주는 것이 “그때에는 어린 시절에 하도 많이 죽어서 제대로 호적신고를 제때 하지 않았다’ 는 무능한 의료계에 대한 고발이 그 다음이다. 1930년에 태어나신 우리 아버지와 1900년에 태어나셨던 우리 할아버지도 호적상의 나이를 한 번도 부정하신 적이 없는데 대체 어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다. 이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그때 아무리 우리나라가 못살았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된 병원과 호적계는 거의 한 군데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내 주변의 남자들은 행정계와 의료계의 무능을 들먹이는 일을 21세기인 며칠 전까지 답습하고 있기는 하다. 사주팔자 ‘제대로’ 보려다가 들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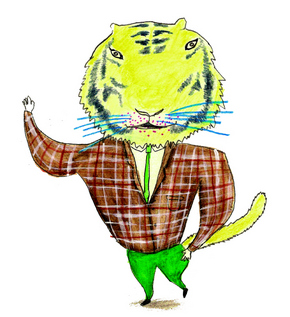 |
|
일러스트레이션 이민혜
|
 |
|
공지영의 아주 가벼운 깃털 하나
|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