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다꽝과 오뎅’에 관한 미스터리
|
[매거진 esc] 공지영의 아주 가벼운 깃털 하나
왜 꼭 단무지·어묵이라 부르라 강요하는지, 왜 길거리에서 먹는 게 더 맛있는지 얼마 전 지방에 내려갔다가 기차를 타고 올라오려는데 배가 고팠다. 내가 워낙 우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터미널의 한 스낵코너에서 우동을 시켰다. 우동이 나온 후 다쿠앙 좀 더 주세요 -물론 발음이야 다꽝이라고 했겠지만 - 했더니 주인아주머니가 어이없다는 듯이 나를 바라보더니, 단무지에요 다쿠앙이 아니라, 했다. 그리고는 내가 단무지라고 발음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듯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정색을 하고 교정해주는 스낵코너 아주머니 실은 다쿠앙 더 주세요, 했을 때 나도 잠깐 망설였었고 굳이 다쿠앙이라고 한 것은 나 대로 뜻한 바가 있어서이긴 했다. 스파게티는 스파게티고 피자는 피자고 스테이크는 스테이크, 햄버거는 햄버거이고 심지어 우동도 우동이고 돈까스도 돈까스인데 왜 다쿠앙만 이렇듯 내가 무슨 나쁜 말이라도 발음한 것처럼 교정을 받아야 하는지 나는 요즘 계속 의문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대로 해보자고 다쿠앙 더 주세요 한 것인데 순간 아주머니나 나나 마치 무슨 나쁜 발음이라도 한 것 같은 기분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러고 보니 이런 뉘앙스의 음식이 또 하나 더 있다. 오뎅 말이다. 오뎅은 도무지 어묵국이나 어묵꼬치 같은 이름으로 부르면 그 느낌이 살아나지 않으니까 말이다. 그 아주머니는 아마 내가 오뎅 주세요 했으면 오뎅이 아니라 어묵이에요, 하고 날 빤히 바라볼 것 같았다. 엄밀히 말해 오뎅은 어묵이 아니다. 오뎅은 어묵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에 무와 곤약등을 넣고 국물을 우려낸 음식의 이름이니까 말이다. 굳이 말하면 어묵국, 어묵탕 이라고나 할까. 글쎄 내가 젊었더라면 아마, “아주머니 피자는 피자고 햄버거도 햄버거니까 다쿠앙이고 오뎅이고 그냥 그 나라 이름으로 부르는 건 죄가 아니에요” 했을까. “일본말 중에서 이씨조선이라든가 민비라든가 식민 지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지금도 논란이 되는 단어를 제외하고 음식이 그 나라 고유의 음식인데 무슨 죄가 있어 그렇게 이상하게 꼭 번역을 해야 하냐구요. 나는 푹신의자나 얼음 보숭이나 그게 좀 이상하더라.....언어라는 게 원래 온 세계를 살아서 제 발로 돌아다니는 건데요. 그리고 그렇게 외래의 언어를 받아서 각 나라의 언어는 더 풍부해지는 거구요”라고 했을지도 모르겠다.그러고 보니 나이가 꽤 들긴 든 것 같다. 지금은 싸우고 싶은 일이 있으면 싸우는 사안이 먼저 생각나는 대신, 내가 싸운다고 북한이 국민을 배불리 먹이고 이 정권이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든다. 그러면 그냥 맥이 쭉~~빠져버리기 때문이다. 아닌 게 아니라 터미널 한구석에서 나오는 뉴스의 화면들이 내 기운을 쪽 빠져버리게 해서 나는 그냥 “어쨌든 주세요” 하고 말았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비가 퍼붓더니 그 저녁 서늘한 바람이 창문으로 스며들었다. 어디선가 풀벌레가 울고 있으면 제격인 밤이었다. 아아 드디어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구나......하는 생각에 이불을 꼭 여민 채로 누워있는데 영 잠이 오지 않았다. 배가 고파서였다. 여행 중에 과음에 과식을 한 탓에 체중이 불어나 저녁을 먹지 않고 어서 자려고 누웠는데 세상 이치가 그렇듯이 참으려고 생각하니 더 배가 고팠다. 아침에 괜히 그 아주머니 때문에 다쿠앙 우동 오뎅 하다가 오뎅에 꽂혀 버린 것이다. 나는 오뎅을 좋아한다. 아주 좋아한다. 어린 시절 남들 다 좋아하는 짜장면, 떡볶이, 튀김 등은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오뎅만큼은 앉은 자리에서 남들의 서너 배는 먹었다. 지금도 길거리 지나가는 길에 (특히나 이제 가을이 된다 찬바람 이는 저무는 거리의 오뎅 꼬치! 추운 밤, 손을 주머니에 넣고 버스 정류장으로 종종 걸어가다가 친구의 손짓에 따라가 횡재처럼 얻어 먹었던 잔 소주 한잔에 오뎅 꼬치 하나는 얼마나 아름다운 젊은 날의 추억이었던가) 오뎅 파는 포장마차가 있으면 그날의 의상과 그날의 동행에 상관없이 발길이 머뭇거린다. “이 담에 돈 벌면 오뎅 많이 사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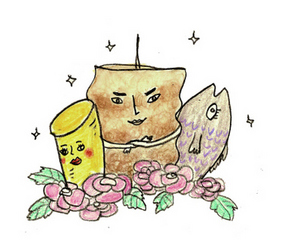 |
 |
|
공지영의 아주 가벼운 깃털 하나
|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