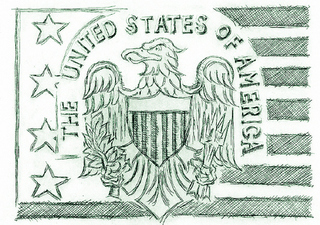 |
|
삽화 민정기 화백
|
백기완-나의 한살매 7
“기완아, 만원만 만들 거라, 그것만 만들면 너는 그렇게도 안타깝게 바라던 축구선수가 된단다.” 열해가 가고 백해가 가 하얗게 늙는 한이 있어도 만원만큼은 죽어도 만들고야 말리라 다짐하며 나는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낡은 벽돌에 묻은 세면을 떼어내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은 고되고 품삯은 몇 푼 안 되었다. 더구나 괴로운 건 일을 끝내도 돌아갈 데가 없는 거라, 그야말로 하염없이 걸어 가는데 아버지를 만났다. “야 아바이.” “어 기완아.” 우리는 남이 보거나 말거나 껴안고 뒹굴었다. “야 아바이, 아직도 눌데(방) 하나 못 얻었네, 이거 죽겠구나 이거.” “고마이 있으라우, 이제 곧 돼.” 그러면서 씹씹이 가신다. “야 아바이, 밥도 안 먹고 헤어지네.” “고마이 있으라니까, 이제 곧 돼.” 나는 쫓아가 아버지 손을 잡고 남산 올라가는 길바닥 밥집에서 동태 대구리 찌개와 밥 두 그릇을 시켰다. 나는 낼름 먹었는데 아버지는 그냥 앉아만 계신다. “아바이, 왜 그래 나 돈 있어” 하고 몇 푼을 내놓았는데도 그냥 일어서련다. 아주머니가 안됐던지 밥 한 그릇을 거저 주는데도 아버지는 그냥 일어서 가며 “고마이 있으라우, 이제 곧 돼” 그러시는데 터진 입술에서 마른 피가 썰핏 어린다. ‘아, 덤덩이(산덩어리) 같은 우리 아버지가…’ 나는 불끈 쥔 주먹으로 눈자위를 훔치며 중얼거렸다. ‘어쨌든 나는 돈 만원 만은 만들어야 한다, 단돈 만원’ 그러는데 길가 집 먹개(벽)에 ‘알림’이 눈에 들어온다.그때 서울에서 가장 높은 8층집 ‘반도여관(요즈음 롯데여관)’을 차지한 미군이 ‘승강기 몰이’를 찾는 것이었다. 나이는 열셋에서 열여섯, 영어를 좀 하고 욱끈(건강)한 애, 그거였다. 나는 첫 다룸(시험)에서 한발은 올렸다. 또 한발은 높은 사람을 만나서 댓거리(면접)를 하는 것이었다. “이봐, 영어를 알아?” “네, 조금.” 그러면 “미합중국을 영어로.”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그러면 “위대한 미국은.” “더 그레이트 아메리카.” “됐어.” 몇 날 있다 와 보란다. 가보니 내 이름 딱 하나만 붙어있다. 너무나 기꺼워 달뜨게(열심히) 승강기 모는 걸 배우는데 내가 한때 일을 하던 집, 밥 많이 먹는다고 내쫓았던 설렁탕집 아저씨가 날 보더니 “너 여기서 일하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앞으로 너는 큰사람이 될 거다, 길을 잘 들었으니” 그런다. ‘길을 잘 들었다고?’ 또 벽돌 까는 일터 일꾼들의 입도 바빠졌다. “그 새끼, 그거 말없이 혼자 일만 하더니 아무튼 무언가 있었던 놈이라고 무언가” 입이 닳고. 우리 라비(고향) 사람들도 “기완이가 잘됐어, 이제 미국까지 갈 테니 두고 보라니까” 그러고. 그런데 뜸꺼리(문제)가 일고 말았다. 승강기를 탔다 내렸다 하는 미군들이 다 떨어진 내 꼬라지를 보고 입을 삐쭉이고 장교 하나는 날더러 “꼬마 심부름꾼 임마, 이따위론 안돼, 미군 옷으로 갈아 입어야지”라고 나무라다가 군밤까지 먹인다. 나는 손을 쳤다. 그런데 날 또 툭 건드린다. 이에 눈깔을 치켜뜬 것이 그만 탈이 되고 말았다.
 |
|
백기완
|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