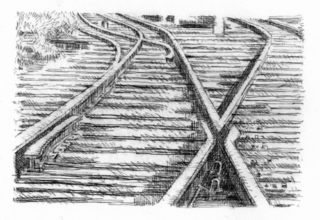 |
백기완-나의 한살매 9
샛노란 절망을 어쩔거나 눈깔만 남았다는 이야기를 아는가. 열이 걸리면 셋은 죽는다는 ‘급성폐렴’을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한데서 주사 한 대 못 맞고 쓸루(약가루) 한술 못 먹고 일어나자, 둘레의 빌뱅이들이 마른입을 찧었다. “저건 밑떼(저력)가 있는 애라고, 죽지만 않으면 아마도 씨름꾼이 될 거야.” 그러나 그것은 개수작이었다. 몸은 다 가고 눈깔만 남았기 때문이다. 손바닥과 얼굴도 노오랗고 갈 데라곤 노리끼리한 ‘난민수용소’뿐이었다. 유리가 없는 들락(문), 삐그덕대는 바닥, 겨우 열 사람이 누울 만한 넓이에 서른이 넘는 사람들이 빼곡히 꼬불치는 곳. 아침에 일어나도 밥이 없었다. 똥뚝은 똥이 덤(산)처럼 뾰족이 얼어 엉덩이를 댈 수가 없고 이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짜증이 엇갈렸다. 거기에 홀어머니와 함께 있는 내 동무 살구는 그렇게 마음이 고울 수가 없는데도 나한테는 이따금 밉살스럽게 엥겼다. 이 바닥에 있는 ‘이’는 모두 내 거라고 한다. 아니다, 네 거라고 실랑이를 하다가 붙었는데 죽다 산 내가 택이나 있을까. 실컷 밟히고 난 날 난 아버지를 만나 따졌다.“야 아바이, 아직도 눌데(방) 한구석 못 얻었네.” “야 오소리도 쭐이타면(급하면) 남의 집을 밀고 들어가 이 새끼야. 맨 놈의 집인데 왜 밤나닥 집 투정이냐.” “뭐야, 나 가가서, 북쪽 엄마이한테 도루 가가서.” “갈 테면 가라우, 이 백땅놈의 새끼야.” “못 갈 줄 아네.” 홧김에 금이 없는데도 38선이라는 곳까지 갔다가 매만 맞았다. “네 에미 머리엔 벌써 시뻘건 뿔이 났어. 뿔난 에미는 만나 뭘 해 임마.” “뭐야, 우리 엄마이가 얼마나 예쁜데 뭐 뿔이 났다고, 죽여 버리겠다”고 대들다가 매만 맞고 돌아서며 나는 하늘도 땅도 샛노랗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깜떼(절망)란 그런 것이 아니던가. 사람도, 축구도, 들도, 먹거리도 모두 노오랗게 보이는 깜떼. 깨어보니 또 그 ‘난민수용소’다. 그런데 살구 녀석이 빙그레 웃으며 밀어준다. 꽁꽁 얼은 ‘이’ 여남은 마리는 네 것이니 갖고 가 잠만은 딴 데서 자란다. “뭐야, ‘이’라고 하면 어째서 모두 내 것이냐 이 새끼야” 하고 한판 하러 나가며 생각했다. ‘쟈하고 붙어서 내가 지면 나는 죽지도 못한다. 그러니 반드시 이기자’ 하고 배지기로 들었다 엎고선 막 까려는데 누가 툭툭 친다. 가대기(어깨 짐군) 언니다. “언니, 오늘은 내가 이겼지.” 그랬는데 딴말을 한다. “싸움은 뺏는 놈, 일테면 있는 놈하고 붙었을 때 이기고 지고가 있는 거야. 가진 것이라곤 ‘이’밖에 없는 것들끼리 붙어봐야 서로 코만 터져.”
 |
|
백기완
|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