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951년 5월 부산 피난 시절 ‘제5육군병원’에서 군번도 계급도 없는 ‘졸병’으로 복무하던 시절의 필자(오른쪽). 당시 부대 안에 있던 병원장 백태호 대령의 사택에서 그 아들(앞쪽), 부대의 상관(왼쪽)과 함께 찍은 것으로 전쟁 시절 유일한 사진이다.
|
백기완-나의 한살매 17
전쟁이 한창일 적 이야기다. 쪼매난 초등학교 뒷간 낡은 먹개(벽)엔 누군가가 숯덩이로 그림을 하나 그려놓았다. 그것 때문에 깨진 그 학교가 발칵 뒤집히고 말었다. 그림은 딴 거이 아니었다. 늦장마에 시달린 오이처럼 아무렇게나 늘어진 몽뎅이를 삐죽이 그리고, 그 위에 어린 꼬마 하나가 올라타고 그 몽뎅이를 톱으로 석석 자르는 모습이었다. 다만 그 몽뎅이에 올라타고 있는 꼴이 금세 떨어질 것 같애 씰그러진 입의 됨됨이가 새뚝이라면 새뚝이일까. 새뚝이라니 무슨 말일까? 아무리 이름 있는 이가 그린 것이라고 해도 한 두어 달 걸어놓고 보면 눈에 멍이 박히듯 지겨워지는 것이 있다. 그것을 억은 그림 또는 박힌 그림 그런다. 그러나 보면 볼수록 새로워지는 구석이 있는 데를 새뚝이 그런다. 그러니까 새뚝이란 무달(침묵)까지 삼킨 썩은 늪이라고 하드래도 퐁당 하고 던지는 돌멩이 하나에 깨지듯이 그 어떤 돌림(미적 전환)의 때박(계기)일 터이다. 아니 목숨(생명)일 터이다. 아무렇게 직직 그린 것 같은 그 먹개 그림엔 바로 그런 새뚝이가 있었건만 교장 선생님은 그것을 “빨갱이 그림이다” 그랬다. “긴 몽뎅이는 바로 미국 군인의 큰 코요, 그것을 자르는 애는 빨갱이다. 그러니 그 몹쓸 놈을 찾으라” 그랬다. 한참 불길이 여기저기 번질 때라, 학교에 나오는 선생도 없고 애들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찾으려 들었을까. 마침 한 선생이 놀러 오는 애의 빈묵(공책)에서 비슷한 그림이 나오자 닦달을 했다. “너 저 뒷간 먹개 그림도 네가 그렸지?” “네.” “왜 그따위 그림을 그렸느냐. 누가 그리라고 했느냐”고 웅쿠르자 그 애는 고개 숙여 눈물을 떨구며 하는 말이었다. 불길을 비켜 한없이 가다가 남의 집 외양간에서 엄마, 아빠, 애루(동생), 나 이렇게 넷이서 자고 있었단다. 이때 코 큰 딱꾼(병정)이 우리 엄마와 싸움이 붙었는데 힘에 밀린 엄마가 끌려간 뒤 영 안 돌아오셨다. 이에 아버지는 엄마를 찾다가 돌아가시고 어린 애루는 엄마만 부르며 어제도 울고. 약이 올라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고 했다. 몹쓸 등빼기(반역자)라도 잡은 듯 웅쿠르던 선생은 어찌했을까. 그 어린 것을 껴안고 울고 옆에 있던 애들도 울고 교장 선생님도 울고 울음바다가 되고 말었다. 그리고 총알 자국으로 듬성듬성하던 그 뒷간이 폭격에 헐리면서 거기에 그려졌던 숯덩이 그림도 없어지고 말었다. 나는 그 무렵 부산으로 내려가 부산 부둣가에 있던 ‘제5육군병원’에서 몇몇 그림꾼들과 같이 졸병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 안의섭(‘두꺼비’ 시사만화가·작고), 김창환(서예가·작고), 이항성(서양화가·작고), 그 가운데서도 이항성씨는 한 두술 나와 찻집엘 가곤 했는데, 거기에는 도상봉·이봉상·이중섭씨도 있었던 것으로 더듬어진다. 아무튼 찻값은 늘 이항성씨가 내곤 해 허물없이 그 어느 초등학교 뒷간의 그림 이야기를 했다. 눈물이 나더라고. 이때 누군가가 갑자기 꽥, 소리를 지른다.“그따위는 그림도 아니야, 놀투(장난)도 못 되고, 빨갱이 그림이나 다름없는데 그따위를 나불대는 네놈은 빠꾼(침략자) 아니냐, 나가라”고 소리소리 지르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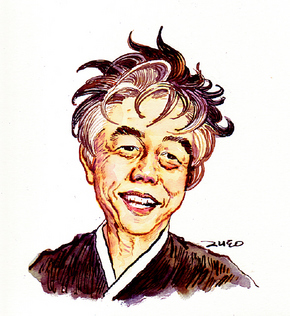 |
|
백기완
|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