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970년 11월3일 학생의 날을 맞아 장준하 선생과 필자를 비롯해 그를 따르는 젊은이들이 민족학교를 결성하고 이듬해 10월 묶어낸 <항일민족시집> 초판(왼쪽)과 2005년 광복 60돌 기념으로 재출간한 복간본(오른쪽)의 표지. 본격적인 ‘민족민주운동’의 사상적 결의를 상징하는 사료로 평가받는다.
|
백기완-나의 한살매 42
“여보, 자꾸 들쑤셔 잠을 못자겠어.” “또? 댓님(당신)도 참 불쌍하구려.” 그게 그러니까 서른여덟 해 앞서 다친 헌디 때문일 터이다. 1971해, 그때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나는 그저 울기만 했다. 울고 앉았는 사람을 때리다니, 그럴 수가 없었다. <백범어록>이란 글묵(책)을 꾸린다고 도서관에서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란 백범 선생의 글을 찾아낸 허술(조선일보)이가 달려와 읽어준다. “한살매 일본 제국주의와 싸워온 날더러 누구는 미제 앞잡이라 하고, 또 누구는 소련의 앞잡이라 하고, 이럴 수가 있는가. 겨레여! 다 하나가 되어 통일독립을 이룩하자!”라는 말을 다시 듣게 되자 울먹이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장준하 선생이 묻는 것이었다. “백 두하(동지), 간들(운명)이란 무엇인 것 같소?” “글쎄요, 바람 앞에 굳불(촛불) 같은 거, 그걸 간들 그러지만 나는 도리어 간들은 대들(도전)이다 그래 보는데요.” 아무 말을 않고 내 손만 꼭 쥐던 생각이 난다. 그 무렵 젊은 최혜성·김도현·김정남·유광언·정성헌·윤무한 더러(등)는 장 선생, 김지하와 함께 안둘(교실) 없는 ‘민족학교’를 춘천에서 열다가 경찰에 쫓겨 찻집으로, 거기도 못 들어가게 해 아우내(성)를 칠 때도 나는 그저 울기만 했다. 그때 ‘민족학교’에선 <항일민족시집>도 꾸리고 있었다. 이를테면 나라 사랑의 피눈물들…, 그런데 나는 나대로 ‘태백덤(산)의 참만이 이야기’를 목메어 으르며 날뛰었다. 참만이라니, 누구일까? 썰매를 타고 눈이 허옇게 쌓인 태백덤 줄기를 달리다가 넓적다리가 커단 나무에 낑기게 되었다. 왜놈들은 쫓아오고. 하는 수 없이 도끼로 제 다리를 탕탕 끊어 팡개치고선 또다시 내달리는 고실빛(은빛) 언덕의 뚝쇠(영웅) 아, 참만이. 그를 울고 있는 나를 때릴 개망나니가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모를 일이었다. 나를 잡으라는 바람에 냅다 달아났다. 갈 데도 없고 돈도 없었다. 나는 배추(방동규)더러 한기찬을 불러 함께 달아나자고 했다. 배추, 그 힘꾼이 나한테 가르쳐준 것은 딱 하나, 사랑이었다. 요즘 돈으로 수십억 나갈 집을 어느 아줌네(여인)한테 몽땅 주고 저는 남의 닭장에 살기에 “야, 그렇게 다 주면 되냐?” 그랬을 적이다. “사랑은 다 주는 거야, 꽁치는 게 아니래두.” 그렇게 뜨매(감동)를 주던 벗들과 마곡사 둘레에서는 돈이 떨어졌다. 김장하다 남은 무쪽 한소쿠리를 훔쳐 때우다가 서울로 왔지만 갈 데가 없었다. 겨우 꽁치 통조림 하나와 쐬주 몇 땅지(병)를 사들고 어느 가난한 벗을 찾았다. 거기서 막 먹으려고 하는데 댓살 된 꼬마가 자다 말고 일어나 “엄마, 웬 맛있는 냄새야?” 그러는 것을 보고 나는 갑자기 목이 메어 젓가락을 들 수가 없었다. 애비가 눈을 부라리자 그 꼬마는 멋쩍어 낡은 라디오만 이리저리 돌리고, 그런데 노녘(북쪽) 굴대(방송)에서 내 글 이야기가 나온다.“통일은 네가 이기고 내가 지는 싸움이 아니다. 일제와 싸우던 곧맴(양심)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라는 글귀가 흐르거나 말거나 꼬마는 칭얼댄다. 눈물이 났다. 나는 왜 꽁치통조림을 하나밖에 못 샀던가. 내 언젠가는 한 궤짝을 사다 주리라 하고 나온 뒤 어느 날이다. 누가 내 뒤통수를 친다. 대뜸 쓰러진 나를 질질. 이따위 몽뎅이로 내 뒤꿈치를 거퍼 갈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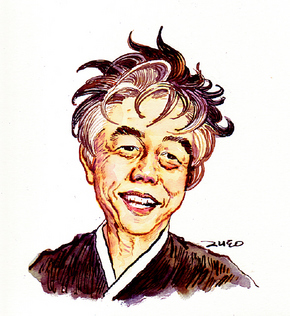 |
|
백기완
|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