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필자가 미군사령부의 판문점 통역관으로 다시 파견된 1955년 무렵 서울은 폐허처럼 망가져 청계천변의 판자촌(왼쪽) 같은 빈민가가 즐비한 반면 이른바 ‘한국전쟁 특수’ 덕분에 폭발적 경제성장을 이룬 도쿄 시내엔 고가도로(오른쪽)가 들어서며 흥청거렸다.
|
정경모-한강도 흐르고 다마가와도 흐르고 35
1955년 무렵 일본은 자신만만하여 ‘이제 전후(戰後)는 끝났노라’고 정부의 경제백서에서 밝힐 만큼 눈부신 경제부흥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처럼 급속한 고도성장은 말할 나위도 없이 한국전쟁 덕분으로 별안간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달러의 소낙비(특수) 때문이었고, 또한 정치적으로도 사회당을 만년 야당으로 몰아넣고서 자민당이 일당 영구집권을 구가할 수 있는 이른바 ‘55년 체제’가 확립됨으로써 정치 풍토가 급속도로 우경화되어가고 있던 때였사외다. 군국주의 색채가 농후한 일본 우익세력의 부활을 일본 현대사에서는 ‘역코스’라고 하는데, 이 ‘역코스’를 뒤에서 밀고 있는 것은 미국의 힘이었소이다. 그해 가을 미군 수송기를 타고 일본을 떠나 김포공항에 내려 보니까 전쟁의 참화로 고국의 산천은 헐벗을 대로 헐벗어 있고, 한창 흥청거리고 있는 일본의 화려함에 비해 너무도 차이가 심해 저절로 한숨이 나오더이다. 혹시 미국의 정책은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정치적으로는 우익화되어 가고 있는 일본에 한반도에 대한 재지배를 맡기려는 것은 아닐까, 벌떡 먹구름 같은 의심이 떠오르더이다. 이것이 아무 근거도 없는 기우가 아니었다는 것은 점차로 명확해지는 것이나, 아무튼 착잡한 심경으로 판문점 미군 캠프를 다시 찾아갔소이다. 미국은 54년 제네바협정에서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베트남을 남북으로 갈라놓은 뒤 남쪽 고딘디엠 친미정권을 육성강화하는 정책에 몰두했는데, 한국에 대한 정책도 기묘하게 그와 맞아떨어지는 모습이 나로서는 마땅치가 않았소이다. 그렇다고 미군들 틈에 끼여 살고 있는 처지에 그들 앞에서 맞대놓고 미국의 정책을 비판한 적은 없었다고 나는 지금도 믿고 있소이다. 그렇다고는 하나 스스로의 말과 태도에 대한 조심이 모자랐던지, 혹은 마음속의 불덩어리가 너무나 뜨거웠던 탓인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던 모양이외다. 어느날 상부로부터 호출을 받고 가 보니까 대령급 군인들이 둘러앉아 내게 해고를 통고하고 동시에 판문점을 떠나라는 퇴거명령이 떨어집디다. 무슨 기소문 같은 것이 낭독된 것도 아니고 내게 항변의 기회가 주어진 것도 아니니까 형식을 갖춘 재판은 아니었으나 내가 미국에 대해서 ‘기피인물’(Persona nongrata)이라는 것을 정식으로 통고받았다는 점에서 보면 일종의 재판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이외다. 그때의 구두 통고 내용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영어로 다음과 같은 것이었소이다. “판문점과 같은 민감한 부서에서 당신이 근무하고 있다는 건 미국의 국가이익과 일치하지 않는다.”(Your presence in such a sensitive post as Panmunjom is incompatible with the best interests of the U.S.)그 당시는 매카시즘이 판을 치고 있을 때이고, 예컨대 찰리 채플린과 같은 2차대전 중 미국을 위해 더할 나위 없는 공훈을 세운 저명한 인물조차 적색분자라는 혐의를 받고 미국으로부터 추방을 당하던 때이니 내게 무슨 변명의 여지가 있었겠소이까. 오히려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다음날 판문점을 떠났소이다. 미군 당국은 친절하게도 호위병을 둘씩이나 붙여 나를 비행기에 태워 도쿄의 미군 공군기지인 요코다 공항까지 데려다 주고는 거기서 나를 ‘석방’해 주더이다. 내가 그때 미군에게 감사했던 것은, 만일에 그들이 무슨 꼬투리 같은 것을 잡아-잡을 만한 꼬투리도 없었겠으나-나를 한국 정부에다 넘겼던들, 틀림없이 나는 특무대의 취조를 받았을 터이고, ‘스네이크 킴’(김창룡)과 같은 자의 손에서 목숨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으리라고 생각했던 까닭이외다. 아무튼 그때가 56년 5월이었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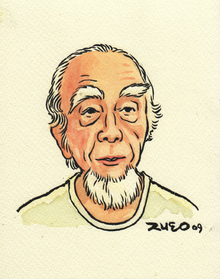 |
|
정경모 재일 통일운동가
|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