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956년 서울로 돌아온 필자는 70년 다시 일본으로 떠날 때까지 옛 경기중학교 부근 화동을 비롯해 북촌 일대를 옮겨다니며 셋방살이를 했다. 사진작가 임인식씨가 경비행기를 타고 찍은 50년대 북촌 일대 한옥마을 전경. 왼쪽 위 하얗게 보이는 공간이 경기중 교정이다.
|
정경모-한강도 흐르고 다마가와도 흐르고 42
영어 속담에 ‘옷장 속의 해골바가지’(A skeleton in the closet)라는 것이 있소이다. 남에게 알려지기가 꺼려지는 집안 비밀이라는 뜻이라오. 2박3일의 가족방문을 거듭하고 있던 그 시절 내가 서울에서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를 말하려면 아무래도 ‘해골바가지’ 얘기를 뺄 수가 없어 주저스러우면서도 ‘옷장 속’을 내보이겠는데, 그건 내 외삼촌과 아우에 관한 사연이오이다. 1956년 일본에서 본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을 때 그래도 당분간의 생활비 정도는 미리 집으로 보내두었을 것 아니오이까. 그 당시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어서, 일본에 있는 믿을 만한 지인에게 일본돈을 맡겨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울에서 받아 쓰도록 아우에게 연락을 해뒀어요. 그런데 서울에 와 보니 그 돈이 송두리째 없어졌어요. 아우가 외삼촌에게 속아 전부 날려버린 것이오이다. 그 외삼촌이라는 사람은 옛날부터 누님 되는 내 모친을 살살 꾀어 용돈을 뜯어다 쓰고는 하는 버릇이 있어 선친 살아 계실 때부터 우리 집안에서는 꺼리는 인물이었는데, 철없는 아우가 그 외삼촌의 감언에 그만 속은 것이었소이다. 물론 허물은 아우에게도 있었지요. 6·25 때 군대에서 나오자마자 무턱대고 형이 있는 일본으로 온답시고 밀항선을 탔다가 일본 경찰에 붙들려 대마도 이즈하라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으니 어떻게 손을 써달라고 전보가 어느날 날아들어 왔소이다. 지금까지도 후회스러운 것은 그때 모른척하고 그냥 놔두는 것이 오히려 본인에게는 약이 되었을 것을, 선친께서 세상 떠나신 직후이기도 하고, 가엾다는 생각에 각방으로 손을 써 겨우겨우 가석방 처분으로 내가 사는 곳까지 오게는 되었는데, 그게 오히려 어린 아우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던 것이외다. 미군 사령부에서 근무하면서 형이 느끼고 있는 심리적인 고통을 알 까닭이 없는 아우는 형이 아침저녁으로 자가용 차를 몰고 출퇴근하는 모습을 보면서 괜히 겉멋이 드는 것이 아닐까 걱정스럽기도 하거니와, 빌빌 놀고 있는 것이 보기가 민망스러워 비행기표를 사서 서울로 돌려보냈소이다. 그런데 내가 걱정했던 바로 그대로, 아우는 그때 든 겉멋이 죽는 날까지 빠지지 않아 돈이라면 무슨 돈이나 잡히는 대로 쓰면서 자기 손으로 벌 생각은 없이, 그러니까 자기가 타고난 명민한 재주는 한번도 펴보지도 못한 채, 허무하게 일생을 보내다가 지난해 내 앞서 세상을 떴소이다. 그래서 이왕 떠난 아우에게 너무 가혹한 말을 하는 것 같아 주저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아무튼 ‘서울 정착금’이 자취도 없이 사라진 것이외다. 비극의 시작이었소이다. 내가 돌아왔을 때 어머님과 아우는 6·25 직전 선친께서 별세하신 뒤 앞서도 말한 원서동 이층집은 처분하고 경기중학교가 있던 화동의 초라한 집으로 옮겨 살고 있습디다. 잠시 그 집에서 기거하던 나는 아우가 결혼하게 되자 이웃집 이층의 방 한 칸을 빌려 홀아비 생활을 시작하게 됐소이다. 그러던 어느날 어머님께서 집문서를 내게 내미시면서 도장을 치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도장을 안 치면 아우가 큰일 난다고 하시면서요. 아니 그나마 그 집이 날아가면 어머님은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물어도 어머님은 막무가내셨어요. 내 걱정은 말라고 말이외다. 그래서 말씀대로 도장을 쳤소이다. 며칠 지나 아우 내외는 어디론지 자취를 감추고 그 집은 남의 손으로 넘어가, 의지할 데가 나밖에 없는 늙은 어머님이 길바닥으로 내몰리게 된 것이니, 남의 집 셋방 구석에서 노모를 모시고 사는 꼴이 얼마나 처량했겠소이까. 선친께서는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200채나 되는 영단주택을 건설했는데 아들인 내가 무주택 저소득층으로 굴러떨어진 것이니 나 자신의 고통도 고통이려니와 늙으신 어머님의 마음은 어떠셨겠소이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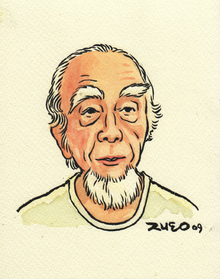 |
|
정경모 재일 통일운동가
|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