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해교도소의 독방에 갇혀 있던 1977년 가을께 면회를 온 김수환 추기경은 ‘전향서를 쓰고 풀려나라’고 권했지만 필자는 거부했다. 사진은 73년 12월 수원 명상의집에서 열린 그리스도공동체 묵상회 때의 모습으로, 앞줄 맨 가운데가 김 추기경, 오른쪽 줄 가운데가 필자다.
|
문정현-길 위의 신부 18
1976년 12월29일 2심 재판이 끝난 뒤 우리는 모두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었다. 구속된 11명을 모두 태운 버스는 뒤편에 변기통까지 싣고 달렸다. 대전교도소에서부터 차례로 사람들이 내렸다. 전주교도소에 문익환 목사, 목포에는 이문영 교수, 진주에 김대중 전 대통령, 서남동 목사는 마산, 나는 김해교도소로 갔다. 혼자 뚝 떨어져 있으니 외롭고 긴장이 되었다. 내 방은 0.75평이었다. 너비는 팔을 반 정도만 펼 수 있을 만큼 좁았다. 길이는 누우면 다리 밑에 약간 여유가 있어 식기를 놓을 수 있는 정도였다. 앉아서 손을 뻗으면 바로 변기가 잡혔다. 마치 관 속에 들어간 느낌이었다. 화장실 쪽 창문도 합판으로 막아서 공기만 빠질 수 있게 해놓아 밖은 볼 수 없고, 교도관이 감시할 수 있는 구멍만 있었다. 또 30와트짜리 전구가 24시간 켜져 있었다. 이른바 징벌방이었다. 방에는 이부자리를 항상 펴놓았는데 요 밑에 손을 넣어보면 물이 흥건했다. 방이 좁아 운동을 제대로 못하는데다 습기까지 심하다 보니 인혁당 사형집행 날 다쳤던 다리의 통증이 점점 심해졌다. 특히 겨울에 실내기온이 영하까지 내려가면 다리에 마비가 왔다. 통증을 호소하면 의무실에서 약을 주긴 했는데, 믿을 수 없어 먹지는 않았다. 다행히 사람들이 면회를 올 때 넣어준 밍크담요가 5장 정도 있어 극심한 추위는 피할 수 있었다. 다리가 아플 때면 양동이를 뒤집어 놓고 그 위에 담요를 쌓아 만든 의자에 앉아 책을 보았다. 추울 때만 고통스러웠던 것은 아니다. 날이 따뜻해지면 변기통에서 구더기가 기어나와 담요며 책이며 식기 위까지 올라왔다. 영화 <빠삐용>의 그 요새감옥과 다를 바 없었다. 그 골방에서 6개월을 지냈다. 날마다 운동시간인 15분에서 30분 정도 골방 밖으로 나올 수 있었지만 다리가 워낙 아파서 운동은 할 수조차 없었다. 운동을 하는 동안에도 교도관은 나와 다른 재소자들의 접촉을 막고 감시했다. 워낙 직계가족에게만 면회가 허용됐는데 하루는 신학교 동기인 리수현 신부가 면회를 왔다. 군종신부로 있다가 제대를 한 그가 동생 문규현 신부 이름으로 면회 신청을 하고 들어온 것이었다. 그런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군대가 좋냐? 여기가 더 좋냐?” 농담을 하며 “친구를 만나서 좋다”고 말했다. 리 신부는 쩔쩔매며 내 동생 흉내를 내느라 나에게 ‘형님’이라고 불렀다. 뭔가 이상하긴 해도 기분 좋게 방으로 돌아왔는데 보안과장이 찾아와 물었다. “방금 면회한 신부가 누굽니까? 문규현 신부 이름을 대고 면회한 사람 이름이나 좀 압시다.”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됐지만 나는 당당하게 “내 가장 친한 친구 리수현 신부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신부님은 100만달러짜리 면회를 한 겁니다” 하고는 돌아갔다. 훗날 리 신부가 동생 대신 면회를 한 이 사건 때문에 교도소장이 중앙정보부에 경위서를 쓰고 난리가 났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77년 여름, 지학순 주교가 면회를 왔다. 주교님은 감옥생활에 대해 이것저것 묻고 강복을 해주셨다. 무엇보다 아픈 다리 걱정을 많이 해주었다. 그런데 다음날 교도소에서 방을 옮겨주었다. 그 비좁은 방에서 4평짜리 넓은 방으로 옮기니 마치 호텔에 들어온 것 같았다. 얼마나 좋았던지 바닥을 막 뒹굴었다. 방이 넓어져도 감옥은 감옥이었다. 얼마나 덥던지 더위를 먹어 여름 내내 고생했다. 체력이 너무 떨어지고 심리적으로 지친 까닭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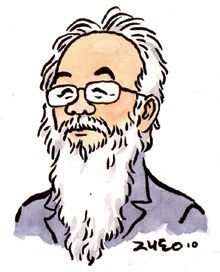 |
|
문정현 신부
|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