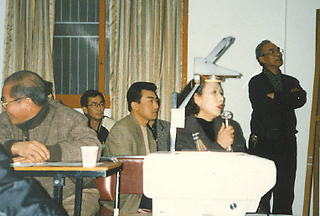 |
|
1995년 9월 미국 유학을 끝내고 전북 군산의 오룡동성당에 부임한 필자는 신자들 중심의 성당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민중 속으로 파고드는 교회 사목활동을 시도했다. 98년 1월 발전위원회 위원들이 분과별 토론을 통해 나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문정현-길 위의 신부 54
선교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통문화를 파괴하고 원주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다. 선교는 복음과 원주민들의 문화를 결합해 민중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1995년 메리놀 신학교 졸업 직전 중남미를 여행하면서 선교의 참 의미를 더 깊이 느꼈다. 중남미 곳곳에서 복음을 따라 살던 이들이 사살된 성지와 그들의 묘지를 볼 수 있었다. 민중들을 탄압했던 독재정권은 권좌에서 물러나서도 돈을 싸들고 미국으로 망명해서 여전히 조국의 정치를 조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독재가 끝났음에도 인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민중들의 삶은 여전히 어려웠다. 예수님을 좇는 길은 바로 그 민중과 함께하는 것이었다. 그때 중남미 여행이 그저 관광이 아니라 또다른 공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메리놀에서 공부하며 남미 민중과 함께한 이들을 많이 알게 된 덕분이었다. 그 인연으로 70, 80년대 남미 민중들의 투쟁 현장을 직접 보고 인터뷰도 할 수 있었다. 아주 좋은 경험이었다. 95년 여름 메리놀에서 신학석사(MTH) 학위를 받은 뒤에도 아르헨티나·칠레·페루를 돌아보았지만 관광지 위주로 안내를 해준 바람에 뜻깊은 여행은 되지 못했다. 페루에 머무르고 있던 그해 8월 말 전북 군산의 오룡동성당으로 발령이 났다고 연락이 와서 서둘러 뉴욕으로 와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 오룡동성당은 월명동성당에서 갈라져 나온 곳이었다. 95년 당시에는 외곽지역이었다. 앞서 주임을 맡았던 박창신 신부가 노동자의 집을 열어 놓았고 6·10항쟁 때는 지역의 근거지였다. 그래서 내가 부임해보니, 노동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공안탄압을 경험했던 신자들이 많았다. 나는 박 신부가 일궈놓은 노동자의 집을 더 활성화시키고 싶었다. 창인동성당 때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더 애착이 갔다. 그래서 노동자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배려하고, 노동자를 위한 일을 많이 하고 싶었다. 그러나 성당 주임신부로서 성당 사목을 돌보는 일도 소홀히 할 수는 없었다. 가정 방문을 부지런히 하고 병자 위문도 빼놓지 않았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찾아가 상태·요구·불편 따위의 기록을 꼼꼼히 해 ‘병자방문일지’를 만들었다. 다음에 방문을 할 때 환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였다. 예를 들면 딸이 사다 준 전기면도기가 고장이 나서 안타까워하는 노인을 보면 다음 방문 때 새 면도기를 사다 주는 식이었다. 그렇게 환자와 가까워지면 그 보호자들과도 가까워지고 믿음이 쌓였다. 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배려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주변까지 번져서 기쁨과 희망이 된다. 오룡동성당에서 의욕적으로 시도한 일은 성당발전위원회를 만든 것이다. 원래 주임신부 중심으로 성당을 끌고 가다 보면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해도 신부가 떠나면 중단되고 마는 폐단이 있었다. 그래서 교우들 스스로 성당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성당의 장·중·단기 계획을 세우고 구역별로, 신심단체별로 토론을 해서 본당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찾아내고자 했다. 성당발전위원회는 2년에 걸쳐서 실행 계획안을 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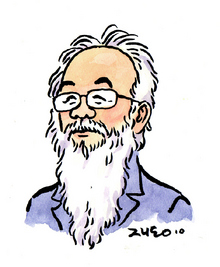 |
|
문정현 신부
|
구술정리/김중미 작가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