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989년 초겨울 서울 필동에 장만한 역사문제연구소의 사옥 정원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왼쪽 셋째부터 박원순 변호사, 필자, 김영태씨, 그 뒤 왼쪽부터 장두환 사장, 정재정 교수, 어윤경 이사장, 서중석 교수, 신주백 연구원, 이종걸 감사(현 국회의원) 등이다. 앞줄 맨 오른쪽이 필자의 부인 김영희씨.
|
이이화-민중사 헤쳐온 야인 52
1988년 6월 학술단체협의회의 첫 연합 심포지엄을 둘러싼 진짜 소동은 언론에서 터졌다. 그때 심포지엄을 여러 언론매체에서 주요 기사로 다루었는데 <조선일보>(6월6일치)에 실린 김동길 교수의 글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김 교수는 칼럼에서, 서관모 교수의 주제발표를 두고 대체로 ‘북한 당국의 혁명노선을 내세우는 주제를 공공연하게 발표했다. 이런 노선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라는 주장을 폈다. 아니나 다를까, 검찰에서는 서 교수를 여러날 소환해 심문을 벌였다. 그러자 전국교수협의회 등에서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10여개 단체에서 규탄성명을 냈으며 학생단체들도 성명서를 내면서 ‘김동길 규탄’에 나섰다. 이렇게 와글거리자 검찰에서는 소환조사만으로 일단 마무리를 지었다. 그때 나는 서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격려를 하는 것으로 마음을 달랬다. 내 상식과 김동길의 상식이 얼마나 다른지를 확인한 사건이었다. 그 뒤부터는 괜히 ‘보타이’까지 싫어질 정도였다. 아무튼 학술단체협의회는 그 뒤에도 대표를 교체하면서 해마다 종합발표회를 가졌으며 사무실은 역사문제연구소에 두고 있었다. 이쯤에서 말을 돌려보자. 나는 역문연 활동에 참여하면서 외부의 활동에도 바쁜 나날을 보냈다. 신문·방송 등에도 자주 오르내렸다. 하지만 티브이 출연만은 될수록 피했다. 이른바 ‘땡전 뉴스’를 거부하는 정서가 깔려 있었다. 그나마 한국방송(케이비에스)의 젊은 피디들은 불만 속에 이런 분위기를 바꾸려 애썼다. 전두환 정권에서 노태우 정권으로 넘어간 1988년, 한국방송 2티브이에서는 ‘11시에 만납시다’라는 프로를 신설해 중견이나 원로들을 불러내 대담을 하게 했다. 이 프로에는 다양한 인사들이 등장했는데 특별히 정치적 색깔을 띠지는 않았다. 어느날 나에게 출연해 달라는 요청이 왔다. 처음 거절하는 나를 광화문으로 불러낸 담당 피디는 “선생의 말을 최대한 존중할 테니 출연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그래서 7월12일치 방송에 출연해 나 나름의 소신을 폈으나 말을 조심하느라 온건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담당 아나운서인 김동건은 능숙하게 대화를 이끌었다. 이 프로에 신경림 시인(7월6일)이나 조정래 소설가(7월13일) 등이 출연했는데 이런 인사를 불러냈다고 담당 피디가 문책을 당했다는 소문도 들렸다. 조동걸 교수(국민대)는 어느 술자리에서 “‘11시에서 만납시다’에 출연해야 명사의 반열에 올라!” 하고 나를 놀린 적도 있었다. 89년 초겨울에는 ‘역문연’의 건물이 마련되었다. 서울 중구 필동2가, 남산 밑에 있는 개인 저택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그 무렵 사설 연구소, 특히 민주운동 관련 단체는 그야말로 동가숙서가식하면서 셋방살이를 하고 있을 때였으니 자체 건물을 마련한 것만으로 화제가 될 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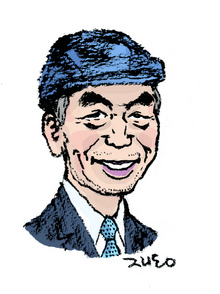 |
|
이이화 역사학자
|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