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필자는 ‘동학 100돌’을 5년 앞둔 1989년 역사문제연구소에서 발족시킨 동학농민전쟁백주년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백추위)의 위원장을 맡아 다양한 행사를 주관했다. 94년 10월 공주 우금치에서 열린 합동위령제에서 대표로 잔을 올리고 있는 필자. 역사문제연구소 제공
|
이이화 - 민중사 헤쳐온 야인 71
1994년은 동학농민전쟁(또는 혁명)이 전개된 지 100돌이 되는 해였다. 역사문제연구소에서는 5년 전인 89년 여러 기념사업을 벌이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두기로 결정했고 동학농민전쟁백주년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백추위)를 발족시켰다. 그 목적은 “동학농민전쟁의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농민전쟁의 역사적 성격을 밝히고 이에 기초해 역사인식의 대중화와 농민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실천하기 위해서”라고 내걸었고, 구체적 사업계획으로는 연구발표회, 연구 자료집과 사료집 발간 등 학술 출판사업과 대중강좌, 역사기행,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 등을 설정했다. 이 기구를 발족시키면서 추진위원장에는 이이화, 연구위원 겸 담당 간사로는 신영우(충북대)·우윤·배항섭·김양식·박준성·왕현종·이승용 등을 두었고 사무간사는 장영희가 맡았다. 교수 또는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소장 전공자들인 이들 연구위원들이 일을 추진하는 핵심 구성원으로 학술과 기행과 강의 등을 분담해서 진행시켰다. 또 후원회에는 회장 한승헌 변호사와 회원 50여명이 참여해 후원금을 내기로 약속했다. 인병선(짚풀박물관장)·장두석(민족의학자)·황승우(교육자) 등은 일시불로 백만원 단위의 후원금을 내기도 했고 92년 7월부터 94년 12월까지 고순정(화가)·이광연(교사)·선왕주(의사)·정용식(변호사)·박석무(국회의원)·홍기훈(˝) 등은 한 달도 빼먹지 않고 꼬박 10만원씩 후원해 주었다. 한 회장은 전주지역 기념사업회 이사장도 맡고 있어서 후원금 대신 실제로 도움을 주는 일을 주선해 주기로 약속했다. 액수가 많고 적고를 가릴 것 없이 고마운 분들이었다. 백추위에서 단계적으로 벌인 실적과 행사를 말하기에 앞서, 그 전사(前史)를 조금 늘어놓기로 한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1876년 강제로 조선을 개항시킨 이래 경제침탈을 일삼았고 이어 대륙 진출을 꾀하면서 우리나라 주권을 유린했다. 또 서구 열강들도 너도나도 불평등한 통상조약을 맺어 이권을 앗아갔다. 더욱이 고종과 민비는 민씨 세도에 휘둘려 그들이 저지르는 부정과 비리를 외면한 채 간교한 꾀와 정쟁으로 나라를 경영하고 있었다. 마침 동학이 발생해 양반과 상놈을 가리지 않고 인간 평등을 외치며 외국 세력에 대한 저항감을 드러내면서 새로운 세상 곧 개벽을 내걸었다. 이에 소외받던 계층은 물론 쫓겨난 벼슬아치와 몰락한 양반과 수탈에 시달리고 있는 부자들도 동학 조직에 뛰어들었다. 그리하여 동학 조직은 전국으로 뻗어나갔다. 그래서 당대 가장 큰 조직으로 성장한 것이다. 1890년대에 들어 동학 조직은 충청도의 해안지역과 호남지역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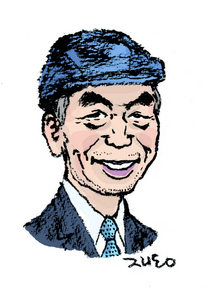 |
|
이이화 역사학자
|
그러니 동학 농민군들은 처음에는 반봉건, 뒤에는 반침략에 나선 것이다. 농민군들이 대포와 기관총 앞에서 죽어 넘어질 때 기득권을 누리던 유림과 양반세력은 숨어서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이때 죽은 농민군의 수를 두고 30만명이라고도 하고 5만여명이라고도 한다. 그 뒤 일제의 탄압으로 농민군들은 숨어 살아야 했고 ‘동학’이라는 대규모 민중봉기가 전국에 걸쳐 일어났었다는 사실조차도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었다. 이이화 역사학자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