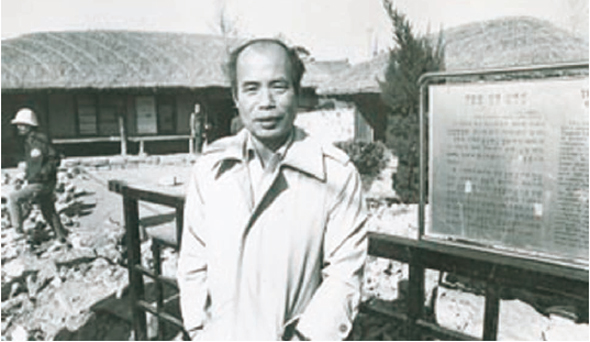 |
|
정봉준
|
이이화-민중사 헤쳐온 야인 76
1990년 초부터 94년에 걸쳐 진행한 동학농민전쟁 백주년기념사업 추진위원회(백추위)의 현장답사를 통해 우리는 농민군의 형상이 투영된 여러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후대 민중의 의식도 읽어낼 수 있었다. 공주 우금치에 세워진 동학혁명군 위령탑에는 박정희의 글씨와 이선근의 글이 새겨져 있었는데, 훗날 누군가 ‘박정희 대통령의 뜻으로 세웠다’는 글씨를 돌로 찍어내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또 정읍 황토현전적지의 건립 과정을 설명하는 글에 ‘전두환 대통령의 뜻에 따라 건립했다’는 박영석 국사편찬위원장의 설명문에서 ‘전두환’ 글자를 돌로 찍어내 놓았다. 이런 모습은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민주·민중의식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생각했다. 또 장흥에서는 100돌을 앞두고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탑을 세우고 비문은 고은 시인이 지었는데 반농민군 세력 후손들의 반발과 방해로 제막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장성 신호리의 황룡강 언저리에는 1984년 5월 농민군이 관군을 크게 무찌르고 전주로 진격하는 계기가 된 황룡전투 때 관군 대장으로 전사한 ‘이학승 순의비’(1897년)가 세워져 있었다. 이후 100돌을 맞아 1994년 12월 이상식 교수(전남대)의 주도로 광주전남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이곳에 동학농민군 승전 기념탑을 세웠다. 이어 97년에는 동학혁명 승전기념공원으로 조성됐고 ‘황룡 전적비’는 국가사적지 제406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곽재구의 시 ‘조선의 눈동자’가 새겨진 화살 모양의 웅장한 기념탑과 달리, ‘의병대장’ 면암 최익현 선생이 비문을 썼다는 순의비는 들판 언덕 아래 수풀 속에 초라하게 서 있었다. 정읍 조소리에 복원한 전봉준 고택을 찾아갔을 때는 길목에서부터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도로 안내판에 ‘생가길’이라고만 쓰여 있더니, 고택 안내판에는 ‘봉준은 양반으로…’ 따위의 구절들이 보였다. 더군다나 초가삼간이어야 할 고택은 옆집 한 채까지 헐어 널찍하게 정원처럼 꾸며두었고, 담은 흔히 가난한 농가에서 보이는 싸리울타리가 아니라 지주·부자들의 집에서 만들었던 두꺼운 흙담으로 둘러놓았다. 또 하학리 황토현 전적지 전시관에 갔을 적에는 전봉준 동상에 ‘전봉준 선생상’이라 쓰여 있었다. 우리는 ‘장군’이 아니라 ‘선생’이란 표현에 고개를 흔들었다. 민중은 그를 장군이라 불렀는데 굳이 선생이라고 고쳐야 하는가? 전봉준의 강렬한 ‘이미지’를 묽게 흐리려는 호칭일 것이다. 전시실 안의 전시물들은 한층 가관이었다. 교수형을 당한 전봉준을 두고 칼로 머리를 잘라 막대기에 달아 조리를 돌린 사진을 걸어두고 있었다. 또 제민당이란 간판을 단 곳에는 유명 화가에게 사례를 듬뿍 하고 그렸다는 전봉준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거기에 전봉준이 정자관을 쓰고 도포에 술을 길게 늘어뜨린 선비의 차림을 하고 있었다. 시대상에 맞지 않는 농기구들도 벌여놓고 있었다.
 |
|
역사학자 이이화
|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