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995년 여름부터 한국통사 전 24권의 집필에 들어간 필자가 2년 남짓 칩거하며 원고를 썼던 전북 장수군 천천면 연평리 폐교된 연화분교의 현재 전경. 왼쪽 작은 건물이 필자가 묵었던 사택으로 지금은 개인 소유의 창고 등으로 쓰이고 있다. 사진 장수군청 제공
|
이이화-민중사 헤쳐온 야인 85
1995년 초여름 백령도 백사장에서 나는 <역사비평> 대표인 김백일,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인 윤해동·한상구 세 후배에게 ‘한국 통사’ 집필 계획을 털어놓고 의견들을 들어봤다. 그러자 10년씩이나 버텨낼 수 있겠느냐, 술도 좋아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즐기는 내 기질로 보아 중도에 그만둘 것이란 말들도 했다. 반농담으로 한 말이었지만 어느 정도 틀린 말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두고 봐라, 내가 어릴 적부터 견뎌내는 데는 이골이 났으니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내심 각오를 다졌다. 그길로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아내의 동의를 받아냈다. 또 아들(응일)에게 컴퓨터 워드를 활용해 글 쓰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물론 워드만 겨우 배우기도 힘들었다. 하지만 원고를 써보았더니 비록 ‘독수리타법’이나마 아주 능률이 올랐다. 이만하면 해볼 만하다는 자신이 붙었다. 그런데 막상 일을 시작하려니 장애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무엇보다 글을 쓸 장소를 찾아야 했다. 집에서는 사실상 글을 차분히 쓸 수가 없었다. 하루종일 집에서 지켜보니, 아내는 아이들과 부대끼느라 어쩔 수 없었겠지만, 잔소리를 끊임없이 했고, 내 일상에도 이런저런 간섭이 많았다. 또 방송사나 신문사의 연락도 많았고 강연·주례·행사 등에 나와 달라는 부탁도 많았다. 애초 서울을 떠나 구리에서도 시골구석 아치울에 자리를 잡은 동기도 이런 번다한 일을 줄이려는 의도였는데, 어느새 별 방어막이 못 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집을 떠나야 일이 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마침 한길사에서는 전북 장수군 천천면 연평리 연화마을의 폐교된 초등학교인 연화분교를 인수해 연수원처럼 이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나 역시 한길역사기행 때 여러번 그곳에서 강의를 하면서 교사들의 사택에 묵은 적이 있다. 60년대 시멘트로 지은 작은 집이었지만 나는 지낼 만하다고 여겼다. 한여름인 7월15일 아내가 필요한 책과 함께 데려다 주었다. 한쪽 방에 고대사 관련 책을 늘어놓고 컴퓨터를 올려놓는 앉은책상과 텔레비전을 들여놓고 보니, 나 혼자 누울 공간은 그럭저럭 넉넉한 편이었다. 밥은 건물을 관리하는 마을의 우기언 이장 댁에서 작은 식비를 내고 부쳐 먹었다. 마루에는 가스레인지 하나를 준비해 두었다. 아내에게 선풍기와 냉장고는 두지 말라고 일렀다. 이곳의 좋은 점부터 얘기해보자. 연화마을은 열두어 집이 사는 작은 산골동네였다. 해발 500미터가 넘어서 남쪽에서 가장 추운 곳이기도 하고 눈이 많이 오기로도 유명했다. 그 덕에 세파에 시달리지 않아 공기가 맑고 냇물도 깨끗했으며 인심도 훈훈했다. 나는 먼저 마을사람들을 초대해서 마을회관에서 한턱을 내고 인사를 드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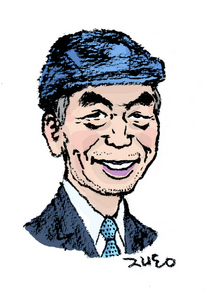 |
|
이이화 역사학자
|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