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오재식은 1973년 5월 도쿄의 아시아행동자료센터(DAGA) 이름으로 지명관·김용복 교수와 함께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우려를 밝힌 ‘한국 기독자 선언문’을 작성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 전달했다. 사진은 70~80년대 국외 한국 민주화운동의 한 기지였던 ‘동경그룹’ 회원들로, 왼쪽부터 이인하·박형규 목사, 지 교수, 패리스 하비·최경식 목사 등이다.
|
오재식-현장을 사랑한 조직가 56
1973년 1월초 도쿄 중심가 시부야에 있는 오재식의 집에서 지명관·김용복 교수가 모였다. 재식이 아시아교회협의회 도시농촌선교회(CCA-URM) 간사를 맡으며 구한 그 집은 원래 일본에 온 서양 선교사들이 살던 곳이었다. 지 교수는 먼저 김 교수에게 한국의 정치상황에 대한 선언서 초안을 영어로 작성하라고 했다. 그 초안을 서로 돌려보며 수정을 한 뒤, 지 교수가 최종 문장 교정을 했다. 몇차례의 모임을 통해 문안을 다듬은 끝에 드디어 선언문이 완성됐다. 이를 다시 지 교수가 한국어와 일본어로 번역했다. 선언문 배포와 후원 등 나머지 작업은 재식이 전적으로 책임을 맡았다. 재식은 선언문을 기획할 때부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의 기본 방침을 지지하는 수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었다. 그 무렵 국외에 있는 한국인 교회나 진보성향의 동포단체에서는 박정희 정권의 독재에 맞서 강력하게 대응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으론 ‘5·16’과 반공 정책을 지지하는 보수성향의 동포단체들에 반발하는 세력도 많았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자유주의 분위기가 훨씬 강해서 한국 정부나 교회의 독특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그럴수록 재식은 한국교회협의회와 호흡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념적·신학적·신앙적 원칙에 비춰 한국 교회의 대응이 미흡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더라도, 국내에서 어렵게 투쟁하는 사람들의 상황과 괴로움을 공유하며 연대하고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 직접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도움을 줘야 한다는 원칙에 세 사람 모두 동의했다. 그래서 선언문 작성에 앞서 재식은 총무인 김관석 목사와 긴밀하게 협의했다. “한국에서 먼저 정치상황에 대한 개신교계의 견해를 정리하고 발표해야 됩니다. 바쁘고, 힘드시고, 불편하시면 우리가 초안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김 총무가 ‘그렇게 해달라’며 승인을 해줘 선언문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이었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 선언을 국내로 보냈더니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런 것을 내느냐’는 비판의 소리들이 들려왔다. 위험부담도 많을뿐더러, 정권의 눈을 피해 인쇄해서 돌리려면 자금도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재식은 1000달러와 함께 선언문의 원본을 다시 보냈다. 결국 한국교회협의회에서는 그해 5월20일 서명 명단이 들어가면 위험하다는 판단 아래 선언문만 발표했다. 바로 ‘73 한국기독자선언’이다. 재식은 그해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협의회 총회 때 한국 대표로 참가한 조승혁 목사가 가져온 선언문을 받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주보 형태의 작은 문서로 인쇄된 이 선언문의 발표 사실은 당시 극심한 국내 언론 통제로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재식과 지 교수는 선언문을 미국의 권위있는 종교전문지인 <기독교와 위기>(크리스치애니티 앤 크라이시스)에 공개하기로 했다. 영어본 선언문은 김용복 교수의 부인인 메리언이 다듬어준 덕분에 한층 훌륭해진 선언문을 들고 두 사람은 직접 미국으로 건너가 평소 알고 지내던 편집장 코언을 만났다. 그런데 그는 선언문을 잡지에 소개하려면 ‘정통성’(신뢰성)이 있어야 하는데, 선언자 명단이나 기관이 명시되지 않은 익명의 잡문서로는 실을 수 없다고 했다. 그렇다고 포기할 두 사람이 아니었다. 서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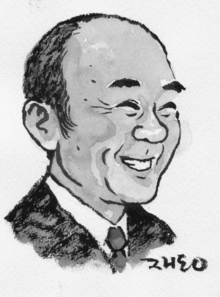 |
|
고 오재식 선생
|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