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10.15 19:38
수정 : 2008.10.15 19: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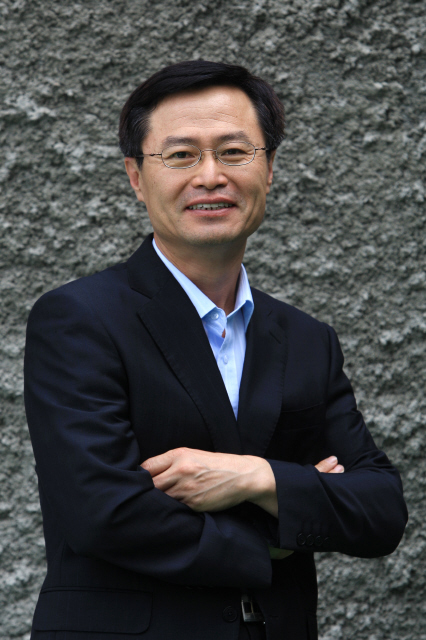 |
|
정영무 논설위원
|
유레카
대공황 이듬해인 1930년 봄, 폭락했던 주식시장이 조금 살아났다. 허버트 후버 대통령은 백악관을 방문한 종교단체 대표들이 공공투자를 늘려 달라고 요청하자 “두 달 전이라면 그런 얘기가 통했을 테지만 지금은 아니다. 불황이 이제 끝났기 때문”이라고 할 만큼 여유를 되찾았다.
그런데 경기가 회복이냐 후퇴냐 갈림길에 서 있던 그해 후버와 공화당은 악수를 두고 말았다. 경제학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수입 관세를 크게 올린 것이다. 정부는 미국의 국민총생산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4.2%에 불과해 부작용이 미미할 것으로 봤다. 경제학자들은 관세를 올려봐야 실익이 없고 보복 관세를 불러 수출만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불행히도 우려가 맞아떨어져 관세를 올린 뒤 2년 동안 20여 개국이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의 수출은 뚝 떨어지고 세계 무역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풍토 속에서 각국은 제 살길을 찾아 나섰다. 그 첫 번째 주자는 영국으로 8개의 영연방 국가들을 모아 파운드 블록을 형성했으며, 프랑스 독일 일본이 뒤따랐다. 그러나 블록경제권으로 세계적 위기를 벗어날 순 없었다. 세계경제는 가라앉고 급기야 블록 간에 군비경쟁으로 이어졌다.
대공황에 버금가는 금융위기를 맞아 보호주의에 앞장섰던 미국과 영국이 국제 공조에 발벗고 나섰다. 금융업의 이해가 걸린 탓이지만 대공황 당시 생존게임의 폐해를 경험한 학습 효과가 한몫한 듯하다. 그렇게 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고비가 겹겹이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 교수는 신자유주의의 고삐를 죄고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로 인한 세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기를 경고한 ‘족집게 예언가’의 진단을 귀담아듣는 게 효과적인 선행 학습이 될 법하다.
정영무 논설위원
young@hani.co.kr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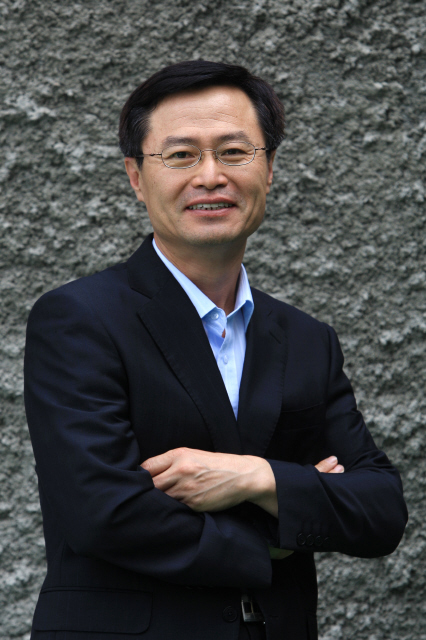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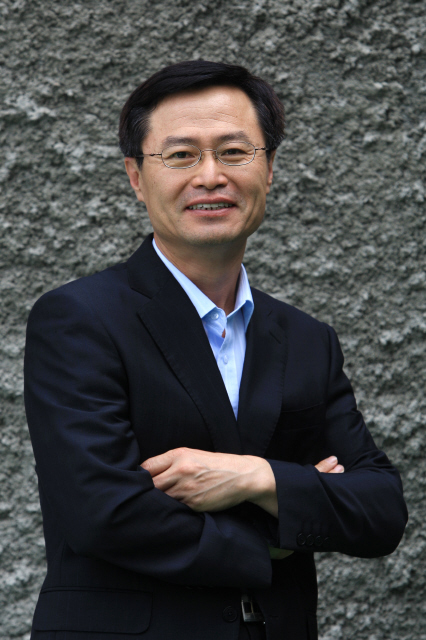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