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9.07.10 20:24
수정 : 2009.09.16 1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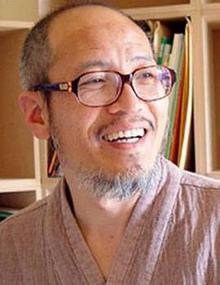 |
|
황대권 <야생초 편지> 저자, 생태운동가
|
해가 이미 중천에 떠올라 아침이슬이 다 말라버렸을 즈음에 우거진 녹음 사이를 헤치고 들어가 풀숲 가운데 앉아 있으면 마치 이스트균이 발효하듯 수목이 자라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는 듯하다. 아니 가만히 귀 기울여 보면 실제로 그 소리가 들린다. 수북수북, 스멀스멀, 웅웅 …. 나더러 이 광경을 그림으로 그리라면 화폭 가득 온천탕 표시를 무수히 찍어 놓고 싶다. 옛사람들이 자연의 변화무쌍한 모습과 그 속에 뛰어노는 생명들을 기(氣)의 이합집산으로 이해한 것은 정말 탁월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잠시 무아경에 빠져 자연이 연주하는 교향악을 감상하다가 자신이 일기(一氣)의 에너지체가 되어 수목과 야생화 사이를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상상을 해본다. 어떤 놈은 하품을 하듯 에너지를 폭폭 쌓아두는가 하면 어떤 놈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 난 열차처럼 엄청난 속력으로 달려든다. 어떤 놈은 끈덕지게 다른 에너지체에 들러붙어 같이 놀자 하고 어떤 놈은 한사코 몸을 피해 구석으로만 도망간다. 아마도 장자란 분이 ‘소요유’(逍遙遊)라는 글을 쓸 적에 나와 같은 상상을 하지 않았을까. 살아 있다는 것은 관념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놀아’ 보면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켜니 뉴스난에 죽이기 살리기 논쟁이 치열하다. 한쪽에서는 멀쩡히 살아 있는 것에 함부로 손을 대면 죽는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냥 내버려두면 죽어버리니 지금 바로 손을 대어 살려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논쟁은 우리의 자연이 죽어 가느냐 아니면 살아 있느냐 하는 점에서 크게 엇나가기 시작한 것 같다. 둘 다 옳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사실 우리의 자연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초고속 산업화를 감내하느라 반쯤은 빈사 상태에 빠져 있다. 그런 점에서 개발론자의 주장은 일견 옳다. 그러나 자신들이 개발한답시고 죽여 놓고는, 이제 다시 개발을 통해 살려내겠다고 말하는 저들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는다. 그런 주장을 하려거든 그동안 저지른 무자비한 개발행위에 대한 참회가 먼저 이루어지고 다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고 겸허하게 자연에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그러나 참회는커녕 지난 시절의 산업화를 자화자찬하면서 산업화를 이루어낸 그 힘으로 자연도 살려내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 정말로 그런 ‘무데뽀’ 정신으로 자연을 살릴 수 있을까? 아니 정신은 그렇다 치고 저들이 자랑하는 산업화 시대의 눈부신 기술로 자연을 살릴 수 있을까? 단언컨대 아무리 천하에 없는 친환경 기술을 사용하여 그럴듯하게 살려낸다 한들 자연을 대하는 저들의 태도에 변화가 없는 한 자연은 인간의 애완물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속내를 알고 있는 환경주의자들은 자연이 반쯤은 죽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차라리 손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소요유를 즐긴 장자는 ‘혼돈’(混沌)이라는 글에서 스스로 돌아가는 자연에 억지로 구멍 일곱개를 뚫었더니 그만 자연이 죽어버렸다는 섬뜩한 얘기를 전한다. 조작은 인간의 본능 가운데 하나이지만 놀이는 그보다 더 오래된 본능이다. 도무지 놀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 천지 사방에 구멍을 뚫고 앉았으니 우리도 어서 보따리를 싸야 하지 않을까.
황대권 <야생초 편지> 저자, 생태운동가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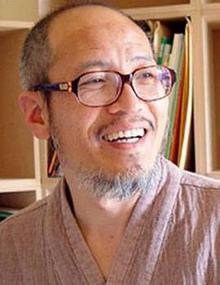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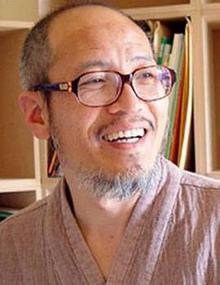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