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9.09.18 21:45
수정 : 2009.09.18 2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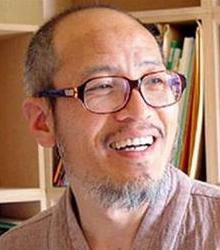 |
|
황대권 <야생초 편지> 저자 생태운동가
|
산속이라 아직 여름의 온기가 남아 있는데도 밤이 되면 으슬으슬 춥다. 이즈음부터 본격적으로 추워지는 11월까지가 모닥불을 피우기 가장 좋은 계절이다. 저녁을 먹고 마당 청소도 할 겸 널브러진 나뭇조각들을 긁어모아 모닥불을 지핀다. 조금이라도 재활용의 가능성이 보이는 나무는 헛간 안쪽에 모셔두고, 태울 수 있는 것은 다 불 속에 던진다. 언제 적부터 놓여 있는 건지 한쪽 벽 구석에 기대 있는 나무들이 눈에 들어온다. 비를 맞아 뒤틀어진 합성목이다. 그 옆엔 꽤 두꺼운 합판도 있다. 눈에 띈 김에 모두 불 속에 던져 넣는다. 한 놈은 불에 넣자마자 요란하게 타들어가는데 시커먼 연기를 엄청 내뿜는다. 지독한 유독가스다. 또 한 놈은 10분이 지나도록 탈 생각을 않는다.
모닥불을 지피며 어쩔 수 없이 지속불가능한 문명의 운명을 생각해 본다. 반세기 전까지만 해도 나무는 가장 많이 쓰이는 생활재료였다. 건축재료에서부터 가구와 소소한 생활용품까지 나무는 안 쓰이는 데가 없었다. 그러나 인구의 대부분이 도시에 몰려 살면서부터 쇠와 플라스틱, 시멘트 등이 그 자리를 채워 나갔다. 그밖에 나무가 쓰일 만한 곳은 원목 대신 합성목으로 대체되었다. 이제 원목이라 불리는 나무는 부유층의 고상한 취미를 충족시키는 대단히 희귀한 재료가 되고 말았다. 대도시의 아파트촌에 내다버린 가구들이 아무리 수북이 쌓여 있어도 실상 건질 만한 것은 별로 없다. 대부분이 합성목으로 만든 것이라서 원형 그대로 재사용하지 않는 한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농촌지역의 폐가에서는 의외로 건질 게 많다. 낡고 그을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물건들이 원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우리 집 뒷간의 출입문도 폐가에서 건져온 문짝을 다듬어 만든 것이다. 가난한 귀농자들에게 이리저리 약탈(?)당하고 남은 폐가는 그대로 스러져 흙으로 되돌아간다.
나무를 대신한 현대의 재료들은 모두 조작이 용이하고 대량생산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도시문명의 요구에 딱 들어맞는 선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들 재료는 재활용률이 극히 낮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사실 불에 타지도 않고 타더라도 엄청난 유독가스를 내뿜는 합성목은 나무가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분류해야 옳다. 겉모양만 나무지 성분의 대부분은 고분자 합성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원래 플라스틱류는 나무보다 내구성이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나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버려진다. 물건이 빨리 닳아서가 아니라 상품의 회전속도와 변덕스런 대중의 기호 때문이다. 재활용도 안 되고 타지도 않는 쓰레기가 저렇듯 대규모로 빨리 쌓여서는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 전지구적으로 보아도 이미 쓰레기 증가 속도가 경제성장률을 훨씬 앞지르고 있지만 경제성장을 그만두어야겠다고 결심하는 나라는 없다. 마치 총체적 파국을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열차에 타고 앉아 열심히 도시락을 까먹으며 희희낙락하고 있는 형국이다.
쓰고 있던 지겟작대기가 부러지면 남은 부분으로 장도리 손잡이를 만들어 쓰고 그것마저 부러지면 다시 남은 부분을 다듬어 실패나 기름병 뚜껑으로 재활용하던 그 옛날 농부들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 그밖의 다른 지혜는 모두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한다. 그래야 산다.
황대권 <야생초 편지> 저자 생태운동가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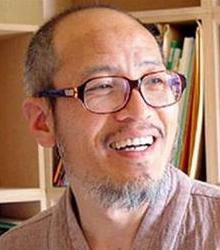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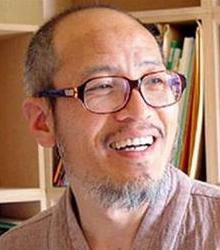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