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0.11.16 09:15
수정 : 2010.11.23 13:45
[ 동아시아 기업의 진화] 4부 한국 편-아시아를 딛고 세계로 1.포스코
중국 업체 견제에도 자동차 수입강판 점유율 1위
시장포화 임박…‘동남아 선점→세계 진출’ 큰그림
“우리는 포스코 글로벌 정책의 성공모델이자, 중국 진출의 베이스캠프다.”
지난달 중국에서 만난 김용민 장가항포항불수강(ZPSS) 유한공사 사장의 말에는 자신감이 흘러넘쳤다. 최대 철강 시장인 중국에서 세계 1위를 넘보는 스테인리스 생산업체로 자리매김한 데 따른 자부심이었다. 포스코가 87.5%의 지분을 보유한 이 회사는 상하이에서 150㎞ 떨어진 장자강(장가항)에 자리하고 있다. 지금 이곳에선 내년 봄 준공을 목표로 연산 23만t의 냉연공장 증설 공사가 한창이다. 길이 710m에 이르는 세계 최장 생산설비를 설치해, 고부가가치 제품 등 다양한 강종을 동시에 생산해내기 위해서다. 현재 이 회사가 만들어 중국 전역에서 주방용품, 자동차 머플러 등의 재료로 쓰이는 스테인리스 제품은 연 80만t 규모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연간 생산능력은 100만t으로 늘어난다.
전세계 스테인리스강의 3분의 1을 생산해내는 중국이라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 한국 업체가 성공을 거둔 셈이다. 직원 1800여명 가운데 포스코 파견직원은 33명뿐이다. 사실 포스코한테 중국은 경쟁자인 동시에 협력 파트너다. 한국 철강 부문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는 지난해 23.3%로 10년 전보다 5%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 중국 철강업체들의 견제도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포스코는 중국 자동차 수입강판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지난 7월 선양에 중국 내 16번째 철강 가공센터를 여는 등 비교적 선전하고 있다.
중국과의 협력은 철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내년엔 중국 네이멍구자치구에 포스코가 지분 60%를 갖고 있는 희토류 원료 가공공장이 완공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월엔 단일기업으로선 처음으로 지린성 정부와 항만건설, 첨단산업 등에서도 합작사업을 추진키로 협약을 맺었다.
포스코는 이런 성과를 낸 비결로 ‘신뢰’를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포스코차이나는 2008~2009년 연속 중국에서 ‘사회공헌 100대 기업’에 선정됐다. 장가항포항불수강을 비롯한 중국 현지법인에서 나무 심기나 재해복구활동 등에 적극 나서 탄탄한 믿음을 쌓아온 덕분이다. 2003년부터는 베이징대학교 등의 우수 학생 681명에게 장학금도 지급해왔다.
하지만 세계 철강 시장으로 눈을 돌리면 상황은 달라진다. 지금은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가 패권을 나눠 갖는 ‘삼국시대’이기 때문이다. 세계 10대 철강사 중 8개가 한·중·일 업체다. 동아시아 철강 소비량은 전세계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철강산업의 성장 속도는 전세계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빠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 위기에 빠진 유럽 업체들과 달리, 아시아권은 뛰어난 원가 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큰 타격을 입지 않았다. 세계 철강산업의 ‘메카’로 새삼 동아시아가 주목받는 이유다.
이 말은 곧 동아시아 철강시장에서의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2000년대 후반부터 한·중·일 국내 시장은 이미 공급 초과 상태에 이르렀다. 주요 철강회사들이 3000만~6000만t 설비 증설을 추진중이라, 이후 시장은 점점 더 좁아질 전망이다. 이를 두고 정준양 포스코 회장은 “세계 경제 중심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철강산업을 주도해왔던 한·중·일이 포화 상태인 국내 시장을 벗어나 동남아로 눈을 돌리는 단계”라고 말했다. 지난달 포스코가 첫 국외 일관제철소를 짓기 위해 첫삽을 뜬 인도네시아만 해도, 중국의 항저우강철과 우한(무한)강철 등이 제철소 건설을 위해 군침을 흘리고 있다. 포스코경영연구소는 최근 “중국이 동남아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고 있어 국내 철강산업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물론 포스코의 원대한 꿈은 동아시아에만 머물진 않는다. 정 회장은 “한국을 중심으로 했던 지역 플레이어에서 아시아권, 나아가 세계로 활동무대를 어디까지 확대해나갈 것인가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오는 2018년 반세기 역사를 맞아 ‘글로벌 포스코’로 거듭나려는 도전은 이미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세계 곳곳에서 시작됐다.
장자강(중국)/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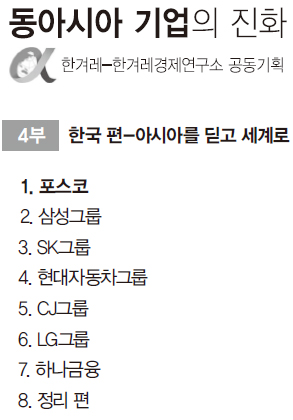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