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1.06.06 18:57
수정 : 2011.06.07 13: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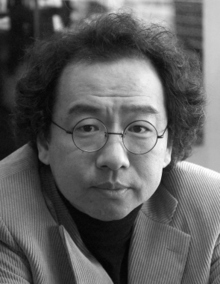 |
|
김정운 명지대 교수·여러가지문제연구소장
|
“울지마! 사내놈이 왜 울어!” 도대체 우는 것이
‘사내놈’과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
남편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는 여동생에게 던진 내 친구 태원의 ‘배째라’식 충고다. 남자는 잘 달래야 한다는 이야기다. 듣는 순간 ‘허걱’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여운이 남는다. 남자는 웬만해선 성숙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이야기다. 인정하기 싫지만 옳다.
클래식한 정신분석학자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그들에겐 오히려 여자가 더 성숙하기 어려운 존재다. 성숙의 척도가 되는 초자아, 즉 ‘슈퍼에고’(superego)를 내면화하는 정신분석학적 기제가 여자에겐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로 상징되는 슈퍼에고의 사회적 가치, 도덕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머니를 사이에 두고 아버지와 경쟁하게 되는 아들은 ‘거세불안’(castrating anxiety)이라는 근원적 공포에 시달린다. 아들은 아버지를 들이받든가, 아니면 착하게 아버지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성숙해간다. 여자아이들에게는 바로 이 성숙의 계기가 결핍되어 있다. 거세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영원히 성숙할 수 없는 여자에 관한 이런 식의 이론은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개념을 따라가자면 어쩔 수 없이 다다르는 황당한 결말이다. 프로이트가 살았던 19세기 말 시대정신의 한계다.
요즘은 반대다. 최근의 심리학 이론들을 적용해보면 남자들의 성숙이 훨씬 더 어렵다. 아이들이 발달과정에서 내면화하는 도덕적 규범들의 초기 형태는 ‘사회적 참조’(social referencing)라는 현상으로 설명된다. 낯선 상황, 혹은 낯선 대상에 대한 아이들의 규범적 판단은 어머니의 정서적 반응을 참조하여 결정된다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난생처음 흑인을 본 아이는 일단 어머니의 표정을 살핀다. 어머니가 당황해하거나 어색해하면 아이의 반응도 똑같아진다. 불안해하며 울거나 어머니에게 안긴다. 그러나 어머니가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면 아이의 반응도 지극히 편안해진다. 흑인에 대한 문화적 편견은 이렇게 주변인들의 정서적 반응을 참조하는 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과 같은 사회적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 또한 이런 식으로 세대를 건너며 전달된다. 물론 왜곡과 편견의 해소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사회적 참조’는 사회의 규범과 가치들을 매개하여 성숙을 가능케 하는 문화학습이다. 문제는 이 사회적 참조에 엄청난 남녀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여자아이들의 사회적 참조는 문화적으로 장려된다. 남자아이들에 비해 정서적 표현이 훨씬 자연스럽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반면 남자아이들의 정서적 표현은 문화적으로 억압된다. 남자아이들이 울면 부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다. “울지 마! 사내놈이 왜 울어!” 좋아서 막 날뛰면 또 그런다. “사내놈이 뭐 그렇게 가볍게 까불대니!” 도대체 우는 것과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이 ‘사내놈’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다. 남자들은 아예 법적으로(?) 못 울게 되어 있다. 고속도로 화장실에 가면 남자 소변기 위에 한결같이 이런 문구가 걸려 있다.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오줌이 콱 막힌다. 죽으란 이야기다. (여자화장실의 변기 위에는 도대체 무슨 문구가 붙어 있는지 정말 궁금하다.) 정서 표현 자체가 억압되는데 어찌 정서적 표현을 통해 전달되는 사회적 참조가 가능할까? 남자들에게는 사회적 가치, 도덕적 규범을 내면화하는 사회화 절차가 기초부터 꼬여 있다는 이야기다. 어찌 성숙할 수 있을까? 철없는 남자들에게 남겨진 방법은 둘 중 하나다. 개처럼 으르렁거리거나, 애처럼 징징대거나….
명지대 교수·여러가지문제연구소장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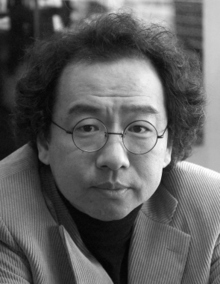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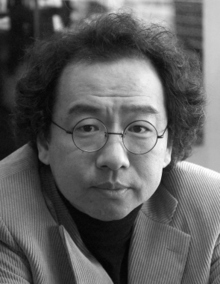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