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1.09.26 19:07
수정 : 2011.09.26 19: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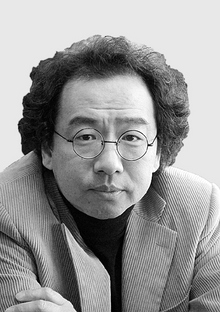 |
|
김정운 명지대 교수·여러가지문제연구소장
|
아무리 트위트를 들여다봐도
다들 리트위트(RT)뿐이다
그래서 이토록 힘든 거다
지금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포스트모더니즘. 아, 그리고 아무리 읽어도 이해되지 않던 프랑스의 그 희한한 철학자들도 있었다. 데리다, 들뢰즈, 라캉, 가타리 등등. 학계의 지적 허영도 여인들의 가방 못지않다는 느낌이 든다. 그러나 불과 20년 전만 해도 참 대단했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정말 난해한 이야기도 포스트모더니즘의 외피를 입히면 그럴듯해 보였다.
실제로 미국 뉴욕대학의 물리학 교수인 앨런 소칼이 1996년 ‘경계의 침범: 양자중력의 변형해석학을 위하여’라는 폼나는 논문을 발표하여 학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불과 2주 뒤에 소칼은 자신의 논문이 온갖 난해한 표현들만을 짜깁기한, 아무런 내용도 없는 글이었음을 밝히며, 전체 포스트모던 논의를 코미디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시니컬한 것만은 아니었다. 독일의 사회학자 하버마스는 근대 합리성의 위기를 특유의 진지함으로 변호한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다. 포스트모던 진영의 합리성 비판은 옳다. 그러나 그 비판은 근대적 합리성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한다. 합리성 비판은 도구적 합리성의 측면에 국한되어야 옳다. 근대의 기획에는 지배와 물화라는 제도적 측면에서 기인하는 도구적 합리성만 있는 것이 아니다. 생활세계의 합리화를 뜻하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증대라는 해방적 측면을 부정하면 안 된다. 이성의 합리성을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비판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 또다른 합리적 이성의 근거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아, 나도 가끔은 다른 교수들처럼 이렇게 어렵게 써서 폼나 보이고 싶을 때가 있다.)
하버마스가 이야기하는 도구적 합리성과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심리학적 근거는 ‘함께 보기’(joint-attention)라는 상호작용이다. ‘마주 보기’(eye-contact)와 더불어 ‘함께 보기’는 아동의 의사소통 발달의 핵심 현상이다. 엄마와 아기가 서로 눈을 맞추고 마주 보며 서로의 정서를 공유한다. 동시에 자신과 구별되는 또다른 존재와 만나고 있음을 처음 인지하게 된다.
발달이 진행되면 어느 순간부터 아동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게 된다. 함께 보자는 거다. 주체적 의도의 생성이기도 하다. 엄마는 아동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대상과 아동의 눈을 번갈아 바라보게 된다. 아동과 엄마의 관심이 공유되는 ‘함께 보기’의 시작이다. 이때 아동의 가리키는 행동의 의미는 둘 중 하나다. ‘저것 주세요!’ 혹은 ‘저것 뭐예요?’
‘저것 주세요!’의 ‘함께 보기’에서 엄마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목적은 물건이다. 엄마에게 저 물건을 건네 달라는 이야기다. 반면 ‘저것 뭐예요?’의 ‘함께 보기’에서의 목적은 엄마의 반응이다. 가리키는 물건은 엄마의 반응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다. 나와 소통하는 상대방의 의도와 생각이 목적이 되는 바로 이 경우가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발달심리학적 기원인 것이다. 반면 자신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상대방을 도구로 사용하는 ‘저것 주세요!’는 도구적 합리성의 발달적 기초다.
‘함께 보기’로부터 시작되는 상호간의 ‘관심 공유’, ‘의도 공유’야말로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구체적 기반이다. 아동 발달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도대체 누구와 공유할 관심과 의도가 없으니 그토록 외로운 거다. 아무리 트위트를 들여다봐도 다들 리트위트(RT)뿐이다. 페북에 죽어라 사진 올려도 다들 좋다는 ‘엄지손가락’뿐이다. 그래서 이토록 힘든 거다. 이 집단자폐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주체적 관심과 가치를 먼저 찾아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명지대 교수·여러가지문제연구소장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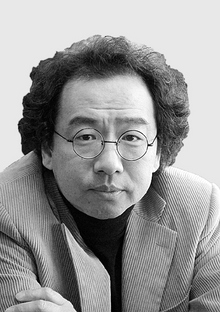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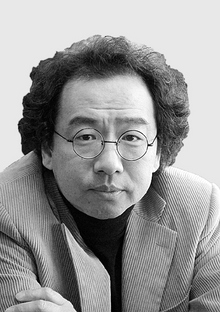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