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1.11.28 19:13
수정 : 2011.11.28 19: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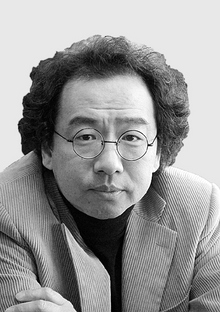 |
|
김정운 명지대 교수·여러가지문제연구소장
|
사회적 표상 이론으로 보자면,
‘남자’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개념적 연관 자체가 불가능하다
‘청소년’ 하면 무슨 단어가 연상되는가? 아, 좀 다른 방식으로 물어보자. ‘청소년’ 다음에 어떤 단어가 붙는가? 바로 나온다. ‘문제!’다. ‘청소년 문제.’ 한때 청소년은 ‘내일의 희망’이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청소년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내일이 되면 더는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를 살아야 하는 청소년에게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내일’만을 이야기하니 어찌 문제가 안 생기겠는가?
‘청소년’ 앞에는 또 무슨 단어가 오는지 생각해보자. ‘비행 청소년!’ 또다른 연결이 가능한가? 없다. 그래서 청소년은 항상 골치 아픈 존재인 것이다.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문제나 비행 때문에 ‘청소년 문제’, ‘비행 청소년’이라는 개념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 문제’, ‘비행 청소년’이라는 개념이 실제 청소년들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밤거리를 걷다가 청소년들이 떼로 몰려 있으면 겁부터 나는 것이다.
언젠가 밤늦게 집에 돌아오다, 동네 골목 어귀에 청소년 몇이 몰려 있는 것을 보고 은근히 겁먹은 적이 있다. 그 무리를 지나쳐 오려니, 어떤 녀석이 내 쪽으로 다가오며 거친 목소리로 부른다. ‘아빠!’ 젠장, 고등학교 다니던 내 아들이었다.
모든 개념은 문화적 경험이나 정서적 반응과 연관되어 있다. 이를 프랑스의 사회심리학자 모스코비치는 ‘사회적 표상’(social representation)이라고 정의한다. 개념을 듣거나 말할 때 연상되는 사회적 관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사회적 표상은 시간이 흐르면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사회적 실재가 된다.
우리의 ‘가족’이 그토록 갈등인 이유는 ‘가족’의 사회적 표상이 너무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강요되는 가족의 표상은 죄다 푸른 초원 위에 웃으며 파란 하늘을 향해 손가락을 같은 방향으로 가리키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함께 화장실 쓰고, 같은 이불을 덮는 가족이 어찌 매일 행복하고 즐겁기만 할 수 있을까? 남의 가족은 다 행복한데, 내 가족만 문제투성이로 느껴진다. 이를 프로이트는 ‘가족 로망스’(family romance)라고 정의한다. 지금 내 가족은 진짜가 아니고, 어딘가에 진짜 내 가족이 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한다는 거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다. 인터뷰나 토크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회적 유명인사들은 항상 ‘지금까지 희생해준 아내에게 미안하고 감사하다’고 한다. ‘아내는 반드시 희생해야 한다’는 사회적 표상이다. 그러니 내게 별로 희생적이지 않은 현실의 내 아내가 그토록 불만스러운 것이다. 그래도 이렇게 정적 상관이든, 부적 상관이든, 연관관계가 가능한 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그 상관관계가 언제든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진짜 문제는 개념적 연관관계가 아예 불가능한 경우다. 예를 들면 ‘남자’와 ‘행복’이다. 사회적 표상 이론으로 보자면 남자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그런 개념적 연관관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자의 행복’은 일상에서 자주 경험한다. 그래서 ‘여자라서 행복해요!’라는 황당한 광고가 나오기도 한다. 실제로 행복하든 불행하든 ‘여자’와 ‘행복’은 실재하는 사회적 표상이다. 그런데 ‘남자’와 ‘행복’은 도무지 연결되지 않는다. ‘남자’는 기껏해야 ‘야망’ 또는 ‘성공’으로 연결될 뿐이다. ‘성공’은 이미 물건너갔고, ‘야망’은 접은 지 이미 오래됐는데, ‘행복’할 자격조차 없는 이 땅의 남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아야 하는지, 요즘 여러가지문제연구소장인 내 생각이 매우 복잡하다. 이제라도 ‘남자라서 행복해요!’라고 마구 우겨야 할까 보다.
명지대 교수·여러가지문제연구소장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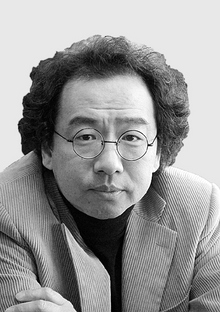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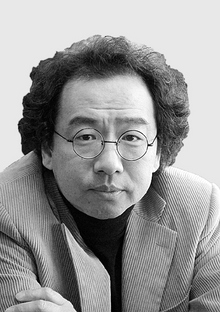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