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1.12.19 19:10
수정 : 2011.12.19 1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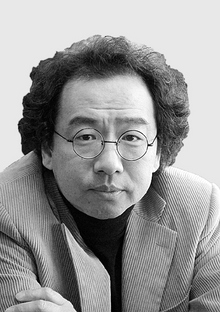 |
|
김정운 명지대 교수·여러가지문제연구소장
|
사회적 지위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처럼 불안한 일은 없다
그것은 반드시 사라지기 때문이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젠장, 한번 시인도 영원한 시인이다. 딱히 하는 일도 없고, 먹고살기 궁핍해도, 시인이라면 어딜 가도 대충 폼 난다. 스스로 자신을 시인이라고 소개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주위 사람들이 알아서 시인이라고 이야기해 준다. 그저 그 옆에서 우중충한 표정만 하고 있으면 된다. 그래야 시인은 폼 난다.
서울 마포 언저리 지하작업실에서 자신의 존재 자체가 고독이라고 주장하는 갑수형도 시인이다. 그는 매일같이 천장 올려다보며 음악만 듣는다. 20여년 전에 시집 한권 낸 것이 전부다. 그런데 여태까지 시인이다. 그 시집 제목도 <세월의 거지>다. 듣는 음악은 괴롭기 그지없다. 말러나 쇼스타코비치까지는 그래도 견딜 만하다. 코다이, 야나체크 등을 들려주며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아주 고문받는 느낌이다. 웬만한 음악 전공자들도 그가 음악 이야기를 꺼내면 이내 꼬리를 내린다. 그의 지하작업실 사방 벽면에 가득한 엘피(LP)판은 수만장이다. 그런데도 인터넷에선 ‘시인 김갑수’로 검색해야 그를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김갑수가 참 많기 때문이다.(아무리 생각해도 ‘갑수’란 이름은 부모가 작명에 크게 고민하지 않고 지은 이름이다.)
사진작가도 시인이나 해병과 마찬가지다. 한번 사진작가면 죽을 때까지 사진작가다. 사진작가는 궁핍 모드의 시인보다는 좀더 폼 난다. 전문가용 고급 카메라의 후광이 한몫하기 때문이다. 광준이형도 사진작가다. 그런데 돈 받고 사진 찍는 일은 그리 자주 하지 않는 듯하다. 딱 먹고살 만큼만 번다. 그러나 사진작가 윤광준은 전혀 궁색해 보이지 않는다. 일단 스타일이 죽인다. 머리는 면도로 깔끔하게 박박 밀고 다닌다. 어설프게 빈 머리 가리느니 차라리 깨끗하게 밀고 다니겠다는 거다. 머리카락이 없는 대신 수염은 폼 나게 길렀다. 머리에는 특이한 모자, 얼굴에는 동그란 안경, 어깨에는 사진기 한대 걸치고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전화하면 항상 지방 아니면 외국이다. 사진 찍으러 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놀러 다니는 것이 분명하다.
나이 들수록 ‘시인’, ‘사진작가’ 같은 직함이 부러워진다. 이들의 직함은 평생 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직업은 대충 55∼60살 사이에 그만두게 된다. 일반인들이 체감하는 심리적 정년퇴직 평균 연령은 48.2살이라고 한다. 정년 이후에는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거의 없다. 그래서 한국 남자들은 명함이 사라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세상에 맥 빠지는 때가, 자신을 부를 때 ‘전’을 붙이는 경우다. 높은 지위일수록 ‘전’이 붙으면 말년이 아주 쓸쓸하다. 전 사장, 전 의원, 전 장관, 전 대통령 등등.
심리학에서 ‘아이덴티티’, 즉 그 어떤 것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은 존재 유지의 필수조건이다. 그러나 사회적 지위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처럼 불안한 일은 없다. 사회적 지위는 반드시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토록 위세 당당하던 이들도 은퇴하는 그 순간부터 바로 헤맨다. 은퇴 후 불과 몇달 사이에 표정이나 태도가 어쩌면 저렇게 초라해질까 싶은 경우를 자주 본다.
요즘 나는 ‘교수’보다 ‘여러가지문제연구소장’이란 직함을 더 자주 내민다. 교수는 길어야 65살까지 할 수 있지만, ‘여러가지문제연구소장’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무거나 내키는 대로 이야기해도 된다. ‘여러가지 문제’에 속하지 않는 문제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어떤 상황에서든 자기 존재가 확실하게 확인될 수 있다면, 삶은 아주 살만해진다. 어떤 것이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직함을 고민하자는 거다!
김정운 명지대 교수·여러가지문제연구소장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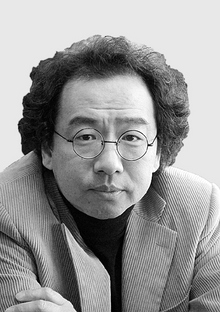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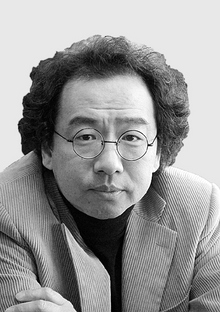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