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예종석의 오늘 점심] 빈대떡 |
빈대떡은 음식이름치고는 생뚱맞다. 우선 빈대 같은 혐오해충의 명칭이 음식명에 붙었다는 점에서 그렇고 떡이 분명 아닌데도 그렇게 불린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빈대떡이라는 명칭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이 엇갈린다. <명물기략>에는 중국의 떡인 알병의 알자가, 빈대를 뜻하는 갈(蝎)자로 잘못 알려져 빈대떡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옛날에는 지금의 정동지역에 빈대가 많아 빈대골로 불렸는데, 그곳 사람들 중에 부침개장사가 많아 빈대떡이 되었다는 풍설도 있다. 그러나 국어학계는 빈대떡이 중국떡 빙져에서 비롯된 호칭이라는 견해를 제시한다. 빙져가 빙쟈가 되었다가 가난한 사람들의 떡이라는 의미의 빈자떡이 되었고, 그것이 빈대떡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17세기의 <음식디미방>에는 빈쟈라 했고 1809년의 <규합총서>에는 빙쟈가 나온다. 방종현교수는 근대어 문헌에 보이는 빙쟈가 빙져의 차용어라고 했다. 19세기 말의 <광재물보>나 <한영자뎐> 등에는 빙자떡, 빈쟈떡, 빈자떡이 나오는데 학계는 빙쟈의 정체성이 모호해져서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 떡을 붙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풍연선생 같은 이는 빈자의 떡이라는 해석에 대해 그것이 과연 가난한 자가 수시로 부쳐 먹을 수 있는 음식인가 하는 관점에서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다 1938년에는 빈대떡이 <조선어사전>에 등재되고 급기야 1988년의 표준어규정에서는 빈자떡을 제치고 표준어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빈대떡을 가장 즐겨먹는 평안도사람들은 정작 그런 명칭을 쓰지 않고 ‘녹두지짐’이라 부른다는 점이다. 서울에서도 논현동의 한성칼국수는 빈대떡으로, 저동의 평래옥은 녹두지짐으로 이름을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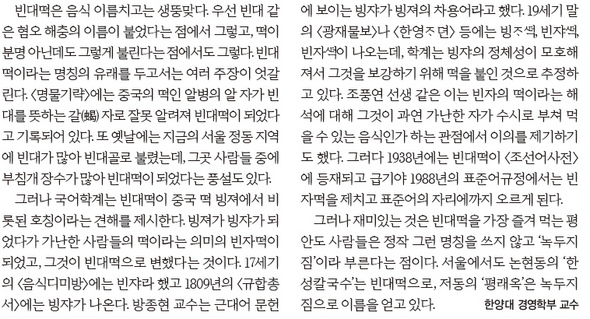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