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0.06.30 22:05
수정 : 2010.06.30 2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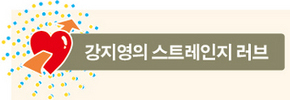 |
|
강지영의 스트레인지 러브
|
[매거진 esc] 강지영의 스트레인지 러브
아는 개가 있었다.
우린 서로의 얼굴과 체취만 알 뿐, 이름 같은 건 몰랐다. 녀석은 박스를 주워 생계를 잇는 독거노인의 유일한 가족이었고, 나는 별을 보고 출근해 달을 보고 퇴근하는 고달픈 독거 처녀였다. 철야를 하고 집에 돌아올 때, 아슴푸레한 골목길이 두렵지 않은 건 순전히 녀석 때문이었다. 녀석은 내 발소리를 들으면 철제 대문 아래로 머리를 빼꼼 내밀곤 한껏 귀를 뒤로 젖히고 할딱거렸는데, 난 그때마다 핸드백에서 소시지 한 토막씩을 꺼내 턱밑에 놓아주곤 했다.
녀석의 밥그릇엔 늘 물에 퉁퉁 불은 밥과 시어터진 김치, 드물게 생선뼈나 내장이 담겨 있기도 했다. 사시사철 이끼로 뒤덮인 주접 든 물그릇, 대구능금 혹은 괴산마늘 박스가 녀석의 잠자리였다. 하지만 나는 녀석을 동정하지 않았다. 하루 세 끼 매식을 하는데다, 인스턴트 커피를 예닐곱 잔씩 마신 탓에 위궤양을 앓고, 집에 돌아오면 잠시 머리만 붙였다 다시 좀비처럼 휘청휘청 일터로 향하는 나보다 녀석의 처지가 그리 못할 것도 없어 보여서였다.
그러던 어느 날, 녀석의 동거인이 죽었다. 아들인지, 조카인지 아니면 사회복지사인지 모를 중년 사내가 노인의 짐을 꾸려 승용차로 옮겼다. 조잡한 살림살이가 전봇대 아래 쓰레기 더미 옆으로 쌓였다. 문제는 개였다. 녀석은 빈집에 홀로 남아 하루에도 수십 번 철제 대문 아래를 오가며 주인을 기다렸다. 맘씨 좋은 이웃 아줌마가 밥그릇에 사료를 채워주고 플라스틱 물그릇이며 개껌 따위를 사다 놓기도 했지만 줄어들지 않았다. 녀석은 그해 여름을 넘기지 못하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얼마 뒤, 나는 전봇대에 붙은 전단에서 녀석의 사진을 발견했다. 역시 맘씨 좋은 이웃 아줌마의 솜씨 같았다. 잡종 진돗개 경자를 찾습니다. 그제야 나는 녀석의 이름이 경자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 관계가 ‘아는 사이’에서 ‘친구’로 발전하지 못한 이유도 깨닫게 되었다. ‘친구’란 늘 그리운 존재다. 필요할 때만 생각나는 건 그저 ‘아는 사이’일 뿐이다. 아는 개 경자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나는 이따금 녀석이 그립다.
강지영 소설가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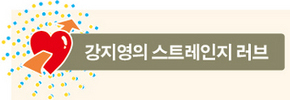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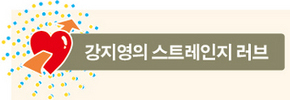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