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첫 시집 낼 무렵 싯다르타의 깨달음이 속삭였습니다
|
도종환의 나의 삶 나의 시 ⑬
신경림 선생의 전화를 받고원고를 올려보냈습니다
몇편을 바꿨으면 한다는 편지에
낯이 뜨거워졌습니다
시는 삶 속에, 이 땅 위에 뿌리박은
서정과 용기여야 한다고 믿었지만
형상화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동인지 <분단시대>를 내고 바쁘게 뛰어다니던 어느 날, 신경림 선생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창작과비평사(창비)에서 시집을 내고자 하니 원고를 보내라는 전화였습니다. 전화를 받으며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전화 중의 하나였습니다. 원고를 들고 여기저기 출판사를 쫓아다녀야 할 신인에 지나지 않는 제게 시집을 내 주시겠다고 전화를 하셨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것도 창비에서. 부랴부랴 원고를 정리해서 올려 보내고 난 뒤 이시영 시인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낭창낭창 휘어지는 가는 글씨로 원고지에 써 보낸 편지 속에는 다른 시로 바꾸었으면 하는 십여 편의 시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좋은 시집을 내고자 하는 의도로 그러는 것이니 오해 없기 바란다고 써 있었지만 낯이 뜨거웠습니다. 그 편지를 아직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시집이 나오고서 보니 바꾸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부족한 데가 많은 시집이었습니다. 시집을 내면서 저는 후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민중이니 민족이니 역사니 하는 것을 먼 곳에서 찾지 않는다. 식민지 시절에 앗기우며 한 세월을 보낸 할아버지, 태평양전쟁 말기 남양군도에 징용으로 끌려가 돌아가신 큰아버지, 그 큰아버지와도 싸웠을 군대에 배속되어 분단의 전쟁을 치른 아버지, 소금장수, 이발쟁이, 날품팔이, 농사꾼 형제들, 언청이, 못난이 누이들, 분단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내 이웃의 삶 속에는 생생한 역사와 아리고 한스러운 흔적들이 흉터처럼 박히어 있기 때문이다. 역사와 민중은 내 가까운 피붙이와 내 자신 속에서 늘 꿈틀거리고 있다. (…)시는 삶 속에, 이 땅 위에 튼튼히 뿌리를 박는 서정과 용기이어야 하리라 믿는다. 분단시대 약소민족의 아들로 태어나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 ‘우리가 분노해야 할 것’ ‘우리가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들 속에 서서 튼튼한 시를 쓰고 싶었다.” 민중문학, 민족문학이 우리 문학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가던 때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제게 민중이 어떻게 다가와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글입니다. 이 시집 안에는 <삼대>라는 연작시와 <죠센데이신따이>(조선정신대)라는 연작시가 들어 있습니다. <삼대>라는 연작시를 통해서 할아버지 때부터 광주항쟁에 이르기까지의 이 나라의 역사를 우리 가족사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죠센데이신따이> 연작시는 애국봉사대 간호원이라고 속아서 열여섯 살에 버마전선에 정신대로 끌려갔다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왔으나 조국에서 더 냉대를 당하고 있는 배옥수 할머니의 사례를 중심으로 아픈 역사를 재확인하고 우리 모두를 고발하고자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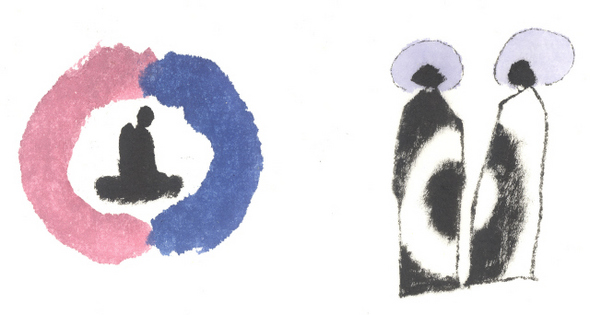 |
|
첫 시집 낼 무렵 싯다르타의 깨달음이 속삭였습니다
|
오동나무 함에 들려 국경선을 넘어오던
한줌의 유골 같은 푸스스한 눈발이
동력골을 넘어 이곳에 내려온다.
꽃뫼 마을 고령 신씨도 이제는 아니 오고
금초하던 사당지기 귀래리 나무꾼
고무신 자국 한 줄 눈발에 지워진다.
복숭나무 가지 끝 봄물에 탄다는
삼월이라 초하루 이 땅에 돌아와도
영당각 문풍질 찢고 드는 바람소리
발 굵은 돗자리 위를 서성이다 돌아가고
욱리하 냇가에 봄이 오면 꽃 피어
비바람 불면 상에 누워 옛이야기 같이 하고
서가에는 책이 쌓여 가난 걱정 없었는데*
뉘 알았으랴 쪽발이 발에 채이기 싫어
내 자란 집 구들장 밑 오그려 누워 지냈더니
오십 년 지난 물소리 비켜 돌아갈 줄을.
눈녹이물에 뿌리 적신 진달래 창꽃들이
앞산에 붉게 돋아 이 나라 내려볼 때
이 땅에 누가 남아 내 살 네 살 썩 비어
고우나 고운 핏덩어릴 줄줄줄 흘리련가.
이 땅의 삼월 고두미 마을에 눈은 내리는데.
* 12~14행은 단재 선생의 한시 <가형기일>에서 인용
-졸시 <고두미 마을에서-단재 신채호 선생 사당을 다녀오며> 전문 고두미라는 동네는 충북 청원군 낭성면 귀래리의 옛이름입니다. 청주시 근교인 그곳에 독립운동가인 단재 신채호 선생의 묘소와 사당이 있습니다. 신규식, 신홍식 등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고령신씨 문중이 그 근방에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찾는 이가 많지 않고,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 삼일절에 가 보면 문풍지가 다 찢어져 있곤 했습니다. 가장 비타협적인 독립운동 노선을 걸었고 이승만의 위임통치노선에 강력하게 반대했던 탓에 해방된 조국에서도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에 속이 상했습니다. 1936년에 뤼순 감옥에서 순국하신 뒤에도 일제가 매장허가를 내 주지 않아 유해를 몰래 암매장해야 했고, 최근까지도 국적을 회복해 주지 않아 후손들은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과연 해방된 나라인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번은 ‘분단시대’ 동인들과 단재사당을 찾아갔는데 묘소 주위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 주위를 둘러보니 낯선 젊은이 둘이 근처를 서성이는 게 보였습니다. 형사들이었습니다. 거기까지 저희를 미행하며 따라온 것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첫 시집이니 출판기념회라는 걸 하자고 해서 시내에서 동인들과 선후배 문인들이 모였습니다. 돌아가신 채광석 선배가 오셔서 강연을 해 주셨습니다. 끓어오르는 용광로 같던 채광석 선배는 그날도 뒷주머니에 박노해의 노동시 원고를 복사해서 넣고 와 뒤풀이 자리에서 열정적으로 낭송을 하거나 혼자 몇십 분씩 노래를 해서 모인 사람들 기가 질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미운오리새끼’의 신동인 선배도 술이 취해서 참석하였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약 같은 신 선배를 바라보며 조마조마했습니다. 이 따위를 시라고 써 가지고 출판기념회라고 이렇게 사람들 불러놓고 북 치고 장구 치고 있냐고 소리치며 판을 뒤집을 것 같았습니다. 신 선배는 전두환 정권 칠년간 신문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금강경만 읽는다고 했습니다. 그의 눈에 저는 타락한 현실의 한가운데로 빠져 들어가는 걱정스러운 사람으로 비쳤을 겁니다. 출판기념회가 끝나고 일행들이 뒤풀이 장소로 옮겨가는 동안 신 선배는 마지막까지 출판기념회장에 남아 제게 걱정스러워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신 선배의 모습을 보며 헤르만 헤세의 <싯다르타>를 생각했습니다. 구도의 길을 끝까지 벗어나지 않았던 사문 고빈다와 현실 속으로 뛰어들어가 현실의 온갖 오탁을 경험하며 순례하는 싯다르타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불도의 길에서 떠나 카마라에게 가서 애욕을 배웠고 카마스바미에게서 장사를 배워 돈을 모은 뒤 그것을 낭비하고, 위를 사랑하고 관능에 아첨하며 사는 싯다르타를 보고 고빈다는 자네는 순례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순례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
|
도종환 시인
|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