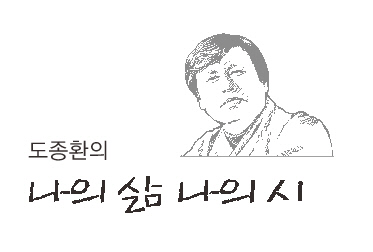 |
|
그림 이철수
|
도종환의 나의 삶 나의 시 16
예상치 못한 떠들썩한 반응대중성에 영합했다는 평가…
모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미숙한 시
그냥 건넨 제 책임이 컸습니다 이정우 신부님의 시 중에 <이 슬픔을 팔아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슬픔을 팔아서 / 조그만 꽃밭 하날 살까. / 이 슬픔을 팔면 / 작은 꽃밭 하날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시작하는 시는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지켜보며 가눌 길 없는 슬픔을 다스리려고 쓴 시입니다. 슬픔과 아픔이 없는 곳을 꿈꾸는 이 시를 읽으며 이 시의 제목이 가시처럼 목에 걸릴 때가 있었습니다. 나야말로 슬픔을 팔아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는 슬픔을 내다파는 일이 아니고 슬픔을 함께 나누는 일이어야 하며, 사랑의 아픔을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집이 나오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매스컴의 떠들썩함과 독자들의 반응과 베스트셀러가 되어가는 과정은 시골학교 선생인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대중성에 영합한 저급한 문학으로 평가 절하되는 과정을 겪어야 하는 일도 힘든 일 중의 하나였습니다. 신문마다 시집이 두 달 만에 십만 부가 나갔다, 일 년여 만에 오십만 부가 팔렸다 이런 기사로 상업주의에 휩쓸려 있을 때, 문학적 평가를 해보자고 먼저 나선 것은 <창작과비평>이었습니다. 최두석 교수는 ‘대중성과 연애시’라는 논문에서 “절실한 마음과 평이하면서도 적절한 표현”으로 강한 호소력을 발휘하면서 “대중성은 획득했으나 ‘분단시대’ 동인으로서 무장해제라는 화살을 피하기는 힘들게 되었다”고 하면서 “시인이 이 땅의 엄연한 현실에 뿌리내리기를 바라는 필자로서는 너무 오래 무덤가를 배회하고 있다는 느낌을 버릴 수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그리는 대상으로서의 님이 한용운보다는 김소월에 닿아 있다고 보면서, 김소월의 <산유화>에 비해 보면 도종환의 시는 “너무 평면적이고 왜소한 것으로 판단”되고, “문학이 담당할 역사적인 몫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접시꽃당신>은 문학사의 주류에 들기엔 아무래도 미흡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창비 1987>, 1987)고 평가하였습니다. 2년 뒤인 1989년 최두석 교수는 <실천문학> 겨울호에 쓴 다른 논문을 통해 제 시가 “너무 오래 무덤가를 배회하고 있다”는 불만을 밀어내고 “현실에 굳건히 뿌리내리고 있다”는 평가를 한 바 있지만, 동시대에 함께 활동한 문우인 최두석 교수의 평가를 저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주류 문단의 반응 역시 이 시집이 문학사의 주류에 들기엔 미흡하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또 다른 한 주류인 <문지> 쪽에서는 시집이 나온 지 이십오 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원고청탁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시문학>에서는 아예 시로 취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시문학>은 지령 200호 특집으로 마련한 ‘집중분석 / 세칭 베스트셀러 시집’을 통해 “짙은 감상성, 보편적 정서에 녹아 있는 산문성 등을 지니고 있는 도종환의 시편들이 대중의 인기를 얻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눈물 외에 시대성이나 역사성은 물론 이 시대의 삶의 문제에 진지하게 접근하고 고뇌하고 개혁하려는 젊은 시인의 민중적인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바로 이러한 점이 눈물을 사랑하는 대중들의 감성에 영합된 것으로 보인다”(심상운)고 진단했습니다. 특집은 서정윤의 <홀로서기>, 이해인의 <오늘은 내가 반달로 떠도> 등을 포함해 집중적인 비판을 제기하면서 “한결같이 문학적 수용능력이 부족한 독자층에 의해 선호된 시 이전의 시” “시에 미치지 못한 시, 즉 시의 차원에 다다르지 못한 미숙한 시”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런 시집들이 많이 읽히고 팔리게 되는 것은 “문학적 수용능력이 결여된 젊은 독자층의 무분별한 독서 행위, 예술성보다는 센세이셔널리즘만을 추구하는 대중매체들의 과대보도, 출판사들의 얄팍한 상업주의 등이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베스트셀러 시집이야말로 현대적인 비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적한 대로 대중매체야 예술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센세이셔널한 것을 찾아다니게 마련이고, 상업적으로 경쟁하며 잡지를 팔다 보면 과대보도와 과장된 선전이 넘쳐나게 된다는 건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래서 이건 ‘시라고 할 수 없다’고 해도 그 평가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작품에 비해 과도한 관심을 받은 것이 사실이고, 시의 깊이나 성숙도나 완성도가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데 비해 시집 한 권으로 얻은 명성은 지나치게 큰 것이 틀림없습니다. 받은 격려와 보상이 너무 과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판 또한 머리 숙여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대성’, ‘역사성’, ‘삶의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뇌’가 없다는 지적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
|
미욱한 탓에 ‘슬픔을 판 시인’이란 낙인이 찍혔습니다
|
소리 없이 그러나 오래오래 흐르는 강물을 따라
그댈 보내며
이제는 그대가 내 곁에서가 아니라
그대 자리에 있을 때 더욱 아름답다는 걸 안다
어둠 속에서 키 큰 나무들이 그림자를 물에 누이고
나도 내 그림자를 물에 담가 흔들며
가늠할 수 없는 하늘 너머 불타며 사라지는
별들의 긴 눈물
잠깐씩 강물 위에 떴다가 사라지는 동안
밤도 가장 깊은 시간을 넘어서고
밤하늘보다 더 짙게 가라앉는 고요가 내게 내린다
이승에서 갖는 그대와 나의 이 거리 좁혀질 수 없어
그대가 살아 움직이고 미소 짓는 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그대의 자리로 그대를 보내며
혼자 뼈아프게 깊어가는 이 고요한 강물 곁에서
적막하게 불러보는 그대
잘 가라 - 졸시 <그대 잘 가라> 전문 그런데 시집이 서점에 나올 때는 제목이 <접시꽃당신·2>로 바뀌어서 출간되었습니다. 저도 서점에 갔던 후배들이 하는 말을 듣고 놀라 출판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제목을 저자도 모르게 바꾸는 법이 어디 있느냐?”, “다시 책을 수거하고 원제목으로 바꾸어서 찍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미 전국 서점에 다 배포를 해서 어렵다. 미안하다. 양해해 달라”는 말만 할 뿐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배창환 시인 등 문우들은 이렇게 되면 앞의 시집도 상업주의의 오명을 벗어날 수 없게 되고, 지금까지 낸 시집 모두를 잃게 되는 짓이라고 성토를 했습니다. 문단의 어른들도 이거야말로 좌파상업주의라고 나무라셨습니다. 정식 문건으로 사과문을 받고 다시 시집 제목을 <내가 사랑하는 당신은>으로 바꾸는 데는 꽤 여러 해가 걸렸습니다. 저는 저자용으로 배달되어 온 증정본 스무 권의 포장을 그때까지 풀지 않고 있었습니다.
 |
|
도종환 시인
|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