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마른버짐 핀 어린 얼굴들이 “사랑했다” 도닥였습니다/ 그림 이철수
|
도종환의 나의 삶 나의 시 19
유월엔 이한열이 쓰러졌습니다최루탄 가득한 대전의 거리에서
길잃은 아이와 함께 울었습니다
6·29가 나면서 시골학교를 떠났습니다 쫓겨 간 학교에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받으며 생활하는 선생 노릇이었지만 그래도 교실에 들어가 아이들 얼굴을 보면 힘이 났습니다. 시골 학교 중학생들이었지만 과꽃 같은 아이들, 봉숭아꽃 같은 아이들, 달리아 같은 아이들, 햇감자 같은 아이들, 갓 캐어낸 고구마 같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엄마가 캔 고구마는/ 엄마 얼굴 닮고// 내가 캔 고구마는/ 내 얼굴 닮았다”고 시를 쓰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두고 온 어릴 적 고향의 냄새가 이 아이들에게서 났습니다. 겨울이면 연을 만들어 날리고, 눈 쌓인 뒷산에 토끼 올가미를 놓고, 대보름날 밤이면 밥 훔쳐 먹으러 떼를 지어 몰려다니는 아이들. 그걸 알고 어머니들이 부뚜막에 잡곡밥과 나물을 모른 체 놓아두곤 하는 마을에서 아이들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신발을 양손에다 벗어 쥐고 맨발로 노래 부르며 집으로 가는 아이들, 맨발에 닿는 진흙의 느낌이 얼마나 좋은지 아는 아이들이었습니다.
 |
|
마른버짐 핀 어린 얼굴들이 “사랑했다” 도닥였습니다/ 그림 이철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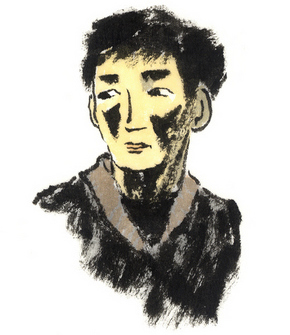 |
|
마른버짐 핀 어린 얼굴들이 “사랑했다” 도닥였습니다/ 그림 이철수
|
정치 정세도 불안정해 직선제 개헌에 대한 요구를 전두환 대통령이 4월13일 호헌조치로 대답하고, 그 호헌조치에 대해 저항하는 국민적 요구가 전사회적으로 폭발해 올라오는 때였습니다. 유월로 접어들면서 연세대생 이한열이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아 피 흘리며 쓰러졌고 넥타이를 맨 시위대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산골에 사는 저는 서울까지 갈 수는 없고 대전으로 나가 시위행렬과 함께 거리에 서 있곤 했습니다. 한번은 가까이서 터지는 최루탄을 피해 달아나다 길을 잃고 우는 어린아이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를 안고 골목으로 피해 달려가다 시장 안 생선가게의 비린내 나는 물로 얼굴을 씻으며 최루탄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뿐인 손수건으로 아이의 눈과 입을 가리고/ 차마 뜨이지 않는 아픈 눈자위를 손등으로 부비며/ 아이와 함께 우리는 울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더 가면 괜찮다/ 아가, 너희는 최루탄 없는 세상에서 살아라 달래며/ 눈이 매워서가 아니라 북받쳐 오르는 분노 때문에/ 우리는 울고 있습니다”(졸시 <아가, 너희는 최루탄 없는 세상에서 살아라> 중에서) 그런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대전역에서 도청까지 이어지는 가득한 시위대열이 경찰을 무장해제 시키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시위대에 갇힌 채 장비를 다 빼앗기고 두려움에 떨며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저녁에 6·29선언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전에서 옥천으로 돌아와 밤길을 걸어 하숙방으로 혼자 걸어가는 동안 입에서 낮에 불렀던 노래 한 구절이 나지막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하는 대목에 이르자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6·29선언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장학사 한 분이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장학사는 지나가다 들렀다고 하면서 청주로 가야 하지 않느냐는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어 청주로 들어가느냐? 규정도 그렇고 근무점수도 청주로 갈 만한 점수가 아니라는 걸 장학사님도 알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이, 왜 그러세요? 가셔야지요” 하는 겁니다. 저로서는 도대체 무슨 깜냥인지 알 수가 없는데, 학교에서는 제가 곧 청주로 가게 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제 처지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중앙일보> 기사를 보고 어떤 분들이 집단으로 교육감 앞으로 민원을 넣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6·29선언과 집단 민원의 여파로 그해 가을 청주로 발령이 났습니다. 잘 지내던 시골 학교 아이들과 갑자기 헤어져야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운동장에 모인 아이들에게 이임인사를 하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갑자기 마이크가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돌아서야 했습니다. 마른버짐이 핀 얼굴을 들지 못한 채 어깨를 들먹이고 있는 아이들을, 봉숭아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꽃밭을, 고개 꺾은 해바라기가 줄 지어 선 학교 뒤뜰을, 내 생애의 못다 한 한 시절을 그냥 거기 둔 채 돌아서는데 안개비가 자욱하게 내렸습니다. 나는 또 너희들 곁을 떠나는구나 기약할 수 없는 약속만을 남기고 강물이 가다가 만나고 헤어지는 산처럼 무더기 무더기 멈추어 선 너희들을 두고 나는 또 너희들 곁을 떠나는구나 비바람 속에서도 다시 피던 봉숭아 잎이 안개비에 젖고 뒤뜰에 열 지어 선 해바라기들도 모두 고개를 꺾었구나 세월의 한 구비가 이렇게 파도칠 때마다 다 못 나눈 정만 흥건히 담아둔 채 어린 너희들의 가슴에 잔물지는 아픔을 심는구나 나는 다만 너희들과 같은 아이들 곁으로 해야 할 또 다른 일을 찾아 떠나는 것이라고 달래도 마른버짐이 핀 얼굴을 들지 못하고 어깨를 들먹이며 아직도 다하지 못한 나의 말을 자꾸 멈추게 하는구나 우리 꼭 다시 만나자 이 짧은 세상에 영원히 같이 사는 사람은 없지만 너희들이 자라고 내가 늙어서라도 고맙게 자란 너희들의 손을 기쁨으로 잡으며 이 땅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하나 되어 꼭 다시 만나자. - 졸시 <지금 비록 너희 곁을 떠나지만>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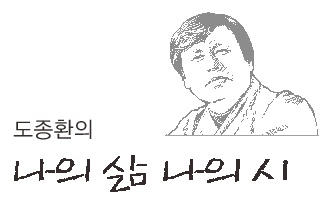 |
|
도종환의 나의 삶 나의 시
|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