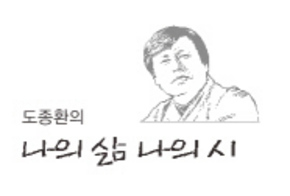 |
|
도종환의 나의 삶 나의 시 41
|
산골 황토집은 오고 가는 사람 없이 외롭고 무서웠습니다
나리꽃, 고라니가 섞여 사는 숲…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도종환의 나의 삶 나의 시 41
제가 복직하게 되었을 때 도교육청에서는 저를 충북 진천군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진천읍에 있는 진천중학교에 국어교사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9월1일자 발령이 이유 없이 두 주 세 주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진천중학교 교장이 저를 절대 받을 수 없다고 해서 미루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1989년 청주 중앙중학교에서 해직되고 감옥에 갇힐 때 그 학교 교감이었습니다. 결국 그 교장이 관내 국어교사들에게 전화를 해서 덕산중학교에 근무하는 원로교사 한 분을 진천 중학교로 데리고 가고 제가 덕산중학교로 가게 된 것입니다.
덕산면에 있는 덕산중학교에 처음 부임하던 날은 화요일이었는데 운동장 조회가 열렸습니다. 설렘 반 두려움 반, 그런 마음으로 서 있는데 교장이 조회단에 서자 “대대장 교장선생님께 경례!”라는 마이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말과 함께 “교장 선생님께 경례!” 하는 학생의 목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전교생이 “충효!” 하는 구호를 외치며 거수경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그때 저는 “충성!” 하고 외치는 걸로 들었습니다. 치마를 입은 어린 여학생들이 단발머리에 거수경례를 하고 서 있었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학교에 이런 군사문화가 남아 있는지 혼돈스러웠습니다.
 |
|
그림 이철수
|
친구의 권유로 마음수련원에도 가 보았습니다. 아프다는 소문을 들은 은사께서 소개해 줄 곳이 있다고 해서 기수련을 하는 곳을 가보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조용히 요양하며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사 친구의 권유로 거처할 만한 곳을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사찰로 들어가라고 소개해 주는 후배도 있었고, 조용한 요양원을 알려주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후배인 김이동 선생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잠깐 같이 갈 데가 있는데 나와 보라고 해서 그를 따라나섰습니다. 그는 나를 태우더니 청주 시내 외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피반령 고개를 넘어 깊은 산골 외딴 황토집으로 나를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서 지내세요.”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집은 자기 동생이 암에 걸렸을 때 요양을 하기 위해 지은 집이었습니다. 똑똑하고 성실하고 일을 좋아했으며, 참 좋은 사람이었던 동생이 거기서 몇 해 살다 세상을 뜨고 난 뒤에 비어 있는 집이었습니다. 김 선생은 나를 거기 데려다 놓은 뒤 땔나무를 해다 뒤뜰에 쌓아 놓고, 텃밭을 일구어 먹을 것을 마련해 주고, 며칠에 한 번씩 드나들면서 나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휴직을 거듭하다 결국 학교는 퇴직을 하고 말았습니다. 육 개월에 한 번씩 기간제 교사에게 수업을 맡기는 동안 아이들이 받을 교육적 손실을 생각하니 미안했습니다. 제가 퇴직을 하고 젊고 새로운 교사가 맡아서 가르치게 하는 게 도리에 맞는 일이었습니다. 1977년에 교사가 되었으니까 27년간 교직에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퇴직을 할 때 연금 없이 퇴직금 186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제가 받은 전부였습니다. 교직 생활 20년이 넘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해직 기간이 10년입니다. 복직을 했고 민주화 관련유공자이니까 국가가 입힌 피해를 보상해 주도록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해직되고 투옥되었던 교사들은 아직도 보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 해직 기간에 대한 호봉도 인정해 주지 않아서 해직 십 년은 그냥 ‘잃어버린 십 년’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연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몸에 병이 들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므로 그 돈으로 몇 년을 살았습니다. 어떤 해는 한 해에 지출한 의상비 총액이 만원인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농협에 갔다가 농협 앞에 바지 몇 개 펼쳐 놓고 팔고 있는 걸 보고 만원짜리 작업복 바지 하나 충동구매로 산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루 종일 새소리 물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산속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동네에서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오고 가는 사람도 없었고 사람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외롭고 적막했습니다. 밤에는 무서웠습니다. 혼자 끓여 먹고, 혼자 치우고, 혼자 누워 있으면서, 유배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 유배를 온 것일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적막하고 낯선 산중에 유폐된 제 삶이 측은하기도 했습니다. 사방이 고요하여 혼자 소리치고 있을 수도 없어 저도 자연히 고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저만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낙엽송도 혼자 서 있고, 두충나무도 혼자 있었습니다. 나리꽃도 저 혼자 피어 있고, 고라니도 산비탈을 혼자 건너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것들도 다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낙엽송도 숲의 다른 나무들과 같이 섞여 있고, 냉이꽃도 꽃다지와 함께 있으며, 고라니도 멧비둘기와 같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숲이 제 폐의 바깥이고 제가 숲의 뱃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속에서 그래도 제가 형편이 가장 나았습니다. 비를 맞지 않고 잠자리에 들 수 있고, 겁내지 않고 물을 마실 수 있으며, 다른 짐승에게 잡혀 먹힐 위험도 없었습니다.
 |
|
그림 이철수
|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