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0.10.07 14:49
수정 : 2010.11.25 1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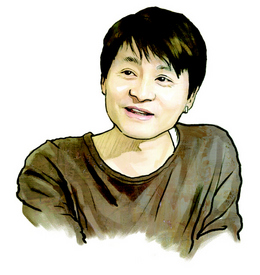 |
|
김조광수의 ‘마이 게이 라이프’
|
[매거진 esc] 김조광수의 ‘마이 게이 라이프’
어릴 때 내가 살던 동네는 작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서울의 변두리였다. 옆집의 부부가 언제 밤일을 치렀는지 알 정도로 비밀이 없었고 정이 많은 동네였다.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있던 친구 집 문간방에 20대 형제가 자취를 하고 있었고 그중 대학생 형에게 나를 비롯한 동네 아이들 여럿이 싼값에 과외를 했다. 형제는 선한 얼굴에 깔끔하고 싹싹해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서로 사위를 삼겠다고 나설 만큼 인기가 좋았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형제가 야반도주하듯 떠나버렸다. 그들이 떠나고 1주일이 지난 뒤에 수다 떠는 아주머니들의 입을 통해 속사정을 알 수 있었다. “그 호모들!” 그랬다. 형제로 위장한 호모 커플이었다. 정 많던 우리 동네 사람들이 그 호모들을 쫓아냈다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되었다. 엄마에게 호모가 뭐냐고 물었다가 제대로 된 대답 없이 야단을 맞았고 선생님께 물었을 때는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고 병 옮으니 가까이하면 안 된다”는 답을 들었다.
중학교 3학년 때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빨간책이란 것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다. 난 잡지 안의 가슴 큰 여자들보다 사진을 보고 흥분해 불룩해진 친구들의 앞섶에 더 눈길이 갔다. 그중에는 내가 좋아하던 녀석도 있었다. 그 녀석에게 내 마음을 들킬까봐 얼른 도망쳤다. 집으로 가는 내내 호모가 된 것 같아 아프고 괴로웠다. 그렇게 사춘기를 겪으면서 점점 더 호모가 되어가는 나를 깨달으며 우울해졌다. 어디서 옮은 건지 모르는 내 병이 싫었고 그걸 또 남에게 옮길까 봐 두려웠다.
그게 병이 아니고 나쁜 짓도 아니란 걸 알기까지 10년이 넘게 걸렸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파고다극장이란 이름의 호모들이 크루징을 하는 곳이 있었다. 두번을 허탕치고 세번째 나갔을 때 쎄끈한 청년을 만났다. 그는 돈을 많이 벌면 스웨덴으로 이민을 갈 거라고 했다. 스웨덴에는 호모들이 시내 중심가에서 합법적으로 퍼레이드를 벌이고 심지어 결혼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들을 호모가 아니라 게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었다. 그 뒤로 책이나 영화를 통해 스웨덴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게이들이 동성애 인권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는 동안 나도 커밍아웃을 했고 퀴어영화를 만들어 극장에 걸기도 했다.
며칠 전 사람들이 폐간운동을 하는 모 신문에 호모포비아 단체들이 요상한 광고를 실었다. “<인생은 아름다워>를 보고 게이 된 내 아들, 에이즈(AIDS) 걸려 죽으면 에스비에스(SBS)가 책임져라”는 것이었는데, 내 눈에 들어오는 건 호모가 아니라 게이라는 단어였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호모포비아 단체마저도(!) 우리들을 호모라 부르지 않고 게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게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즐거운’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동성애자들이 스스로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부르던 것이 정착되었다. 이 칼럼의 제목이 게이라이프인 것도 그 때문이다. 앞으로 유쾌발랄한 게이라이프를 만나실 것이다. 세상은 그렇게 변한다.
김조광수 영화감독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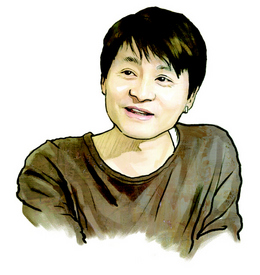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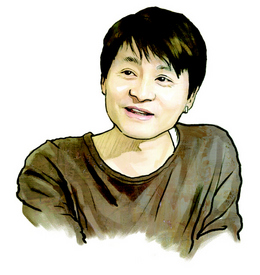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