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1.08.25 14:25
수정 : 2011.08.27 13:37
[매거진 esc] 김조광수의 ‘마이 게이 라이프’
“나는 왜 이런 사랑을 해야 할까?”
첫사랑을 시작하고부터 커밍아웃을 하기까지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질문이다.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동성애자들이 그런 과정을 거친다. 아니, 난 행복한 편이고 어떤 동성애자는 그 고민 속에 빠져 지내다 죽을지도 모른다. 같은 맥락의 고민으로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고칠 수는 없을까?” 등도 있겠다. 이성애자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 동성애자들만이 겪는 고민이다. 그러게, 동성애자들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누가 좀 속 시원하게 알려주면 좋겠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딱 부러지게 알려주는 이는 없다. 그래서 그 고민을 온전히 자기가 감당해야만 한다.
내가 그 고민을 처음 하게 된 때는 3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까까머리였던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 아이였던 해성이(이름도 참 이뻤다. 바다 해, 별 성)를 짝사랑하면서였다. 처음엔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좋아하는 걸로만 생각되었지만 자위를 하면서 해성이를 떠올리는 순간 깨달았다. 아, 내가 말로만 듣던 그 호모로구나!
깜짝 놀랐다. 너무 놀랐다. 참담한 마음에 많이도 울었다. 울면서 다짐하고 더러운 정신을 씻으려고 교회도 나가고 더러운 몸을 닦고 또 닦아 봤지만 헛수고였다. 그런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주님은 응답해주지 않았고 때수건으로 박박 밀면 피부만 벗겨질 뿐이었다. 그렇지만 나를 괴롭히는 일을 멈출 수는 없었다. 나한테 벌을 주어야만 잠을 잘 수가 있었다. 그러는 동안 내 마음은 조금씩 병들어 갔다. 마음이 병들어 가는 건 괜찮았다. 동성을 좋아하는 감정만 사라진다면 그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힘들기만 할 뿐 나아지지는 않았다. 그렇게 사춘기를 보내고 대학에 가게 되었다.
광주를 피로 물들인 학살의 원흉 전두환. 그가 대통령이던 시절에 대학을 다닌다는 건, 개인의 사랑 따위는 멀리 던져버리고 조국을 위해 한 목숨 초개와 같이 바쳐야 되는 거였다. 아니, 그래야 되는 줄 알았다. 입학식 전부터 ‘사회과학 학습’을 시작한 내게 대학생활은 오직 다가올 혁명을 준비하는, 전사가 되는 시기였을 뿐이었다. 그렇게 학생운동을 하면서 나는 차츰 안정이 되어 갔다. 더 이상 나를 벌주지 않아도 되었다. 도리어 나를 칭찬하는 때가 많아졌다. 행복했다.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혁명을 꿈꾼다고 동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기 때문이다. 조직의 선배를 짝사랑하게 되었다. 처음엔 그 때문에,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더 열심히 했다. 그와 가까이 하기 위해, 그의 칭찬을 듣기 위해 누구보다 더 열심히 투쟁했다. 하지만 호모는 혁명을 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세계 어느 혁명사를 뒤져봐도 동성애자를 인정하는 혁명은 없었다. 오히려 혁명 후 동성애자들은 제일 먼저 처단되었다. 무서웠다. 그렇다고 혁명을 포기할 순 없었다.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타 죽을지 뻔히 알면서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불나비가 된 것 같았다.
영화감독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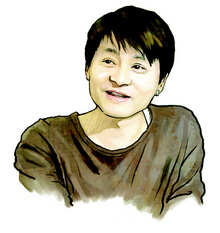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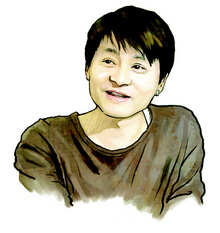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