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1.10.20 10:59
수정 : 2011.10.20 10: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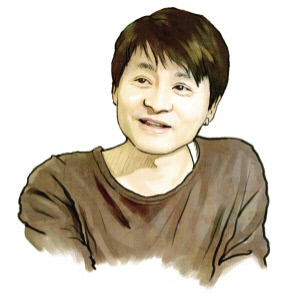 |
|
김조광수의 ‘마이 게이 라이프’
|
[esc] 김조광수의 ‘마이 게이 라이프’
1996년 개막한 이후 15년 동안 한번도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지 않은 적이 없다. 부산국제영화제에 개근상이 있다면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개막식 레드카펫을 밟는 것을 즐기지는 않았다. 물론 영화제 개막식 레드카펫을 아무나 걸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스타 배우들의 경우엔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왜? 그래서 스타 아닌가!)이지만 감독이나 제작자의 경우엔 다르다. 보통 그해 영화제에 작품이 초청된 사람들이나 심사위원들이 초대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나의 경우엔 내가 연출한 단편 두 편과 제작한 영화 여덟 편을 합쳐 총 열 편이 부산국제영화제의 초청을 받았고 한번 심사위원을 한 적이 있다. 마음먹었다면 열한번 개막식 레드카펫을 걸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보는 사람들은 선망의 대상일지 몰라도 사실 영화제 레드카펫을 걷는 것은 참으로 쑥스럽기 그지없는 일이다. 특히 부산국제영화제의 레드카펫은 그 길이가 상당히 길다. 스타 배우나 스타 감독이 레드카펫을 걸을 때는 관객들이 모두 집중해서 바라보고 또 호응도 높지만 나처럼 듣보잡에 가까운 제작자(또는 감독)는 “쟤는 뭔데 저길 걸어?” 하는 시선을 받기 쉽다. 그런 시선을 받으면서 그 긴 레드카펫 위를 걷는다는 건 곤혹스러운 일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무뚝뚝하게 걸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개막식을 여는 행사이기 때문에 최대한 빛내줘야 할 의무가 있다. 밝게 웃으며 가끔씩 손도 흔들고 포즈도 취해야 한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영화인들은 개막식 다음 날 부산을 찾는다.
그런데 그 쑥스러운 일을 딱 두번 해봤다. 한번은 스크린쿼터 싸움이 한창이었던 2006년이었고 한번은 올해였다. 두번 모두 영화제 개막식을 통해 무언가 중요한 것을 알려야 한다는 임무가 주어졌고 그래서 레드카펫에서 퍼포먼스를 벌였다. 2006년에는 영화인 수십명이 함께 ‘스크린쿼터 사수하자’는 문구가 적힌 조끼를 입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그 조끼가 예쁘지 않았다는 것. 아시아 최대 규모의 영화제 개막식 레드카펫 위의 퍼포먼스라면 좀더 예뻤어야 했다. 두고두고 아쉬웠다. 그런데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에 이름도 예쁜 희망버스 행사가 부산에서 열렸다. 그래서 누군가 영화제 개막식에서 그것을 알려야 했고 나에게 임무가 떨어졌다. 그렇다면 올해는 레드카펫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최대한 예쁘게 하고 싶었다. 무엇을 할까 궁리하던 중에 한진중공업 작업복을 입고 걸으면 좋겠다는 트위터 맨션을 받았다. 오, 딱 필이 왔다. 작업복을 개막식 패션으로, 최대한 예쁘게! 얼마나 게이스러운가! 그렇게 한진중공업 작업복이 영화제 개막식 레드카펫 위에 올랐다.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색색의 스팽글이 예쁘게 달린 작업복을 준비했었는데 그걸 가져오기로 했던 사람이 비행기를 놓치는 바람에 평범한 작업복을 입었다는 것.
아, 아깝고 또 아깝다. 다음에 또 이런 임무가 주어진다면, 그땐 정말 예쁘게 할 거야!
김조광수 영화감독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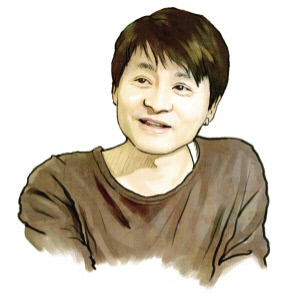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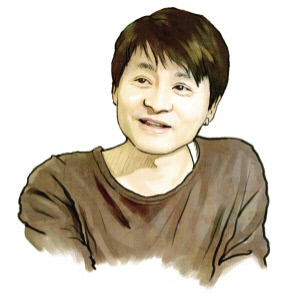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