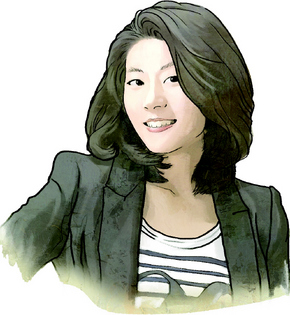 |
|
황선우
|
황선우의 싱글 앤 더 시티
베를린 아름드리 나무 곁에서 가슴은 쿵쾅댔다
베를린으로 이른 휴가를 다녀왔다. 무너진 장벽의 잔해나 브란덴부르크 문,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겠다고 직항도 안 다니는 먼 도시에 일주일이나 머무른 건 아니다. 베를린은 지금 전세계 젊은 아티스트들의 새로운 수도다. 패션과 미술, 라이프스타일의 흥미로운 움직임들이 벌어지는 활력의 중심이다. 럭셔리한 리조트에 늘어져 ‘디톡스’ 하는 휴가는 반나절 만에 지루해하고, 바지런히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노는지 들여다보기 좋아하는 내 여행 적성에 베를린은 꼭 맞았다.
베를린에 가서 뭘 하면 좋을지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대답은 한결같았다. “클럽에 가야지! 세계 최고의 클럽을 가진 도시잖아!” 티브이(TV)타워(파리의 에펠탑이나 서울의 엔(N)서울타워처럼 동베를린의 상징적인 조형물)가 보이는 루프탑에서 클러빙을 즐길 수 있다는 ‘위크엔드’, 트는 음악이며 오는 사람들 물이 최고라는 ‘킹사이즈 바’가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최종결정된 목적지는 규모가 압도적이라는 ‘베르크하인’. 택시를 타고 주소를 찾아갔지만 고요한 거리에 사방은 어둠뿐이었다. 허허벌판을 한참 걸어 입구를 찾아갔더니 200m는 족히 되게 늘어선 사람들의 행렬 끝에 비로소 각 잡힌 회색 건물이 보였다. 20년 전 발전소를 리모델링했다는 빌딩 창으로 푸른 조명과 쿵쿵대는 음악이 새어 나왔다.
 |
|
베를린의 클럽에서 음악을 즐기려는 여행자들과 베를리너들의 줄은 동틀 무렵까지 줄어들지 않는다. 사진은 ‘바 25’에 모인 클러버들.
|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