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박미향 기자
|
[esc] 황선우의 싱글 앤 더 시티
홍대 앞 ‘밤과 음악 사이’…추억 속 동지애 살아나는 곳
“너 거기 가 봤어?” 몇달 전 대학 동창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한 친구가 흥분을 누르며 은밀하게 질문을 던졌다. 마지막 물음표가 웃는 표정이었다. 청담동에 새로 생긴 마사지숍도, 이태원의 뜨는 레스토랑도 아니었다. 홍대에 있는 ‘밤과 음악 사이’라는 클럽. 결혼 10년차에 접어든 친구는, 클럽이라곤 대학 때 몇 번 다녀본 게 전부이며 밤 시간이라곤 두 아이와 남편에게 다 빼앗긴 워킹맘이다. 그 친구가 어울리지 않게 클럽이라니? 그 뒤로도 몇 차례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기’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의 공통점은 1970년대 중후반 태생이자 90년대 중후반 학번이라는 점, 그리고 뭔가 어두운 즐거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취할 법한 비밀스러운 동맹의 태도였다.
지난 주말 드디어 ‘거기’에 갔다. 장혜리의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나미의 ‘슬픈 인연’ 같은 노래가 흐르는 중이었다. 나이트클럽으로 치자면 ‘블루스 타임’ 같은 느낌의 발라드 타임. 목과 허리에 팔을 휘감은 끈적한 남녀는 없었다. 춤추러 온 사람들은 끼리끼리 큰 파도가 오기를 기다리는 서퍼처럼 쉬고 있었다고 할까? 춤추는 빈 공간에 인구밀도가 높아지고 점점 빈자리가 없어질 무렵 음악이 멈추고 조명이 잠깐 꺼졌다. 빠른 음악이 시작된다는 신호. 번쩍대는 조명이 켜졌다. 듀스의 ‘여름 안에서’를 시작으로 서태지와 아이들의 ‘하여가’, 엄정화의 ‘배반의 장미’, 룰라의 ‘날개 잃은 천사’ 같은 노래들이 이어졌다.
‘밤과 음악 사이’에서 두시간여를 보내자, 이곳을 언급하던 사람들의 비밀결사 같던 태도를 이해할 수 있었다. 대개 30대가 클럽에 가는 이유는 자신이 아직 한물가지 않았다는 걸 안팎으로 증명하고 싶어서다. 그런데 여기는 신나게 놀수록 자신이 한물간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게 된다. 십몇년 전의 인기가요가 익숙할 만큼 나이 든 사람만이 이 장소에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양복 차림, 펜슬스커트 복장으로 퇴근하고 달려온 이들에게 해방구가 되어준다. 즉석만남 같은 시도가 일어나는 건 나이트와 다를 바 없지만, ‘동물의 왕국’의 본능적 긴장보다는 추억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안전하게 서로를 탐색하는 또래집단의 동지감에 가까운 기류가 흐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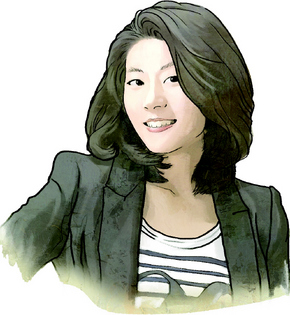 |
|
황선우
|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