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0.10.27 21:12
수정 : 2010.11.25 15:18
 |
|
패션디자이너 곽유진씨
|
[매거진 esc] 홍석우의 스트리트/스마트
코트를 판초 스타일로 변형한 패션디자이너 곽유진씨
가을을 좋아한다. 고로 가을의 옷도 좋아하는데, 그중에서도 트렌치코트를 가장 좋아한다. 전통적으로 트렌치코트 소재로 쓰인 뻣뻣한 개버딘(능직물의 일종. 주로 트렌치코트에 쓰인다) 소재 말고도 요즘은 가죽이나 부드러운 면 소재로 만든 다양한 디자인이 나온다. 그래도 트렌치코트라면 적당히 어두운 베이지색에 촘촘한 박음질로 마무리한, 약간은 묵직함이 느껴지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사적인 취향은 사진 찍을 때도 유감없이(?) 드러난다. 남자가 입은 트렌치코트의 고즈넉한 맛도 좋지만 특히 잘 만든 트렌치코트를 입은 여자를 보면, 정갈하게 잘 만든 옷의 기본을 알 것 같아 왠지 모르게 끌린다.
학생 때부터 디자이너라는 목표를 갖고 인턴십부터 보조 디자이너 일을 거치며 한 계단씩 밟아온 곽유진(26)씨는 몇개의 여성복 브랜드에서 일한 패션디자이너다.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만드는 여성복의 창립 멤버로 들어가 수년째 옷을 만든다. 때때로 여성복을 보러 백화점이나 명동을 한 바퀴 돌면서 아쉬운 점은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필요 없어 보이는 장식들이 첨가되었다는 점이다. 꼭 달렸어야만 했는지 의문이 드는 레이스와 조악한 자수 장식 같은 것들. 그녀가 디자이너로 있는 ‘토크/서비스’의 옷은, 여성복의 유행을 적절히 가미하면서도 작은 브랜드일수록 빠지기 쉬운 유혹에 길들어 있지 않다. 세간의 흥미와 적당히 타협한 디자인을 내놓진 않는다는 얘기다. 여성이 일하거나 책을 볼 때처럼 생활할 때 방해가 되지 않는, 기본에 충실하며 트렌드에 휘둘리지 않는 옷을 만들고 싶은 것이 목표이다. 멋을 좀 안다는 여성들에게 입소문이 난 것은 당연한지도 모른다.
 |
|
손수 만든 트렌치코트를 입은 여자
|
사람들은 패션디자이너의 일상이 드라마처럼 멋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수년간 만난 사람 중 일에 대한 몰입도와 바쁜 수준에서 그녀는 몇 손가락 안에 든다. 소재를 고르는 것부터 생산을 위해 공장 사장님과 씨름하는 것까지, 어느 것 하나 직접 부딪히지 않고 배운 것이 없다. 고된 작업과 수정의 반복, 이것이 말단부터 시작한 현직 디자이너의 삶이다. 그런 부지런함은 자신이 입는 옷에도 얼핏 서려 있다. 어두운 청색의 스키니진과 잘 만든 흑갈색 구두, 오래된 시계를 파는 매장에서 산 빈티지 손목시계. 트렌치코트만이 판초(커다란 천 가운데 머리를 내놓는 구멍만 있는 일종의 외투)처럼 조금 변형된 디자인으로 그녀가 만든 것이다. 어깨의 견장이라든가 소재와 색감 같은 것들은 영락없이 트렌치코트의 기본을 따르고 있지만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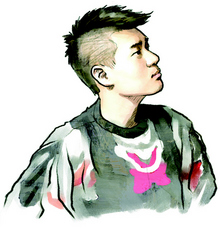 |
|
홍석우의 스트리트/스마트
|
그녀의 쇼핑도 보통의 여자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 가장 최근에 산 것은 ‘맞춤 재킷’인데, 소공동 양복집에서 고른 베이지색 울 원단을 들고 직접 종로의 맞춤가게에 가서 맞췄다. 이제 막 스물여섯의 가을을 관통하는 젊은 디자이너의 꿈은 뭘까? “서울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전통을 가미한, 좀더 세련된 옷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소녀처럼 깔깔 웃으며 쑥스러운 듯한 얘길 마무리 짓는 곽씨는 앞으로도 차곡차곡 경험을 쌓을 것이다. 진심으로 그 옷들이 보고 싶어졌다.
글·사진 패션저널리스트
|
■ 그는 어떤 것을 걸쳤나?
트렌치코트-토크/서비스, 니트-언노운, 신발-끌로에, 시계-블로바, 지갑-콤데가르송
|
|
|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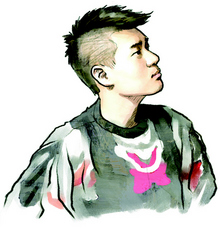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