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1.01.13 13:53
수정 : 2011.01.13 13:53
 |
|
그는 어떤 것을 걸쳤나? 더플코트-진스 / 라이더 재킷-빈티지 / 니트-메종 마르탱 마르지엘라 / 셔츠-아페쎄 / 청바지-유니클로 / 신발-레이크넨 / 가방-아메리칸 어패럴
|
[매거진 esc] 홍석우의 스트리트/스마트
운동화처럼 편한 여성구두 디자이너 윤홍미
윤홍미(27)는 여자 구두를 만든다. 첫번째 구두를 만든 것은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이다. 실천 없이 말만 늘어놓기 일쑤인 여느 또래와 다르게, 몇 달 만에 꿈을 실현했다. 수십년 만의 폭설로 헛바퀴 도는 차를 몰며 구두 공장이 밀집한 성수동을 발이 부르트도록 뛰었다. 차별화된 소재 고르랴, 흔치 않던 구두 모양 잡으랴, 공장장인 아저씨들과 씨름하랴,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은 준비를 혼자서 다 했다. 지금 생각해도 처음 몇 개월은 어떻게 지났는지 신기하다. 그렇게 나온 다섯 켤레의 구두 샘플을 손에 쥐었을 때, 삶의 그 어떤 순간보다 감격스러웠던 것은 당연할 것이다.
 |
|
신발-레이크넨
|
그는 어릴 때부터 남들이 하지 않는 일 벌이길 좋아했다. 대학 초년생 시절에는 친구들과 리폼한 티셔츠를 모아 브랜드를 만들었고 동대문시장 어딘가에서 장사도 해봤다. 의욕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해나갔지만 20대 중반에 들면서 삶이 그렇게 즐겁지는 않았다. 모두가 졸업반이 되고 취업 시즌이 오자, 친구들과 벌인 사업이니 프로젝트니 하는 것들은 모두 꿈처럼 사그라졌다. 패션계에서도 꽤 알아준다는 회사에 들어가 열심히 일했지만 주위나 블로그 속에서 앞서 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과 비교하며 조급한 마음도 생겼다. 회사에서 시키는 일뿐인 삶이 진정 바라던 것인가 회의도 들었다. 패션 정보를 찾는 일과 액세서리 디자이너를 거친 그는 20대 초반부터 용돈을 아껴 샀던 자신의 보물들을 떠올렸다. 그것은 ‘구두’였다. 구두가 자신의 유일한 길이라는 확신이 서자 3년 다닌 회사를 그만뒀다. 그리고 구두 브랜드 ‘레이크넨’을 만들었다. 어미 새가 없는 허허벌판에 갑자기 뛰어든 것처럼 쉽지만은 않은 결단이었다. ‘직장인 디자이너’에서 ‘경영자 겸 디자이너’로 직급 변경이 일어난 것도 순식간이었다.
아직 신진 디자이너에 속하는 그는 1년을 온전히 구두에 매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하나는 자신의 좌충우돌 경험에 조금씩이나마 노련미와 자신감이 더해지고, 그것은 곧 새로운 구두를 위한 밑거름이 된다는 것이다. “돈을 벌기 위한 디자인을 했을 때는 마음에 들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원하던 디자인을 뽑아내면 신기하게도 반응이 좋아요.” 자기 브랜드를 꾸리는 디자이너가 되면서 책임감도 늘었다. 아직 신생 브랜드인 그의 회사에는 직원 한 명이 달랑 있다. 밑천도 앞날도 확실하지 않던 그를 믿고 따라준 직원이 항상 고맙다. 가끔 옆에서 보면 딱딱한 회사의 사장과 직원이라기보단 가족과 친구 언저리의 관계로 보일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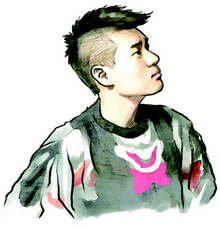 |
|
홍석우의 스트리트/스마트
|
지난해 두 시즌을 막 치러낸 레이크넨은 다가오는 2011년의 봄을 준비한다. 헌 옷과 빈티지, 국내외 디자이너 브랜드와 패스트패션 브랜드를 가리지 않으면서도 겹쳐입기(레이어드)를 즐기고, 일할 때 거추장스럽지 않은 아메리칸 어패럴의 가방을 즐겨 드는 그녀에게 구두는 ‘여자의 운동화’나 다름없다. 남자들이 변치 않는 디자인의 스니커즈에 수십년째 열광하는 것처럼, 그녀는 자신의 구두가 거추장스러운 장식 범벅이 아닌 덜어내며 생긴 아름다움을 가진 창조물이자 상품으로 만들려고 노력한다. 2000년대 초반 헬무트 랑의 구두를 가장 좋아한다는 그는 빠르게 변하는 동시대 패션 속에서도 변치 않을 무언가를 지닌 것처럼 보였다. 살을 에는 겨울을 녹인 싱그러운 미소가, 잔상처럼 남았다.
글·사진 패션저널리스트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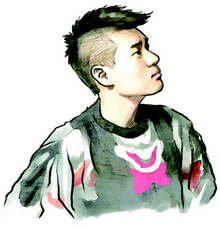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