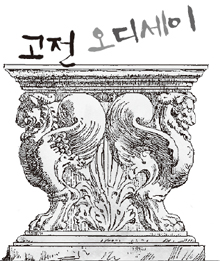 |
|
고전 오디세이
|
고전 오디세이 ① 역사가 만들어낸 고전의 비밀
그리스·로마 고전 ‘아르케’를 찾아서 이번주부터 격주로 서양 고전 문헌학 연구자 김헌·안재원 박사의 글을 연재합니다. 그리스·로마 문헌이 어떻게 탄생해 계승됐고, 그 문헌들이 다시 근대 이후 어떤 모습으로 재탄생하고 변용됐는지 시간을 넘나들며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살핍니다. 몸소 보고 듣는 히스토리아(historia) 옛 그리스에 헤로도토스(기원전 484~425)라는 사람이 있었다. 세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진기한 유적과 낯선 풍경을 보고, 이방인들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일에 청춘을 다 바쳤다. 불혹의 나이에 아테네에 머물게 된 그의 곁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는 뛰어난 이야기꾼이었다. 이국땅에서 목격한 사실들과 수집한 증언들을 매끄럽게 엮어내어 사람들을 매료시켰다. 그가 아테네를 떠나 이탈리아 남부 한 도시에 정착하였을 때,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터졌다.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격돌한 것이다.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이 침략해 왔을 때, 두 도시국가는 그리스 동맹을 이끌며 위대한 승리를 일구었지만, 이젠 동맹의 틀을 깨고 갈라서서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다. 전쟁이 터진 그해(기원전 431년) 그는 <역사>(Historiae)를 쓰기 시작했다. “할리카르나소스에서 태어난 헤로도토스가 ‘직접 보고 들은 것’(historia)을 이제 제시하는 바(apodexis)이다. 이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시간에 의해 지워지지 않도록 하고, 그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이 알려지지 않은 채 묻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는 자신의 작업을 ‘히스토리아’(historia)라고 했다. ‘본다’(horo)라는 동사에서 자라나온 말이다. 철학자들이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추상적 담론(logos)이나 시인들이 상상력으로 그려내는 경이로운 이야기(muthos)와는 달리,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사실 그대로 기록한다는 히스토리아, 우리는 이 개념을 ‘역사’(歷史)라고 새긴다.
직접 보고 들은 고대 전쟁 기록한
헤로도토스 별명은 ‘거짓말쟁이’
역사 본질은 재구성된 ‘과거 사실’
 |
|
빛날 고전-사라질 이야기, 역사가 갈랐다
|
모방·변용으로 새로운 문화 만들어
“세계 보편의 가치 만든 힘 찾을 것” 고전(古典)이 역사의 산물의 산물이라면… 고전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물을 수가 있다. 고전이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꼭 읽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거의 아무도 읽지 않은 책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고전이 값있고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끝까지 읽어내기란 여간해선 쉽지 않다는 뜻이겠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쉽게 읽히지 않는 책을 꼭 읽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가? 고전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정말 고전은 값진 것일까? 그런데 고전은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값진 것이니 꼭 읽어야 한다고 역설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 고전은 분명히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만들어진 순간 곧바로 고전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사람들이 세대를 이어가며 계속 읽어주고, 재해석하고 재생산하며 보전한 경우에만, 고전은 고전으로서 살아남았다. 지난 세월 속에 수많은 책들이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 정말 아주 적은 수의 책들만이 지금까지 고전으로 남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렸다. 따라서 하나의 책을 고전이 되게 하는 것은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역사 자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역사의 선택을 받은 텍스트- 그것이 바로 고전이며, 그래서 고전은 역사의 산물이라고 말들 한다. 고전의 생명력은 특정 시대의 문제들에 깃든 보편성을 통찰하는 힘에서 비롯되며, 역사의 매순간에 새롭게 생겨나는 문제들에 대응하는 힘에서 확인된다고 한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 역사가 그렇듯이, 고전이라는 것도 고전이게 하는 어떤 선택의 힘, 그 힘을 가진 어떤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아닐까? 이제 이어지는 몇 편의 글을 통해 우리는 옛 그리스에서 태어난 작품이 왜, 어떻게 고전이 되고, 그리스를 점령한 로마 속으로 이어져갔는지를 추적해보려고 한다. 역사적 추적 작업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은 로마인들이 사용했던 ‘모방’(imitatio)과 ‘경쟁’(aemulatio)이다. 이 말은 서양 고전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일종의 키워드다. 로마가 무력으로 그리스를 점령하였을 때, 로마는 높은 수준에 도달한 그리스의 문화에 깜짝 놀랐고 압도당했다. 로마는 그리스의 문화를 ‘모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겉모습만을 흉내 내는 답습이 아니라, 로마의 상황과 시대적 요구에 맞게 창조적으로 변용하는 노력이었으며, 그리스 문화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하며 로마적인 것을 구축하려는 필사적인 ‘경쟁’의 일환이었다. 그 과정에서 서구 문화 전반을 지탱하는 그리스-로마 고전은 선택되고 창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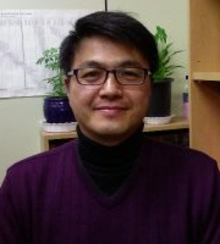 |
|
김헌/서울대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
| |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