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펜을 입에 물고 있는 사포. 로마의 네로 황제 시대에 그려진 폼페이의 프레스코 벽화로 현재 이탈리아 나폴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
고전 오디세이 ⑧ 고대 민주주의와 함께 피어난 ‘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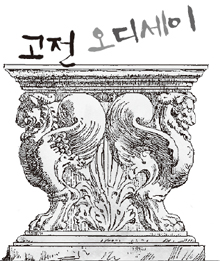 |
|
고전 오디세이
|
귀족정 몰락 뒤 민주정 발흥하자
장대한 서사시서 서정시로 ‘이행’ 형식부터 따져보자. 고대 그리스 문학은 크게 운문과 산문의 영역으로 나뉜다. 운문에는 서사시, 서정시, 비극(희극)이 있다. 그리스 문학의 경우, 문학 갈래(장르)의 발전이 정치와 사회 변동과 함께 발전했던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른바 왕족과 귀족이 지배하던 시대의 문학 장르가 서사시이다. 서사시 리듬(-vv -vv -- -vv -vv --: 장단단 장단단 장장 장단단 장단단 장장)은 장대하고 웅장하다. 이 리듬은 본디 제의나 의식에 어울리는 장단이다. 그래서 이 장단은 귀족 세력이 몰락하고 민주주의가 발흥하면서 형성되었던 개인의식을 드러내거나 개인 욕구를 표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그래서 발전한 리듬이 예컨대 사포의 리듬이다. 이 리듬으로 표현한 문학 갈래가 서정시였다. 영어로 서정시는 리릭(lyric)인데, 이 말은 그리스어 ‘리라’(lyra)에서 유래했다. 이 말은 일곱 개의 현(弦)으로 구성되었다 해서 칠현금이라 불리는 악기를 지칭하는 말이다. 리라 이외에도 ‘키타라’ (Kithara)에 맞추어 노래를 짓기도 한다. 이 악기에 맞추어 불렀던 시를 지었던 시인들로는 대표적으로 사포, 알카이오스와 아나크레온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이 지었던 시들은 독창으로 부르는 노래(Monody)로 분류된다. 또한 리라와 키타라에 맞추어 불렀던 노래에는 합창가가 있는데, 합창가를 지었던 시인들로는 알크만, 스테시코로스, 이비코스, 시모니데스, 핀다로스, 바킬리데스가 있다. 그런데 서정시에는 리라나 키타라 이외에도 아울로스(aulos)라는 피리로 부르는 노래도 있는데, 이런 종류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에는 티르타이오스, 칼리노스, 솔론이 있다. 9개의 현으로 된 현악기(klepsiambos)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도 있는데, 이 노래가 이암부스(iambus, v-(단장) 리듬의 반복)라고 분류되는 것들이다. 대표적인 지은이로는 아르킬로코스, 시모니데스, 히포낙스가 있다. 그러면 내용 측면에서 살펴보자. 서정시는 세계관과 ‘개인’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에서 촉발되었다. 명예를 중요하게 여겼던 서사시 시대의 영웅 중심의 전사(戰士) 가치관에서 개인 중심의 일상적 가치관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지는 과정에서 탄생한 문학 갈래였기에 그렇다. 물론 이런 변화가 갑작스럽게 생겨난 것은 아니다. 변화의 기미는 실은 서사시에서도 나타난다. <오디세이아>의 한 구절이다. 악기 ‘리라’에 맞춰 일상을 노래
더없이 소중한 ‘내면 경험’ 담아
개인의 정체성과 살아있음 확인 각자는 각자의 일들로 즐거워한다. (<오디세이아> 제14권 228행)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좋아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것들에게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다고 호메로스는 주장한다. 하지만 호메로스의 노래는 시인 자신의 일과 경험,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서사시는 과거의 어떤 인물이나 이야기에 대한 이른바 집단기억을 노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겪은 일들과 자신의 문제를 노래로 표현한 사람은 헤시오도스(Hesiodos, 기원전 8세기)였다. 들판에서 거칠게 뒹구는 양치기들아, 오로지 욕정만 알기에 욕을 들어먹는 자들아,/ 우리는 진실처럼 들리는 거짓말을 잘 할 줄 안다./ 우리는, 원한다면, 진실을 노래할 줄도 안다. (<신통기> 제26행~28행) 헤시오도스의 ‘진실’은 자신이 겪은 자신의 경험,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일상과 삶이다. 이런 이유에서 서사시에서 서정시가 분화·발전할 수 있도록 계기를 제공한 시인이 헤시오도스이다. 그러나 헤시오도스는, 예컨대, 떠나가는 연인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내면의 경험이 다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시인은 아니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미세한 느낌의 차이를 표현하고 포착하려는 노력이 아니었다. 일상 사건의 배경에서 작동하는 우주사적 배경을 탐구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었다. 이 대목에서 흥미로운 차이가 드러나는데, 그 차이는 다음과 같다. 일상의 경험을 놓고서 서사시인의 시선이 한없이 밖으로, 큰 세계로 향해 가는 반면, 서정시인의 시선은 한없이 안으로, 작은 세계로 향해 간다는 점이다. 그런데 일상의 경험 중에서 우연에 속하고 아무런 가치도 없어 보이는 작은 지나침 혹은 부딪힘이 자신의 기억 안에 중요한 그 어떤 것으로 자리잡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때론 자신이 살아 있다는 것을 환기시켜주기도 하고, 때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그 어떤 것이 되기도 한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어떤 것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종종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 순간 그것은 재산, 권력, 명예와 같은 외적인 가치와 바꿀 수 없는 가치로 자리잡게 된다. 이 ‘가치’를 노래로 표현하고, 노래를 통해서 기억에 남기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나게 되는데, 이 욕구를 표현한 노래가 서정시다. 사포의 시는 이런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어떤 이는 기병이라고, 어떤 이는 보병이라고,/ 어떤 이는 해군이라고, 검은 대지 위에서/ 가장 빛나는 자가. 하지만 나는 말하지요./ 당신이 사랑하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이를 깨닫는 일은 너무도 쉬운 일이지요./ 누구나 인정할 것이기에./ 헬레네를 보세요. 아름다움으로 모든 사람들을 지배했던/ 그녀는 가장 뛰어난 남편을 버리고 트로이아로/ 가버렸지요. 아이들과 사랑하는 부모님은 안중에도 없었지요./ 아프로디테 여신이 그녀를 데리고 가버렸기에. (…)/ 이제 나도 아나크토리아를, 사랑스러운 그녀의 발걸음과/ 밝게 빛나는 그녀의 얼굴을 리도스인들의 마차와 완전 무장한/ 보병보다 더 기억하기를 원하지요. (사포 <단편> 16번)
 |
|
안재원/서울대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