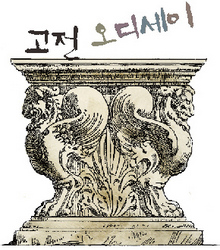 |
|
고전 오디세이
|
고전 오디세이 ⑪ 옛 그리스 비극의 탄생
인간은, 인간을 위해 고통을 자처하는 프로메테우스를 원한다. 추악한 나 대신 염소를 죽여 제사를 드리듯, 주인공을 박해하면서 ‘고통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 그리고 인생이 다 무엇이냐고 묻는다. 그리스 북서쪽에 있는 카우카소스산 암벽. 누군가가 손과 발이 쇠사슬에 묶인 채 매달려 있다. 가슴에는 강철 쐐기가 박혀 있고, 양 옆구리에도 무쇠 띠가 옥죄고 있다. 날마다 독수리가 날아와 그의 간을 쪼아 먹으니, 곧 죽을 것만 같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그의 이름은 프로메테우스. 그는 왜 그런 핍박을 당하는 걸까? 전설에 따르면, 그가 인간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제우스를 속이고 불을 빼내어 그들에게 몰래 가져다주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괘씸한 일이었다.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에게 참혹한 벌을 내렸다.(헤시오도스, <신들의 계보> 521-616, <일과 나날> 47-105) 그런데 왜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고통의 길을 선택했을까? 그리스의 문법학자 아폴로도로스는 이렇게 썼다. “프로메테우스는 물과 흙으로 인간을 빚은 다음, 제우스 몰래 회향풀의 줄기에 감춰두었던 불을 인간들에게 주었다.” (<도서관>(Bibliothek<00EA>, 1. 7)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창조했다는 말이다. 로마의 서사시인 오비디우스도 같은 말을 한다. 다른 생물들을 지배할 존재가 필요했기에 “이아페투스의 아들 프로메테우스는 하늘의 씨앗을 간직한 채 높은 천공에서 떨어진, 갓 태어난 대지를 빗물로 개어, 만물을 다스리는 신들의 모습을 따라 인간을 빚었던 것이리라.”(<변신 이야기> I. 78-83) 이에 따르면, 프로메테우스가 자신이 직접 만든 인간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 암벽에 매달려 찢어지는 고통을 자초하여 견뎌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다. 힘과 권력의 신 크라토스는 그를 암벽에 결박하며 조롱한다. “신들이 그대를 ‘앞을 내다보고(pro-)’ ‘생각하는 자(metheus)’라 부르는 건 잘못이지. 이제 앞을 내다보면서 이 정교한 그물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지나 생각해보라고!”(아이스킬로스, <결박당한 프로메테우스> 84-87) 그러나 프로메테우스는 그 이름 그대로 자신의 운명은 물론, 제우스조차도 모르고 있는 제우스의 운명을 내다보고 있었다. “제우스는 어떤 고문으로도, 어떤 계략으로도 나를 움직여, 내가 알고 있는 비밀을 말하게 할 순 없다. 그가 이 치욕스러운 사슬에서 나를 풀어주기 전에는!”(989-991) 강력한 패권으로 세계를 지배하던 제우스도 앞을 내다볼 줄 아는 프로메테우스의 예지 앞에서는 속수무책, 안절부절못했다. 아이스킬로스는 프로메테우스를 인간 구원자의 모습으로 비극의 무대 위에 우뚝 세워놓았다. 연약한 인간을 위해 제우스의 거대한 권력에 저항하여 고통으로 찢기는 프로메테우스를, 마치 엄숙한 제사장이 되어 희생제물을 바치듯이. 그런데 ‘비극’(悲劇)으로 새기는 그리스 말 ‘트라고디아’(trag<00F4>idia, 영어로는 tragedy)는 뜻밖의 뜻을 가지고 있다. ‘염소’(tragos)의 ‘노래’(aoid<00EA>)란다. 도대체 왜 ‘비극’이 ‘염소의 노래’란 말인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비극이 염소를 제물로 바치며 부르던 노래와 관련이 깊기 때문이라는 말이 솔깃하다. 염소가 디오니소스(=바쿠스) 신과 가장 관련이 깊은 동물이기에, 결국 비극은 디오니소스 신을 경배하는 의식과 깊게 맺어져 있다.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는 합창서정시 가운데 디오니소스 신을 찬양하는 ‘디티람보스’에서 비극이 비롯되었다고 한다.(<시학> 제4장) 또한 역사가들은 아테네 민중들의 지지를 얻어 귀족정을 무너뜨린 참주 페이시스트라토스가 기원전 534년에 디오니소스 신을 찬양하는 대(大) 디오니시아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이때 비극이 경연대회 형식으로 공연되기 시작했다고 전한다. 따라서 비극은 태생적으로 디오니소스 신과 관련된 장르였다. 그런데 디오니소스 신이 도시나 귀족의 그룹이 아닌, 농촌과 외래의 신으로서 권력 바깥에 있던 민중들을 대표한다는 점을 곰곰이 따져보면, 올림포스 신들로 상징되는 귀족들의 힘을 제압하려는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정치적인 계산이 읽힌다. 하지만 그 정치적인 계산의 밑바닥에는 민중들의 삶과 관련된 종교적인 염원이 깔려 있다. 농번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3월 말에 열렸던 디오뉘시아 제전과 그때 공연되던 비극은 정치적인 계산을 넘어, 그리스인들의 종교성을 비춘다.
 |
|
니콜라세바스티앙 아당의 작품 ‘결박된 프로메테우스’(1762). 쇠사슬에 묶인 채로 독수리에게 간을 뜯어 먹히는 장면. 프로메테우스의 고통이 드러나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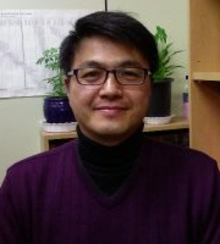 |
|
김헌/서울대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
광고



기사공유하기